-

-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 지음, 최민우 옮김 / 다산책방 / 2015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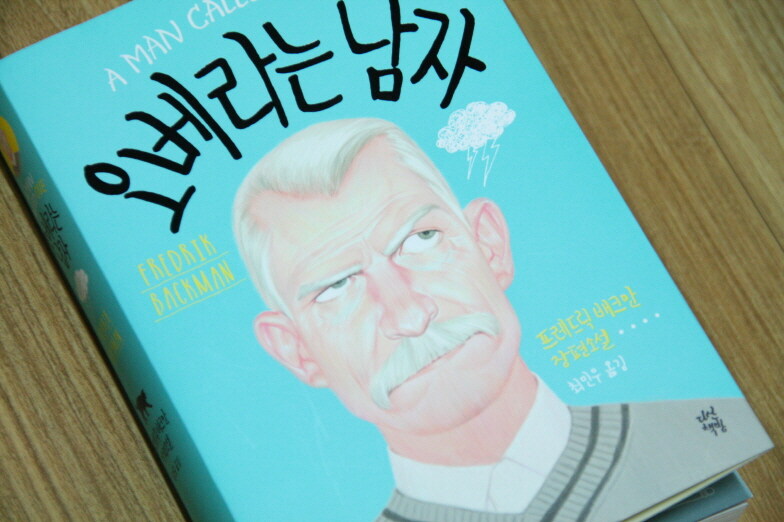
“건드리면 폭발하는 오베가 왔다.”
“30초마다 웃음이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소설”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장편소설 『오베라는 남자』에 대한 출판사의 선전용 문구다.
이 문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먼저, 오베는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건달(건드리면 달려드는 사람)’과 같은 성격인 것은 맞다. 주인공 오베에 대해 조금은 과장된 감이 없진 않지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구다. 하지만, 두 번째 문구는 맞지 않다. 이 책은 30초마다 웃음을 터트리는 소설은 결코 아니다. 물론, 소설은 재미있고 유쾌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 재미는 웃음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런 선전 문구가 책의 내용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 책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소설이 아니다.
오베라는 이 남자는 59세의 할배(요즘으로 본다면 청년이지만)이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내다. 자동차란 오직 사브(오베에게는 국산차)만이 진리라 여기는 사내인 오베, 그를 한 마디로 정의할 단어는 아마도 ‘원칙’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 ‘원칙’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오베가 정의하는 ‘원칙’은 이렇다. 사내는 결코 남을 일러바치지 않는다.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실제 오베는 이런 원칙으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또 이런 ‘원칙’도 있다. 거스름돈을 잘못 남겨준 빵집에는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찍히면 재미없겠다. 또한 오베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원칙이 있다. 오베네 마을의 거주자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오베는 이 원칙을 끝내 지키려 한다. 자신이 강도의 칼에 찔려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구급차가 거주자 구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긴다.
오베의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정신은 자연스레 ‘깐깐함’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오베는 깐깐한 할배다. 오베는 앞뒤 꽉 막혀 있어 결코 융통성이 없는 깐깐한 할배다. 하지만, 오베의 이런 ‘깐깐함’이 전혀 밉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다. 도리어 이런 ‘깐깐함’이 귀엽게 느껴지며, 소설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베의 이런 ‘깐깐함’을 오히려 응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베의 ‘원칙’, ‘깐깐함’, 그 이면에는 뜨거운 ‘정(情)’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설이 시작될 무렵의 오베는 6개월 전 아내를 잃고 자살을 결심한다. 물론, 작가의 표현처럼 오베는 삶을 포기하고 죽는 종류의 남자는 아니다. 단지 사랑하는 아내 소냐 없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모를 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자살을 시도한다. 목매달기,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기차선로 뛰어들기, 약물복용, 권총 자살에 이르기까지. 물론, 오베가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부터 자살을 결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오베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갑자기 자살하여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여겼기 때문. 그러한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베의 ‘원칙’이다. 하지만, 오베는 컴퓨터를 모르는 구세대여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다. 이제 오베는 ‘원칙’을 어기지 않으며 자살하여 아내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의 자살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처음 목을 매었을 때는 끈이 끊어졌다. 기차에 뛰어들려던 계획은 도리어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며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웃들의 방해로 인해서다. 특히,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얼간이 가정 때문이다. 깐깐한 오베의 눈에 전혀 들지 않는 얼간이 같은 멀대 남편과 셋째를 임신한 이란 여성 아내, 그리고 마치 트롤처럼 느껴지는 두 딸 아이들. 이들은 언제나 오베를 귀찮게만 하는 이웃이다. 하지만, 오베는 점차 그 얼간이 같은 가정에 의해 마음이 열리게 된다. 뿐 아니라, 뚱보 젊은이, 호모 젊은이, 갈 곳 없는 길고양이 등을 통해, 오베의 얼어붙은 마음은 녹아내리고, 결국 정이 넘치는 깐깐하지만 귀여운 할배가 되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정의의 투사로 변신하고 만다.
이 소설은 깐깐한 할배가 변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작가는 오베의 ‘원칙’과 대조하여 또 다른 원칙을 고수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건 바로 관료주의 행정체제다.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음을 작가는 고발한다. 각 개인의 소망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을 고집하는 행정체계에 대한 고발. 이는 오베의 꽉 막힌 성격, 원칙만을 고집하는 고리타분함과 오버랩 되면서도 결코 같지 않다.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경우의 ‘원칙’은 대조된다. 그 차이는 바로 ‘정(情)’이다. 깐깐한 할배 오베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한 ‘정’이 숨겨져 있다. 오베는 단지 겉으로는 한없이 투털거리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하얀 셔츠로 상징되는 관료주의에는 이것이 없다. 오직 원칙만을 고집하는 깐깐함이 있을 뿐. 그들에게는 개인의 사정, 개인의 소망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저 서류와 상황에 따른 ‘원칙’만이 존재할 뿐. 게다가 그러한 원칙을 빙자한 부정(不正)이 감춰져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프레드릭 배크만은 『오베라는 남자』를 통해, 관료들의 꽉 막힌 행정을 고발하고 있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술에 취한 버스기사로 인해 사고가 나고 아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오베의 상황에 대한 묘사다.
“결국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에 편지를 썼다. 스웨덴 당국에도 썼다. 경찰에도. 법원에도.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그들은 법전이나 다른 권위를 참조하여 대답했다. 변명했다. .... 하지만 어디에서나 이내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엄격하고 독선적인 얼굴로 그를 막아 세웠다. 그들과는 싸울 수가 없었다. 그들이 국가의 편에 서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국가여서였다. 마지막 민원은 거부당했다. 싸움은 끝났다.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그러기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오베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279쪽)
개인의 아픔, 개인의 바람,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은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지만, 오베와 같이 정을 동반한 깐깐함과 원칙고수는 귀여움을 선사한다.
또한 생을 포기하고 죽으려 하던 오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공급한 건 다름 아닌 오베가 귀찮아하던 ‘이웃’이었다. ‘이웃’은 오베에게는 귀찮은 방해자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차, 오베는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묘한 매력에 빠져든다. 마음대로 자살조차 하지 못하게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이웃, 그들의 막무가내 개입은 도리어 깐깐한 할배 오베를 정이 가득한 ‘이웃’으로 만들게 된다. 이것 역시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
철저한 개인주의로 빠져드는 현실 속에서 이웃의 문제들로 인해 기꺼이 내 삶을 방해받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게 된다는.
아무튼 『오베라는 남자』를 통해, 깐깐한 할배, 원칙주의자가 전해주는 묘한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