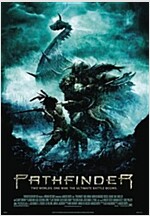 영화의 제목을 해석하면 길잡이, 개척자 뭐 이런 뜻이란다(그때는 이런 뜻인지 모르고 봤지만 ^^;).
영화의 제목을 해석하면 길잡이, 개척자 뭐 이런 뜻이란다(그때는 이런 뜻인지 모르고 봤지만 ^^;).
이 영화를 언제 봤는지는 잘 모르겠다. 2007년 이후에 개봉했다고 하니깐, 아마 그해에 바로 보지 않았나 싶긴 하다만. 이 영화는 13번째 전사 이후에 딱히 바이킹 관련된 영화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봤던 작품인데,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다. 일단, 주인공인 칼 어번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긍지와 자존심 높은 로한의 기병대장으로 나와서 상당히 인상이 강하게 각인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고스트 쉽 - 여기선 뭘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리딕>, <본 슈프리머시>, <둠>, <스타 트렉: 더 비기닝>, <레드> 등 필자가 봤던 상당수의 영화들에 출연했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얘는 액션배우치고는 상당히 분위기 있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 좀 이상할라나?
그럼 영화 얘기 한번 해보자.
영화의 스토리는 이전에 소개했던 <13번째 전사>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소재는 비슷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이킹 영화는 대부분 외지 사람이 꼭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역할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이다. 그리고 전작이 이슬람권의 사람이 바이킹 문화권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 영화는 바이킹족들이 인디언 문화권으로 침투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척의 배. 바이킹족을 상징하는 용머리 용골과 날씬한 선체, 그리고 단단한 철제갑주와 방패 등이 화면 전면에 보인다. 난파된 배 안에서 바이킹 족장의 아들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는 '왐파노악(Wampanoag)'이라는 인디언 부족에 의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유령'으로 불리며 인디언으로 살아가던 소년은 장성한 청년이 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또 1척의 바이킹 함선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난파되지 않고, 온전하게(?) 도착하여, 그들은 배에서 말들을 꺼내 무서운 질주를 시작한다. 그들은 왐파노악 부족을 절단내고, 주인공은 예지 능력이 있는 무당 '패스파인더'를 찾아가 자신과 같은 형통인 바이킹들에게 복수를 맹세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는 9~10세기 유럽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까지 배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뻗어나가던 바이킹족의 실제 역사에 코드를 맞췄다. 이전에는 레이프 에릭슨이 이끄는 바이킹 족의 한 무리가 북미에 정착했다는 신화적인 내용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실제 캐나다 뉴펀들랜드섬 북쪽 끝에서 11세기 바이킹족이 건설한 식민지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은 바이킹족이 가장 처음 발견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지금 여기는 '랑즈 오 메도스 국립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영화의 배경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섬 일대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 바이킹족이 한번 난파된 것을 보여준 것처럼 당시 바이킹족이 아메리카에 심심치않게 도달했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깔았던 것 같다. 물론 주인공이 장성했을때 도착한 바이킹족이 가족이나 다른 무리들을 이끌지 않고, 오직 건장한 전사들로만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오바스러운 설정이다. 이는 곧 바이킹족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자주 가는 항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고, 이곳에 약탈할 것이 많아 아예 처음부터 약탈을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만한 정황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바이킹족이 그렇게 배 1척으로 와서 이 머나먼 타국에서 뭐하고 살텐가...즉, 갑자기 이유없이 바이킹족이 침입하는 것은 설정상 무리가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오히려 영화 초반부에서처럼 우연찮게 난파되어 도달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정일 것 같다. 암튼,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 바이킹족이 인디언을 침입해야만 하지만 말이다.
영화 속의 바이킹은 인디언과 아주아주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맨 위에 영화 포스터에도 나타나지만, 주인공과 바이킹족의 동일한 점은 철제 칼과 방패뿐이다. 복장이나 행동양식, 사고방식, 기타 무기, 싸우는 방식 등은 모두 인디언과 같다. 그에 반해 바이킹족은 온몸을 철제갑주로 두르고, 단단한 철제무기를 갖추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대로 약탈하고 빼앗는 악마로 묘사된다. 뭐 실제로 당시 인디언과 바이킹족이 만난다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 바이킹족의 모습은 중남미 원주민들이 처음 유럽인을 봤을 때 만큼이나 이상한 모습이긴 했을 것이다.
암튼, 주인공은 같은 바이킹족이라는 것을 내세워 적을 안심시키고 뭐 결국에는 사랑하는 애인도 구하고, 눈 덮힌 산야에서 바이킹 애들을 모조리 골로 보내버린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의 영웅으로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일단, 전투씬은 스케일이 크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사실적이고 긴장감이 넘친다. 전에 소개한 <13번째 전사>에서처럼 장렬하거나 웅장한 맛은 없지만 바이킹족에 대항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느낌은 잘 전달됐다. 전체적으로 위에 보이는 몇몇 사진에서처럼 음습한 기운이 도는 안개가 끼거나, 어두운 저녁이거나 하는 배경이 많아서 영화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둡다. 하지만, 설경이 펼쳐지는 장면도 많아서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또한 인디언에 비해 바이킹족을 너무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려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드라마 <주몽>에서 앞으로 급성장해야만 하는(?) 고구려에 비해 초반에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어야만 했던 한나라 강철기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일부러 지저분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거침없이 표현하려다보니 다소 왜곡된 바이킹족에 대한 표현이 스크린에 보인 것은 아닐까 싶다. 너무 비사실적으로 묘사해서, 판타지처럼 느껴진다랄까?
아울러 주인공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주 빠르게 바이킹족의 철제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 적과 싸우는 일취월장(?)의 실력을 선보인 것 또한, 조금 이해가 안 됐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 주인공을 모시러 온 주인공 아버지의 가신들이 주인공에게 칼 다루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영화 <타이탄>에서도 왕의 가신들이 주인공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뭐 시간의 촉박함이야 그렇다쳐도 그런 과정 거의 없이 이런 식의 전투씬이 나오는 것은 조금 그랬다. 만약 주인공이 끝까지 인디언식으로 싸웠다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건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전사는 아니지만 그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십분 발휘해 적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암튼, 어떻게든 짧은 시간 내에 주인공이 성장해 적을 다 물리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이만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바이킹을 다룬 영화지만, 정작 바이킹에 대한 묘사나 고증을 살펴볼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전사로서의 바이킹족의 잔인함과 무서움을 잘 표현했고, 바이킹족의 피가 흐르는 주인공 역시 무서운 전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한다. <13번째 전사>보다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별은 3개만 주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