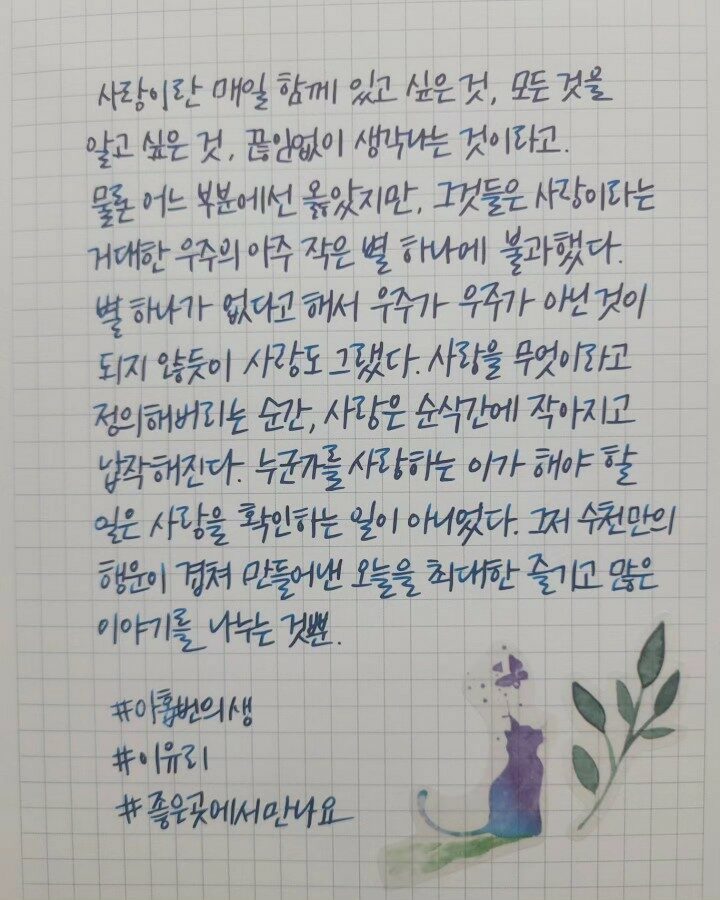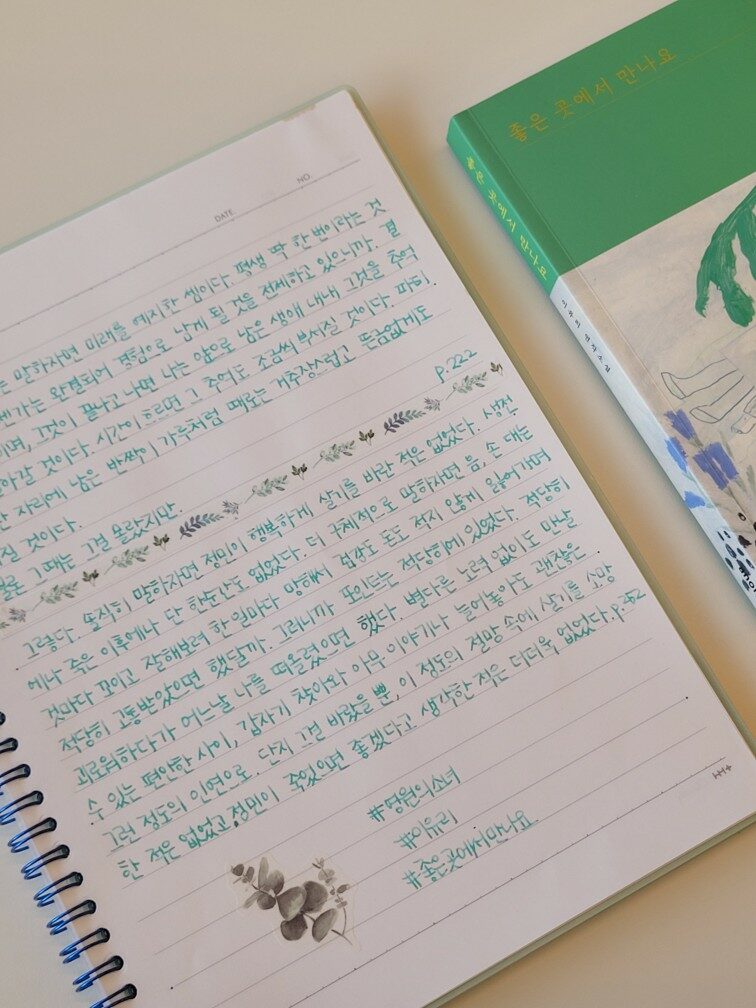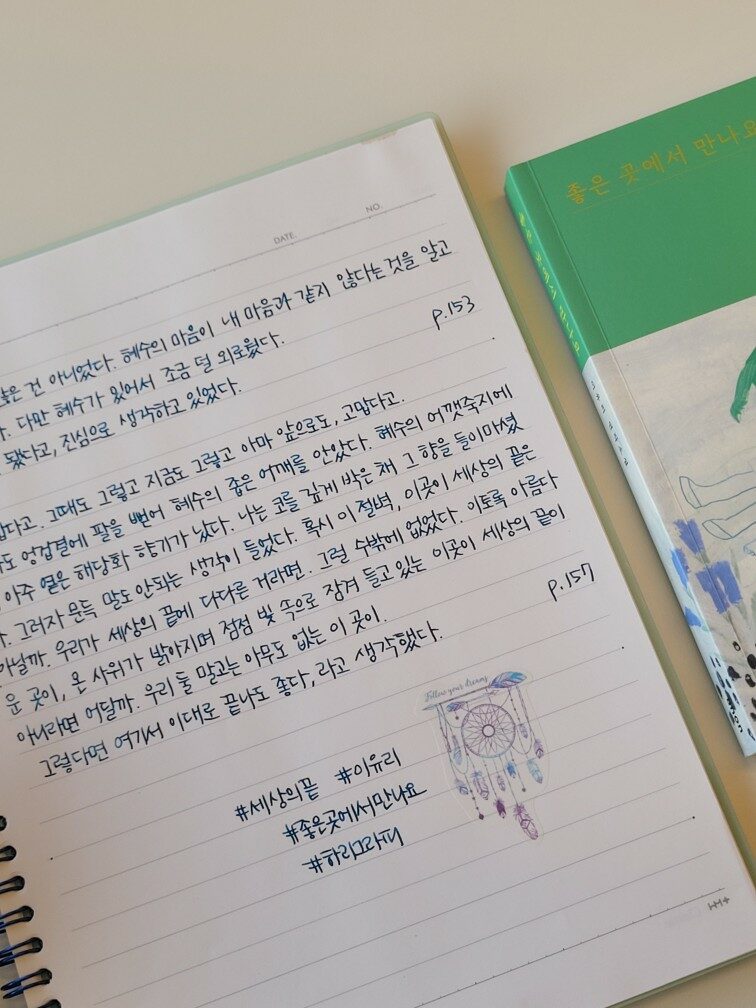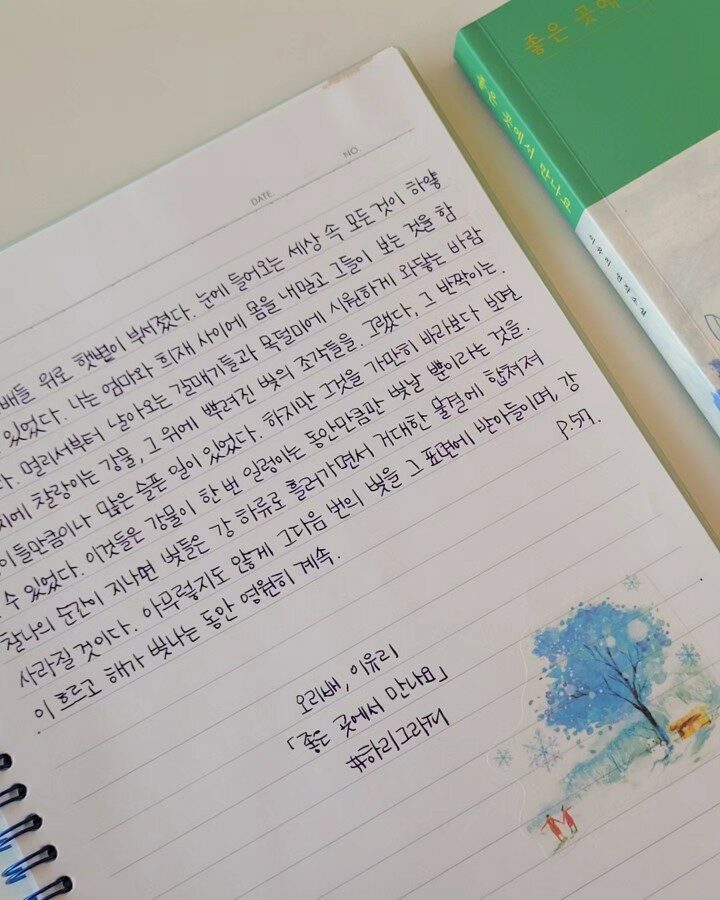-

-
좋은 곳에서 만나요
이유리 지음 / 안온북스 / 2023년 7월
평점 : 


좋은 곳에서 만나요, 이유리
<달콤한 꿈과 서늘한 현실 사이
서러움과 반짝임을 모두 머금은 아지랑이 같은 빛의 세계
찰나의 순간, 생의 끝에 새겨지는 깊은 사랑의 흔적들>

〈오리배〉
지영은 엄마와 희재를 만나고나서야 안도한다. 남겨진 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마음 편히 떠나게 되는 것이었다. 죽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나니 죽고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남아있는 사람과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나를.
〈심야의 질주〉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인 것 같다. 부와 인기를 모두 가졌던 배우 강산은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자신에게 열광했던 팬도. 대저택같은 집에 홀로 살아가며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해남이 죽고난 후 찾아간 강산은 그 옛날 자신이 부러워하며 동경의 대상이었던 강산이 아니었다. 고작 우울증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아버리다니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강산을 지켜보며 깨닫게 된다. '외롭고 괴로운데 어디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요.(p.94)' 덩그러니 혼자 남아 외롭고 괴로운 자신의 우상 강산의 마음을.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도 있겠다.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인 것 같다. 서로를 다독여주고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끝〉
혜수와 지우는 <심야의 질주>의 해남이 젊은 시절 사고를 내고 도망쳤던 그 사고의 여자 둘이었다. 연작소설이라 각각의 단편마다 주인공들의 연결고리가 있다. 혜수는 늘 죽고 싶어 했고 지우는 그런 해수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했다.
"매일 그런 날들이었다. 모든 것이 좋아질 듯 좋아지지 않았고 다만 혜수가 좋았던 날들.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다. 혜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만 혜수가 있어서 조금 덜 외로웠다. 그거면 됐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p.153"
혜수와 지우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았다. 세상의 끝과도 같은 절벽 앞. 고맙다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잘 살고 있었지만 이대로 끝나도 좋다는 마음. 그 역시 사랑이라고.
<아홉 번의 생>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편이다. 혜수와 지우가 돌보던 길고양이. 고양이가 자신과 다른 존재인 선인장을 사랑하게 되면서 몇 번의 생을 거쳐 선장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낯선 존재들이기에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찾기위해 애쓰기도 한다.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것도 고양이에게서!!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왜 이런 하잘것없는 사실이 이토록이나 기쁘고(p.173)' '같은 이야기를 수백번 들었지만 매번 새로웠으며(p.176)'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그 애와 같은 선인장이었다면(p.179)'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홉번째 생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만나게 된 무늬벤자민나무로 태어난 선인장. 고양이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사랑이란 매일 함께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이라고. 물론 어느 부분에선 옳았지만, 그것들은 사랑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별 하나에 불과했다. 별 하나가 없다고 해서 우주가 우주가 아닌 것이 되지 않듯이 사랑도 그랬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해버리는 순간, 사랑은 순식간에 작아지고 납작해진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가 해야할 일은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수천만의 행운이 겹쳐 만들어낸 오늘을 최대한 즐기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 p.205'
이 문단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말이다.
〈영원의 소녀〉
수정은 <아홉번째 생>의 고양이가 세번째 삶을 살았을 때 함께했던 주인이었다. 수정은 죽고난 후 옛 연인 정민을 찾아간다. 자신을 두고 떠난 정민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적당히 힘들기를 바라기는 했다. 그 바람은 적당히였는데 정민은 아이를 사고로 잃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정신의 자살시도를 목격하고 들리지도 않을 말들을 중얼거리며 막아서려 한다. '야, 이러지 마. 이런다고 뭐가 되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두고 봐라, 나아질 거야. 영원히 괴롭진 않아. 뭐든지, 즐거운도 괴로움도 영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p.253' 이미 죽어서 귀신이 된 수정이 하는 말이라 웃기면서도 씁쓸했다. 어쩌면 수정 자신에게 했어야 하는 말은 아니었을까.
〈이 세계의 개발자〉
<영원의 소녀> 수정의 애인 예진은 게임 개발자로 갑작스레 과로사한다. 죽었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보고 싶은 사람도, 원하는 소원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진은 귀신이 되었다? 예진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기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이 게임 속에 숨겨둔 토끼를 만나면서 이 세계의 개발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
주인공들 모두 삶에 크게 미련이 없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데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시간과 몸이 존재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삶은 항상 비슷하게 흐르고 일상을 지루하며 특별한 이벤트없이 평온하게 흘러간다. 보통의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통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나누며 끈질기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 삶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더라도.
신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도 만들었나보다. '어쩜 그렇게들 끈질기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p.289'
그래요. 끈질기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다가, 좋은 곳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