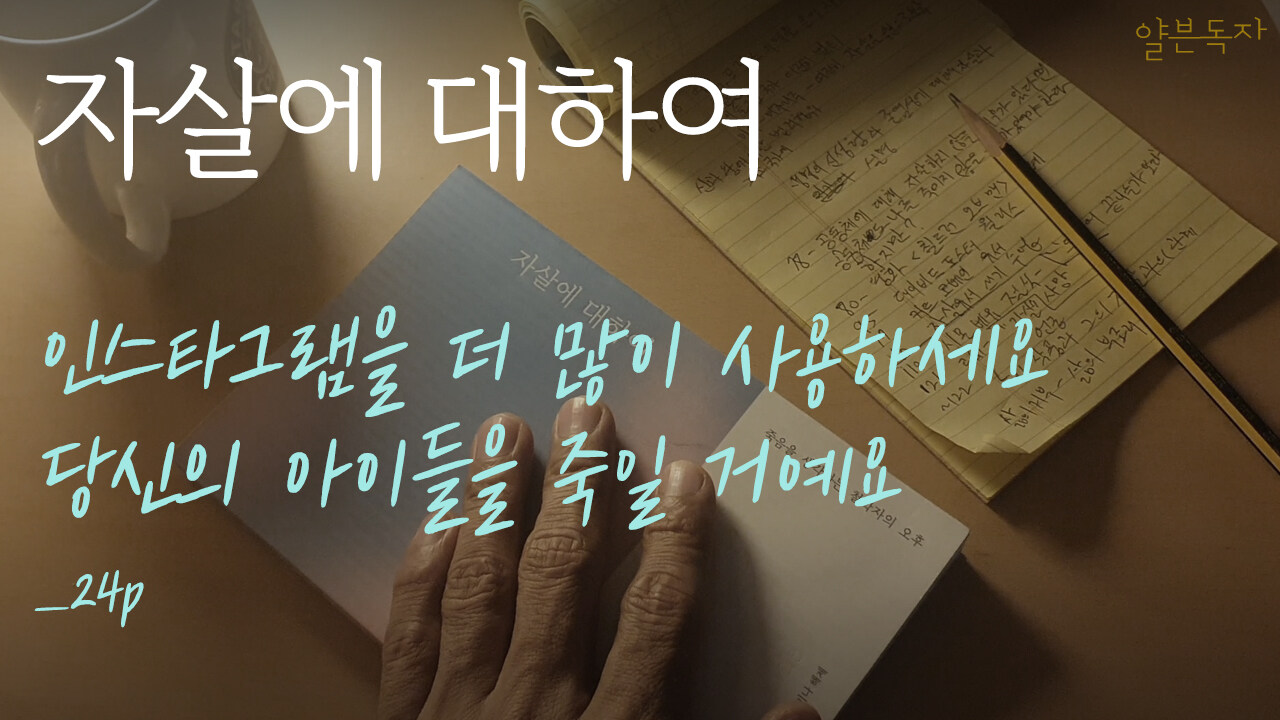-

-
자살에 대하여 - 죽음을 생각하는 철학자의 오후
사이먼 크리츨리 지음, 변진경 옮김, 하미나 해제 / 돌베개 / 2021년 7월
평점 :



이 책은 진지하게 자살을 실행에 옮길 사람은 볼 필요가 없다 (볼 사람도 없겠지만)
이 책은 자살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고,
그 행위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그렇다고 다른 자살에 관한 책보다 특별한 어떤 내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깨알같이 예로 든 작가들이나 작품들에 대한 사실들은 재미 있다
이 책은 201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20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개정판 서문에서 5년전 출간한 자신의 책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2015년에 쓴 이 책의 마지막에 대해
‘다소 태평한 방식으로 너무 빨리 낙관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
불만족스럽다’고 썼는데 나 역시 그렇게 읽었다
굳이 저자 나름의 결론을 도장 찍듯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어찌보면 결론 내릴만한 말은 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다
그런 불만족 때문인지 서문에 추가된 ‘소셜미디어와 자살 세대’ 라는 꼭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새로웠다
만일 이 책을 읽을 작정이라면 반드시 서문부터 읽기를 바란다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다보니
신간 목록에서 이 책의 제목만 보고도 얼른 차례를 살펴보았는데
차례의 제목이 이 책을 읽게 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책을 읽는 내내 나름의 재미랄 수 있던 점은
이미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장 아메리, 에두아르 르베, 에밀 시오랑과 같은 작가들을
저자도 언급하면서 특히 르베의 국내 미번역 소설 “자살”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품고 있었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만큼
더욱 그 소설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자살을 했거나 자살과 연관된 작가들,
카뮈나 버지니아 울프,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 같은 작가들이 등장해서 좋았다
그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와 자살 세대” 라는 꼭지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흥미로웠다
저자가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른
2012년 이후 자살사고의 빈도 수, 자살 시도 정도, 자살 수 같은
다수의 행동에서 실제로 중대한 증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십대 초반 소녀들의 자살률은
2012년 이후 두 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통계를 들지않아도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나 역시 인스타그램 이용자지만 과장되고 편집된 채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과연 이 이미지들의 세계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허탈한 생각을 하면서도
중독된 듯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원고를 쓰는 날 포탈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했다
“이러니 최악의 SNS” 인스타 중독, 이렇게 무섭습니다
헤럴드경제 2021.9.21.
http://naver.me/xB4V4vfP
자살에 대하여 Notes on Suicide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뉴스에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들으면서 자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용어의 대체가 과연 자살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방법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아진 보도지침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큰 동기는 자살을 둘러싼 어휘를 넓히고,
그 현상을 기술하고 이해할 더 많은 단어를 찾으며,
공허하고 진부한 말보다는 공감으로 자살을 대하는 것이었다.
_29p
우리에게는 자살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할 언어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살 소식을 듣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자살자의 무책임을 들어 자살자에 대한 비난과
자살의 이유에 대해 우울증이나 어쩔수 없는 고통 때문이라는 의견들을 나타낸다
순수한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신변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살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저자가 말하는 자살을 둘러싼 어휘나 단어란 말은
말 그대로 용어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살을 둘러싼 생각의 폭이
한정되었다는 것으로 나는 읽는다
생각이 다양해져야 그에 따른 말도 생겨나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듯 자살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질 때
자살에 대한 표현도 더 많아질 것이다
자살은 왜 비도덕적이라 여겨지는가
지금 이야기해보고 있는 이 책을 비롯해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가 포함된 책을
지인이나 가족이 보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과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
소설책이나 처세에 관한 책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까?
반대로 내가 읽고 있는 자살 관련 책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책상 위에 던져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만큼 자살이라는 행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죄악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생각의 뿌리가 어디인지 역사적 종교적 사실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대충 짐작하듯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비종교인이기도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자살이 부도덕하다거나 죄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인간 각자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나 공동체도 개인의 생존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살 유서
저자는 2013년 5월 자살 유서 쓰기 워크숍을 조직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맨하튼의 작은 공간에서 설치 미술의 일환으로 2주 동안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자살자는 유서를 남긴다고 하고
저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살 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살 유서는 고대 이집트부터 존재했을 것이고
18세기 자살 유서의 특징은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신문사에 유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프로이트의 논문을 근거로 자살 유서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고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졸업식 연설을 언급하기도 한다
자살 유서를 여러 편 쓰기도 한 커트 코베인의 유서를 통해
사랑과 증오의 양가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일반적 유서 보다 자살 유서가 좀 더 극적이라고 볼 때
상상하기도 싫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당신들은 어떻게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남은 이들에게 전하는 인사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하는 독백같은 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렇게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자살자들
인간을 비롯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맞는게 필연인데
유독 인간의 죽음 가운데 자살로 죽음을 택하면
그 삶은 자살만이 대표 이미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다
자살은 삶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 삶을 봄으로써,
삶에서 복잡성을 박탈해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뿐이다
_124p
사고나 병으로 죽는 죽음과 자살로 죽는 죽음은
왜 그토록 다르게 취급될까
자살이 그토록 유별난 죽음인걸까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 하면서 자살이라는 주제는
곧 삶은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나 성격상 이 질문까지 나가는 것은 좀
오버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책과 어울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의 답을 어느 승려가 한 말로 비유 해보자면 이렇다
삶에는 이유가 없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다
없는 이유를 자꾸 찾다가 못찾으면 자살밖에 없다
나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책의 마무리를
굳이 이렇게 해야하나 김이 빠지는 것이었다
어쨌든간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데이비드 흄의 ‘자살에 대하여’ 와
하미나 작가의 해제 역시 빠트리지 말고 읽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얇다면 얇은 이 책 내용의 빙산의 일부도 안될만큼 떠들어 봤다
그럴듯한 떡밥 같은 걸 던져놓고 이 책을 읽고 싶게끔 해야할까
글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런 책은 찾아서 볼 사람은 뜯어말려도 볼 그런 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