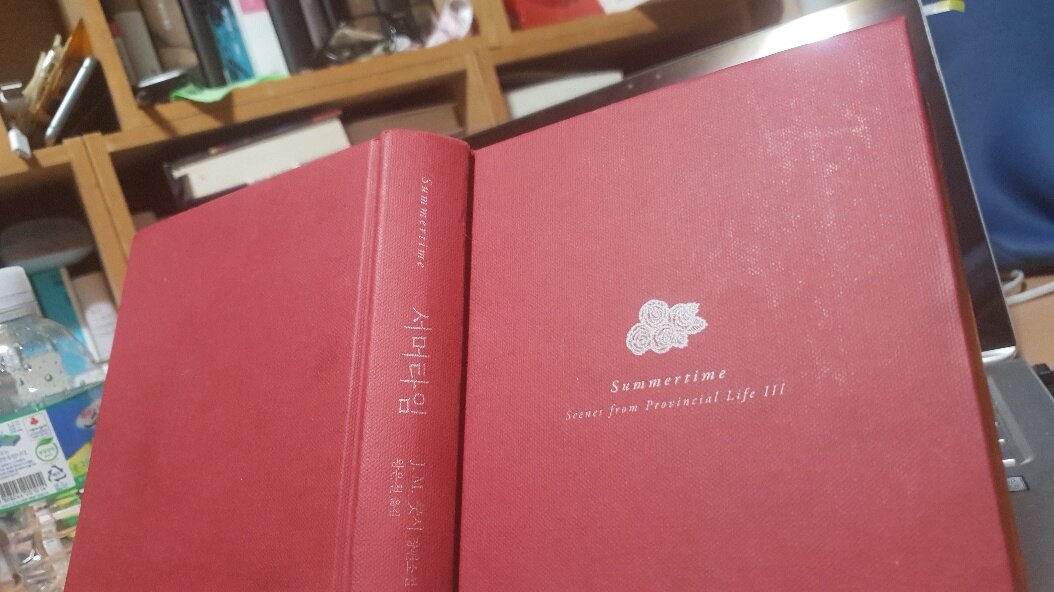쿳시의 자전소설 3부작 가운데 서머타임 을 읽다가 상관없는 잡썰
처음 존 쿳시라는 이름을 듣고 그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재빨리 도서관으로 가 그의 소설을 읽은건 쿳시가 노벨상을 받기 전이니 꽤나 세월이 흐름을 느낀다
쿳시를 소개하던 선생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작가라고 했는데 과연 선생의 안목이 대단했음은 그의 노벨상 수상과 그에 따라 국내에 출간된 쿳시의 작품들을 보면 알수 있겠다 물론 이전에 벌써 부커상 2회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수상하기 전에는 생소한 상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그렇게 비교적 초기에 쿳시라는 작가의 작품을 맛보기 식으로 접했지만 딱히 흥미를 끌만한 작가는 아니었다 그의 작품이 호락호락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쿳시의 작품은 그 옛날 읽은 그 하나밖에 없다, 처음 읽었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를 짜증스럽게 읽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코맨트가 여기 어딘가에 있긴 하다
이후 쿳시가 나름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넖혀가고 출간되는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많은 독자들이 읽고 리뷰가 넘쳐나는 와중에도 첫 작품 때문에 손이 가지는 않았다 다만 늘 관심 영역권 안에는 있었고 언젠가는 쿳시를 읽어야 할텐데 하며 신간들을 체크하고만 있었다
비교적 최근 서점 매대에서 이 자전소설 삼부작의 출간을 확인할 당시에도 아 또 쿳시 책이 나왔네 하고 시큰둥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건 상투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틀린 말도 아니란 것이다 인스타나 북플에서 누가 읽으면 따라읽게 되거나 일단 지르고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그렇다
좋은게 좋다 식의 리뷰와 그 리뷰어는 그닥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나름 믿고 보는 리뷰어의 리뷰에 쿳시 바람이 불었달까
자서전과 자전‘소설‘은 당연하게도 완전 다른 것 아니던가
쿳시는 이 자전 소설 속에서 더는 생존 작가가 아니다 일단 그 설정이 흥미로웠다 인터뷰로 진행되는 것도 좋은 설정이 아닐까 싶었다 어쨌든 가상의 인물들이지만 그것 역시 살아있는 쿳시가 써내려가는 것이니 그 인물들을 내세워 쿳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하면 빨리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은 것이다 작가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작품과 자신에 대한 평판을 써나갈 때 좀 낯 간지럽거나 하진 않을까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쿳시가 아닌 자기자신이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역시 이 책을 거침없이 집어들게 했다
옮긴이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백프로 ‘뻥‘은 아닌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대개의 문학작품 독자들은 작품에 빠지게되면 작가의 시시콜콜한 사적인 영역에 까지 관심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대중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작가가 자전소설을 썼다면 그 관심사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참고로 옮긴이의 말에 따르면 영어본에는 삼부작과 삼부작을 묶은 ˝시골생활의 풍경들˝ 까지 네 권이라고 한다 쿳시는 통합본을 낼때 원고의 상당부분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영어본을 봐야 한다
국내 번역본은 작가의 요청에 따라 영어 통합본에 따랐다고 한다
원서 볼 능력이 안되는 입장이다보니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뜯어 고쳤나 하는 호기심이 더더욱 강렬하기만 하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