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 - 양을 치며 배운 인간, 동물, 자연에 관한 경이로운 이야기
악셀 린덴 지음, 김정아 옮김 / 심플라이프 / 2019년 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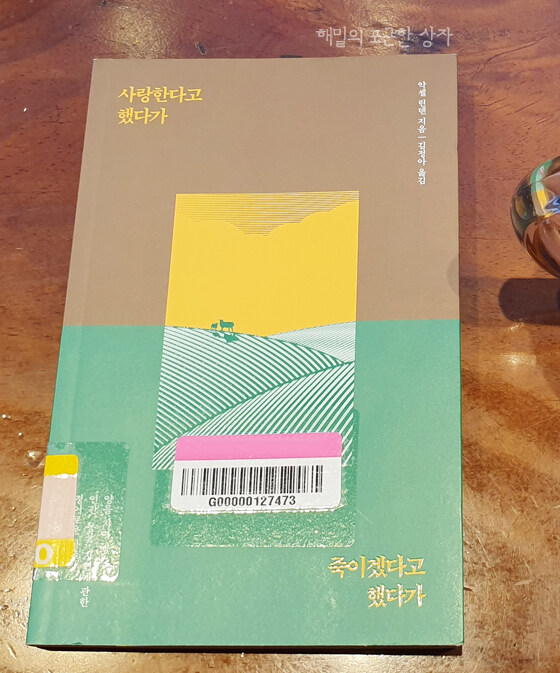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단골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면 으레 신간 코너부터 둘러보는 게 버릇이 되었다. 무인 도서대여기기 옆에 두 개의 책장이 있는데, 왼쪽에는 비문학 도서가 있고 오른쪽에는 문학도서가 꽂혀있다. 대부분 문학도서가 꽂힌 오른쪽 책장만 살펴서 책을 대출해 오는데, 그날은 왼쪽 책장에 손이 갔다. 많은 비문학 도서들 사이에 이 책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의 제목이 눈에 들었고, 책의 분류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망설임 없이 빌려왔다.
‘양을 치며 배운 인간, 동물, 자연에 관한 경이로운 이야기’라는 부제 때문이었을까,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500번으로 분류했다. 기술과학으로 분류되다니! 정확히는 527번으로, 농업과 농학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실제로 목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500번으로 분류되는 것에 의의는 없지만, 이 책은 결국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책의 제목인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는 첫 여름 마지막 일기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은 이렇다.
새 메시지가 올라왔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양들이 매애 우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창문 아래에서 들리네요. 무슨 일이 있나 나가 보겠습니다. 아, 어제 카달로그에서 괜찮은 칼을 골랐어요.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 한다는 게 이런 건가.
(p.33)
옮긴이의 글에 따르면 원제는 ‘양 일기’였고, 좀 더 친절한 제목으로 ‘스웨덴 양치기 아저씨의 좌충우돌 목장 일기’ 같은 것을 생각해보기도 했단다. 고민 끝에 도발적이면서 염세적인 이 책의 제목이 오히려 정확하다는 판단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양을 돌보면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양을 결국 도축하는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책을 읽으며 느낀 것 중 하나는, 내게 있어 ‘양’은 상당히 미지의 동물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양치기나 양이 풀을 뜯는 모습과 보더콜리와 목장만을 생각했는데, 모든 목축이 그렇듯 양을 키우는 것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축사와 울타리를 손 보고, 양의 건강과 상태를 살피고, 털을 깎고 도축을 하는 일.
양 말고 다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다. 예컨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양을 키우는 나는 그렇지 않다. 양을 키우는 생활 전체에 애착을 느낄 뿐이다.
일이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 양을 키우는 생활은 항상 양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취미 생활과 다르다. 1년 365일 양에게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만약에 대비해 하루 24시간 양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헌신이라면 헌신인데 대가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양고기? 양털? 그보다는 헌신하는 삶 그 자체가 대가라고 하는 편이 맞겠다.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삶을 꽉꽉 채워 주는 녀석들이 200미터 앞 방목장에 살고 있다. 되새김질에 여념이 없는 녀석들, 꽉 찬 게 뭐고 덜 찬 게 뭔지 전혀 모르는 녀석들이다.
(p.91-92)
양을 키우는 것은 결국 일이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삶 그 자체가 대가라고 하는 편이 맞겠다는 것도. 이렇게 하루하루 양 치는 이야기를 끄적거리는 것도 어쩌면 되새김질이라며, 큰 변화도 없고 별 재미도 없고 눈부신 장면도 없고 신바람 나는 순간도 없지만 글도 재미없게 써야 할까? 하고 자문하기도 한다. 여기서 재미란 빵빵 터지는 유머는 아니지만,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공부하는 연구자로 살았다는 전적답게 글이 맛깔났다. 양 떼 사이를 오가며 탈출한 양이 없는지 세고, 양들과 함께 나이 드는 것을 통감하고, 때로는 양에게 책임감과 애정을 느끼며 당혹스러워한 나날들이 쓰인 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다니. 이게 재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나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 모든 일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언젠가 끝장나기를 남몰래 바라고 있다.
이 땅과 이 풀과 이 양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의 현실이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땅과 이 풀과 이 양뿐이었다면, 도축과 육식은 윤리니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니 하는 것과 아무 상관 없는, 그저 생존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과 동식물과 약간의 울타리로 이루어진 유기적 세상, 이 세상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라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p.198)
앞서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을 키우는 생활을 하게 되며 갖게 된 생각을 풀어낸 이 부분도 신선했다. 그가 어떻게 양을 키워왔는지 읽어왔기 때문일까, 하나님이라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신 건강을 회복하려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방향인 것 같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다 보면 나의 자아감과 자존감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물론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쩌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내 단단한 마음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긴 것은 양의 개체 수도 훨씬 적고 경험도 없었던 2년 전이었다. 전기 공사 때문이었나, 기술자 두 명이 일하러 온 날이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도착해 이미 축사 뒤편에서 작업 중이었고, 나는 애들이 등교한 뒤에야 두 사람이 작업하는 곳으로 내려갔다.
내가 두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한 바로 그때, 양들이 갑자기 50미터 전방의 방목장 울타리 너머에서 “매애-”하고 울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감탄했다.
“당신을 알아보네요. 아까 우리가 왔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울컥했다.
(p.208-209)
양에게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할 수 없다. 양과 인간은 전혀 다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양의 습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들의 습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양이 하루는 양치기의 단단한 마음의 벽에 작은 틈을 낼 때가 있다. 양치기에게는 늘상 들어온 “매애-”였으나 누군가가 그것은 다른 “매애-”라고 말해주었고, 양치기는 그렇게 생겨난 작은 틈 역시 열심히 돌보며 살 것이다. 단순해서 오히려 다채롭고 다사다난한 양치는 삶을 계속하면서.
새 메시지가 올라왔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양들이 매애 우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창문 아래에서 들리네요. 무슨 일이 있나 나가 보겠습니다. 아, 어제 카달로그에서 괜찮은 칼을 골랐어요.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 한다는 게 이런 건가. - P33
양 말고 다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다. 예컨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양을 키우는 나는 그렇지 않다. 양을 키우는 생활 전체에 애착을 느낄 뿐이다.
일이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 양을 키우는 생활은 항상 양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취미 생활과 다르다. 1년 365일 양에게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만약에 대비해 하루 24시간 양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헌신이라면 헌신인데 대가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양고기? 양털? 그보다는 헌신하는 삶 그 자체가 대가라고 하는 편이 맞겠다.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삶을 꽉꽉 채워 주는 녀석들이 200미터 앞 방목장에 살고 있다. 되새김질에 여념이 없는 녀석들, 꽉 찬 게 뭐고 덜 찬 게 뭔지 전혀 모르는 녀석들이다. - P91
사실 나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 모든 일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언젠가 끝장나기를 남몰래 바라고 있다.
이 땅과 이 풀과 이 양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의 현실이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땅과 이 풀과 이 양뿐이었다면, 도축과 육식은 윤리니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니 하는 것과 아무 상관 없는, 그저 생존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과 동식물과 약간의 울타리로 이루어진 유기적 세상, 이 세상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라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 P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