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 있는 버뮤다
1
41313331. 성남시청이 진지한 진동 2회를 수반하며 매일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사는 지역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4명, 1명, 3명……, 1명이다. 개근이로군.
2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서울이 그런 영화에나 나오는 미래 도시처럼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건 지난가을이었다. 해가 저문 뒤의 저녁 때 부암동 고갯길을 밟으며 인왕산 쪽으로 넘어가는데 멀리 남산타워의 모습이 보였다. '아, 또 가을이구나!'라는 감회가 가슴 한 편으로 솟구치는가 싶었는데 동행하던 사람이 "지금은 대기질이 보통이에요"라고 말하는 거다.
"남산서울타워 기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빨간색이면 나쁨, 초록색이면 보통, 파란색이면 좋음."
그러고 보니 남산서울타워 기둥의 색깔은 초록색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 또 가을이구나."라고 외치기 전에 남산서울타워 기둥의 색깔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니 서울은 얼마나 미래에 가까이 가 있단 말인가!
시끄러운 시국에 사시사철 대기질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물려받은 재산은커녕 부모 형제를 부양해야만 하는 처지에 가족력이 있는 병에 걸린 신세와 같다고나 할까. 이제 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싶겠지만, 바로 그 이유로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싶다. 터 잡고 사는 땅의 꼴이 이렇다 보니 더욱 여행을 꿈꾸게 된다.
가장 그리운 곳은 일본의 나가사키. 맑았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파랬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말해서 뭐하겠는가. 노르웨이 베르겐. 미세먼지와 황사의 보호막 없이 있는 그대로의 햇볕을 마주하며 이대로 실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중국 베이징만 아니라면 어디를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숨쉴 만하다. 내가 1981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쓰겠다. 21세기가 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것입니다. 숨 쉴 곳을 찾아서.
_ 김연수, 『언젠가, 아마도』
아오, 재미져.
3
작년 이맘때쯤엔 하루에 한 번 이상 강제적으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듣고 살았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아광속으로 흘렀고 눈 깜빡 했다 싶더니 또 한 해 슥삭인데, 미세먼지라는 말만큼은 어쩐지 더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된장독에 구더기 걱정하게 생겼냐고, 지금 건물주가 임차료를 더블로 불렀는데.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꼭 전화를 걸어와 마스크 마스크 신나는 노래를 부르던 작년의 엄마가 생각난다. 좋은 노래였지만 나는 따라부르지 않았지. 얼굴에 땀도 차고 달리면 숨도 차고 안경에 습기도 차는 그따위 물건에 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미세한 먼지들에게 폐포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집 앞 슈퍼에 음쓰봉투를 사러 갈 때조차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코 부분을 최대한 꾹꾹 눌러준다. 예쁘게 하고 다니려고 마스크 스트랩조차 샀다. 살려고. 안 아프고 살아 보겠다고.
4
조금 더 읽어나가면 이런 대목도 있다.
세상이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건 인간이란 어디까지 긍정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건 아마도 지옥도 정겨워질 때까지가 아닐까.
_ 같은 책
아, 언젠가 정겨워지고야 마는 것인가, 아마도.
5
11, 12월에는 성의 역사 세 권을 읽는다. 4권까지 나왔는데 왜 3권까지 읽기로 정했는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시면, 중쇄에다 개정에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결과, 꼴랑 세 권인데도 표지 디자인에 통일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감히 상상컨대, 최초에는 세 권 다 3권처럼 촌스러운 형광 대일밴드 안에 부제를 집어넣은 디자인으로 뽑아냈는데(syo가 가지고 있는 세 권), 아무리 그래도 대일밴드는 아니다 싶었던 혁명 세력이 떨치고 일어났고, 투쟁 끝에 밴드 마니아를 축출, 개정된 1권은 부제를 간략한 밑줄 위에 올려놓았다. 썩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8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며 밴드 마니아가 돌아왔다. 그러나 한 번 권력을 잃고 월드컵이 두 번 열릴 동안 쓸개를 핥아야 했던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2권에서는 과감하게 대일밴드를 떼 버리고 젊은 감성에 부합하며 복식 매너의 상징성까지 갖춘 최신 ‘니플 밴드’ 스타일을 도입한 것이다. 올여름 당신의 얇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 ‘쾌락의 활용’에서 ‘락’과 ‘활’, ‘용’이 이루는 락활용 삼각지대의 정중앙에 주요 부분이 오도록 부착하세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선 비행기처럼, 겉에서 볼 때 뿅 하고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6
개론서도 한 권 읽기로 했는데, 지금 syo가 보유하고 있는 푸코 관련 개론서 등등은 요런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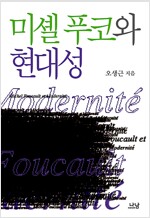



아무리 봐도 장판이 제일 쉬워 보여서, 일단 거기서 시작. 차곡차곡 읽어서 이 기회에 푸코 패스도 개척해 볼까.
7
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드립도 못 치고 무심한 가운데 10월의 마지막 날을 떠나보냈다. 그거 정말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한 완전 효자콘텐츤데…….
+
제목을 저따위로 붙여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었다.
--- 읽은 ---

201.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장석남 지음 / 문학동네 / 2012
시집 읽고 이런 걸 옮기는 건 처음이지만, 작가소개 전문을 인용해보겠다.
장석남 1965년 인천에서 났다.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몇 권, 산문집 두어 권 냈다.
이 짧은 소개를 통해 이 시집의 전체적인 느낌을 설명해본다.
1. 일곱 권이나 되는 시집을 ‘몇 권’이라고 뭉갰다.
2. 시집이나 산문집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3. “두어 권‘을’ 냈다”고 쓰는 대신, “두어 권 냈다”고 썼다.
이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젋은 시절의, 요동이 남아 있던 장석남이 좋았던 것 같다. 오늘날은 도통하신 느낌이라, 어쩐지 다른 중학교로 진학한 초등학교 시절 단짝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는데 걔는 이과 가고 나는 문과 간 그런 기분이랄지.
--- 읽는 ---



언젠가, 아마도 / 김연수
‘장판’에서 푸코 읽기 / 박정수
과학을 기다리는 시간 / 강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