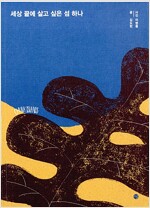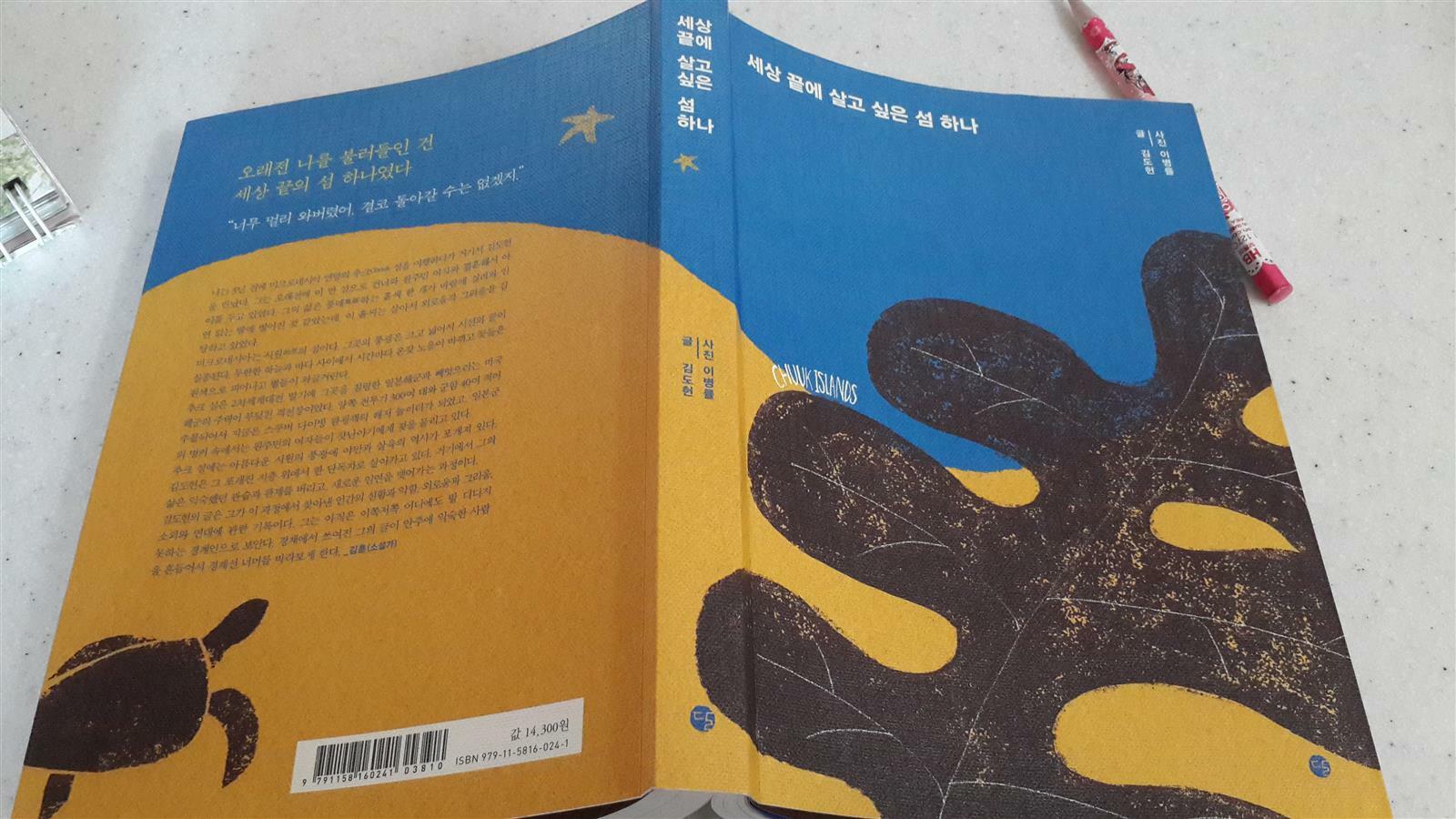아이들 학교 보내고 읽던 시집을 읽고 내일 모레 제출할 숙제에 대해 생각해보려고했다. 아이들 돌아오기 전까지 푹 쉬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할일이다.
그런데 자꾸만 할일이 생긴다. 엊그제 사온 나물을 삶아 찬물에 담가두고 벌써 한두달전에 떨어진 깨를 볶았다.
늘 엄마나 시어머니께서 볶아주던 깨를 받아 먹었던지라 깨를 어떻게 볶는줄도 몰랐다.
몇년전 ˝넌 나이 마흔이 넘도록 깨도 볶을줄 모르냐˝하던 친정엄마의 타박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냥 볶으면 되는줄 알고 볶았다가 어느날 깨가 들어간 음식마다 돌이 씹혀 고생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깨를 어떻게 볶아야하는지 제대로 배워본적이 없었다. 그저 살림이란 두리뭉실 얼렁뚱땅 되는줄로만 알았던 무식함 그 자체였다. 깨가 잘 볶아지는 타이밍은 타닥타닥 튀어오를때라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고소한 냄새가 퍼진다.
오늘은 어제 하루와 다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여유인지 모르겠다. 남편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어? 잘 쉬었어?˝하고 마지막 끊을때도 ˝그럼 푹 쉬고 있어!˝한다.
푹 쉬기위해 책 한권 펼쳐들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ss님이 건네준 <세상 끝에 살고 싶은 섬 하나>를 읽는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추크섬에 머문 김도헌님의 글을 읽으며 섬생활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난 고립된 삶을 원하지 않으니 아무리 바다가 좋아도 섬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가끔 찾아가 해풍을 맞고 파도소리 듣는 것은 좋지만 말이다.
아이들 오기 몇시간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란다 정리 좀 해야할 것 같다. 겨우네 쌓아놓은 것들을 치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