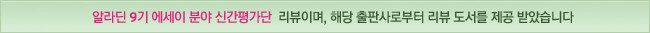[생각의 일요일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생각의 일요일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생각의 일요일들
은희경 지음 / 달 / 2011년 7월
평점 :



다른 사람의 섬세하고도 은밀한 생각의 편린들을 읽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 책을 펼치기 전에, 9월에 읽고 싶은 신간 에세이로 추천할 때까지도 이 책은 읽기에 그닥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소설가의 작가 노트 비슷한 내용이지 싶어 책장이 술술 넘어갈 듯 싶었는데 생각보다 손에 책이 잘 잡히지 않았다. 뜸을 들인 시간이 좀 길었다. 후반부쯤 읽었을 때는 책 읽기를 중단하고 대충 리뷰를 써도 크게 다를 것이 없겠다는 유혹과도 싸워야 했다. 짤막짤막한 손바닥만한 글들의 모음집이라서 그에 대한 반응도 짤막짤막한 단상이 주를 이룰 것 같았다.
한마디로 이 에세이집은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변명삼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책의 끝무렵쯤에 나오는 작가의 다음 글을 보고야 나의 이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는데,
(319쪽) 가끔 내 인생이, 독선적이면서 내 소설을 한 편도 읽지 않은 사람과의 기나긴 문학 토론이 될 것 같은 우울한 생각이 든다.
'독선적이면서 내 소설을 한 편도 읽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싶어서다. 나는 그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다. 언제부터 소설을 잘 읽지 않는 건조한 생활에 접어들었지는 기억이 가물거린다. 언제부턴가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시점이 소설을 멀리한 시점이 아닐는지.
하여튼 그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소설에 관련된 수많은 섬세한 이야기의 편린들이 내게는 낯선 언어로 다가왔고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다가왔다. 은밀한 속삭임에 쉽게 빠져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내 감상일뿐 실제로는 그의 아름다운 문장들에 넋을 잃기도 하여 여기저기 포스트잇을 붙여놓지 않을 수 없었다. 매력적인 부분이 참 많았다. 이를테면,
(275)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 속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다른 건 컬러이고 그것만 흑백인 것처럼 이상해 보여요.
(77) 나는 불리한 내 삶을 책임지면서 살 뿐이야.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굳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불량품이라고 모멸받으며 살고 싶진 않아. 내가 졌다거나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피한 것도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삶을 선택한 것이고, 거기 당당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이 책이 불편했던 이유가 또 생각났는데...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기장이나 수첩을 슬쩍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굳이 그 속 깊은 생각을 알고 싶지 않은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기분 같은 거.
그의 소설을 한 편도 읽지 않으면서 독선적이기까지 한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례한 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서 작가는 소설이란 그 글을 쓰는 시간이나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침 이 책을 다 읽고 집어든 장정일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2>에는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230) 오웰은 제대로 된 서평이 작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한 분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서평자가 서평을 의뢰받은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정통하다고 간주했을 때, 적어도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매는 주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읽고는, 아무리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분량의 글로 그 리뷰를 작성한다는 게 참 무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