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 여자
오정희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년 9월
평점 :

절판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이다. 읽을 거리를 찾아 집안 여기 저기 뒤지다가 아버지의 책들 중에서 발견해 낸, 지금은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그 소설집에 오 정희의 <완구점 여인>이 있었다. 그리 긴 소설이 아니었으므로 금방 읽기는 했지만 그 느낌을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기억이 난다.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는, 기쁘다, 슬프다, 역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모호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했던 그 느낌은 오랫 동안 오 정희라는 작가에 대한 나의 감정이기도 했다.
몇 년전 작가가 오랜만에 펴낸 우화집 <돼지꿈>을 읽었고 예전에 읽었던 <유년의 뜰>을 다시 읽으면서 점차 그녀에 대해, 그녀의 소설들에 대해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 동안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가져다 준 이해의 폭 덕분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우연히 도서관의 서가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가을 여자>. 날짜를 보니 작년 9월에 나왔는데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안 읽고 있지는 않았을텐데.
전작 <돼지꿈>과 비슷한 형식의 짧은 글들이 스물 다섯 편 실려 있다. 제목의 '가을 여자' 란 인생의 가을 쯤에 이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라 짐작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타일이 어디 가는가. 짧은 글 속에서도 여지없이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120% 다 전달하고 만다. 조용한 목소리로, 일부러 요란한 사건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일상의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그녀만의 예리한 시선과 관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때로는 반전으로, 때로는 어이없는 황당함으로, 때로는 마음을 알싸하게 물들이는 감상으로, 세상은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것도,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흔들림 없이 말해 주고 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레이스 뜨기로 두 아이와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여자 앞에 나타난 청년 ('그 가을의 사랑'), 그녀만이 할 수 있을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복사꽃 그늘 아래서', 아들의 다이어리에 쓰여진 알파벳 약자를 추리하면서 서로 소 닭 보듯 하던 남편과 다시 마음을 주고 받게 된다는 '간접 화법의 사랑' 같은 이야기는 일부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글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생'에서의 어머니, '긴 오후'에서의 시어머니는 앞서 산 세대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정 표현이라고는 하는 법이 없던 어머니가 버스를 놓쳐가면서까지 느닷없이 방생을 하고 있는 모습,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뿐 아니라, 아들, 며느리, 손자의 사진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시모의 보자기를 발견하는 며느리의 심정,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보는 기분이었다. '요즘 아이들'에서는 오랜 만에 큰 맘 먹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고 비싼 식당을 찾았으나 서로 겉돌기만 하는 대화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흔한 소재일 것 같은 이야기를 참 실감나게도 그려놓았다. 사추기나 로맨스 그레이와 같은 뜻이면서 더 격이 있지 않냐는 '서정시대'에서의 반전은 서정적인 감상을 한번에 뒤집어 놓고, 중년 가장의 심리를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 '병아리'와 그 다음의 '꽃핀 날'은 이 책에 실린 글중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두 편이다.
 |
|
|
| |
남의 밑에서 밥 먹는 월급쟁이들이 거개가 다 그렇듯, 사내라면 한 가지씩은 타고 나기 마련이라고 공인된 성질머리 죽이고 더러운 꼴, 아니꼬운 꼴 꿀꺽꿀꺽 삼키며 근무를 끝내고 만원전철에서 삼십 분, 다시 만원버스에서 삼십 분 시달려 서울의 외곽 지대까지 오는 동안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휴식 뿐이었다 (216쪽) |
|
| |
|
 |
그렇게 오로지 휴식을 바라며 들어온 집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병아리 소리는 남자로 하여금 식구들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사왔다고 애지중지하며 병아리를 보살피고 있던 일곱 살, 다섯 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린다. 당장 베란다로 내가라는 아빠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방 안에 데리고 들어와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의 감상이 읽는 나를 울컥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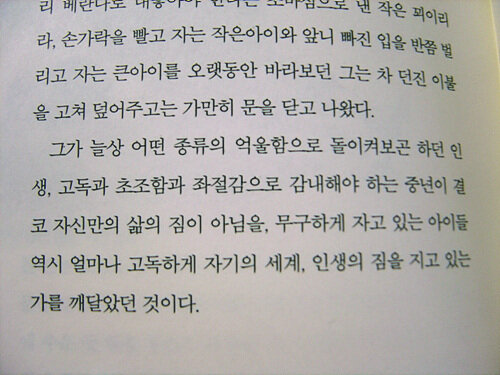
마지막 글 '꽃핀 날'에서 여자는 늦게 일어나 동동거리던 와중에 문득 유리문 너머로 목련 꽃망울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끼지만, 결국 식구들 아침밥을 제대로 못먹여 불평 속에 출근, 등교를 시키고 난후 다시 바라본 목련은 더 이상 몇 분 전의 그 목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뭔가를 깨닫는 장면이다.
 |
|
|
| |
집 안은 갑자기 가위눌린 듯 조용해졌다. 솥 안에 새까맣게 눌어붙은 밥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다가 난데없이 후룩 누물이 떨어졌다. 슬프다거나 참담하다거나 따위 자극적인 감정의 작용이 없는데도 그랬다. 눈물이 어린 눈에 환시처럼, 착시현상처럼 피어오르던 목련이 떠올랐다. 아마 지금 굳이 그 꽃을 찾아보려 해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꽃이 피어나는 그 운명적인 시간이 내 존재의 한순간과 만나 섬광처럼 부딪치고 사라졌다. 인생에의 꿈이나 그리움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인가. (227쪽) |
|
| |
|
 |
작가의 이 통찰력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녀의 소설 속에는 이제 소설로만 보이지 않는 그녀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통찰과 관조가 들어있다. 그래서 소설을 위한 소설이라기 보다는 삶의 경륜이 녹아있는 '수필적' 소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그러기에 짧은 우화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닐지. 가을을 가을답게 하는 이 책을 누구에게든 권하고 싶은 마음이다. '역시 오 정희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