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자마자 시를 읽었다.
“나 없는 나의 무덤”(최승호, 「생일)」, 《대설주의보》)
“꽃은 없고 꽃잎들이 무수히 날린다”(이수명, 《붉은 담장의 커브》 自序)
판이한 두 시인의 비슷한 문장을 보고 반가웠지만 웃지 않았다. 우리는 닮을수록 슬픈 짐승이기에. 물론 누군가는 분노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자신만의 변별력도 죽도록 원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시인이란 그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황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그의 삶은 워스워스의 시를 읽은 후 완전히 바뀌었다)은 시인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듣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들, 독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네 ‘뮤즈’와의 관계이다. 뮤즈는 인색한 고용주이다. 시인에게 영감(영 단어 영감이란 ‘신성한 입김’이라는 뜻이다)을 쏟아붓지만 돈은 주지 않는다. 운문을 만드는 사람처럼 가난이 확실한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시인의 다락방’(다락방이란 우중충하다)이라는 표현이 있겠는가. ‘의사의 다락방’ 혹은 ‘변호사의 다락방’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시인 필립 라킨은 언젠가 시인은 저 전설적인 개똥지빠귀처럼, 가시가 가슴을 아주 날카롭게 찌를 때 가장 달콤하게 노래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략) 이번에는 조지 오웰의 이미지를 활용해보자. 오웰은 사회를 고래로 보기를 좋아했다. 성경에서 고래가 살아 있는 요나를 삼켰듯이, 이 괴물은 본성상 인간이란 존재를 삼키고 싶어 한다. 요나는 이 리바이어던에 의해 씹혀서 먹힌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배 속에’ 갇힌 것이다. 오웰의 표현대로라면 예술가의 의무는 ‘고래 밖’에 남아 있다. 고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혹은 자신이 쓴 《동물농장》처럼 조롱하면서 작살을 던지든가) 요나처럼 잡아먹히면 안 된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사물로부터 거리를 지키는 일이 필요한 예술가인 것이다.
_ 존 서덜랜드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어제는 끝난 일을 허겁지겁 갖다 주고(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꿈을 꿨으면 로또를 사야 한다는 대세에 따라 로또판매점에 갔는데 밤 8시가 지나서 오늘은 로또를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 그렇다. 운도 뭘 알아야 부지런해야 잡을 수 있다. 사실 인간은 ‘미리’보다 ‘뒤늦게’를 더 가까이하는 존재이지 않던가. 특히 내가 더 그렇지.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은 언제쯤에나 / 속시원히 나를 풀어줄 속셈인가”(최승호, 「별 것도 아닌 것이」, 《대설주의보》)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나를 위로해주는 문장은 대부분 시집에 있었다.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생각을 시인이 했고 나도 공감하기 때문이다. 시인이라 부를 수 없지만 나도 시인에 가까운 독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시인이라고 깝죽거리는 시인보다 시인에 가까운 독자를 더 좋아한다. 다시 읽고 싶어서 산 중고 시집 이수명 《붉은 담장의 커브》에서도 그런 독자를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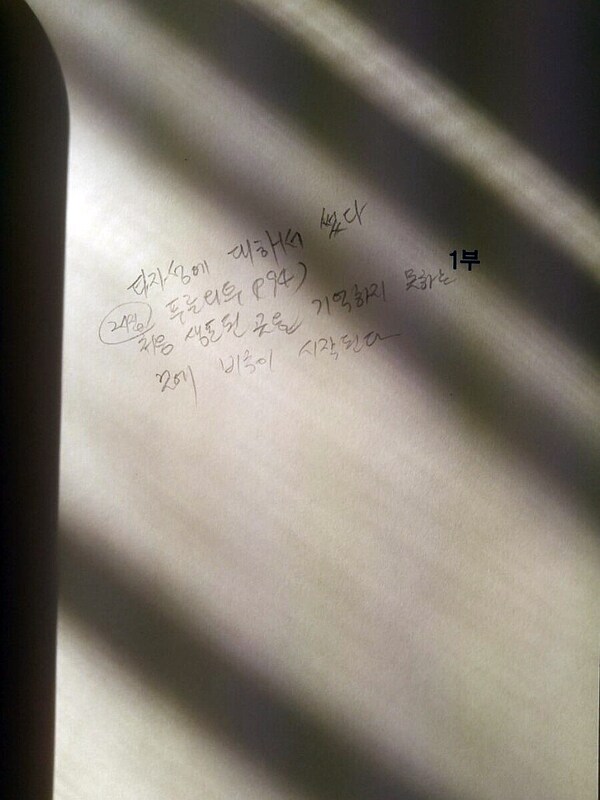
난 모든 메모를 꼼꼼히 지우고 중고로 판다. 이 시집의 전 주인은 아무래도 자신의 사유를 누군가 봐줬으면 했던 거 같다. 내가 생각해도 이 독자의 생각은 꽤나 타당했기에. 보여주고 전파하는 제삼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고리여. 인간의 언어 행동은 깨어 있는 시간의 5분의 1을 소비한다.(파스칼 피크·베르나르 빅토리·장 루이 데살 《언어의 기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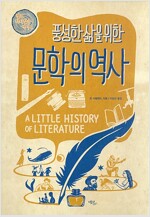



서울국제도서전에 가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30분 동안만 쓰기로 해놓고 벌써 20분이 초과되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알리면 알쓸신잡 3회 관람기는 내일 올릴 거 같다. 이번에도 정리할 게 엄청 많았다. 재방송을 보려고 하면 왜 항상 같은 지점만 보게 되는 걸까. 이건 머피의 법칙까지는 아니고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미리보다 뒤늦게 세계에 내가 주로 출몰하기 때문이지. 미리는 우연의 세계에 여신 같은 거랄까.
알라딘 티셔츠가 드디어 등장했다. 알라딘 머그컵의 진화처럼 이 아이템도 진화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실망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