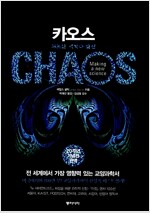《열한 계단》의 답장을 기다린다는 얘길 들었지만 내가 무슨 얘길 해야겠다 작심한 건 아니었어. 밤을 새우고 벚꽃 같은 아침 구름을 보고, 그것들이 꽃잎보다 더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고, 비둘기들이 개념이니 인간성이니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것을 스쳐 지나며, 문득 ‘채사장....‘이란 수신인을 떠올렸지. <열한 계단>을 읽지 않고 제대로 대화가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일단 도서관 대출 예약이 포화 상태인 거 축하해.
당신은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가 최대 고민이고 슬프다고 했지. 진화를 공부할 때 그 연속성에서 명쾌함과 깨달음의 기쁨보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내 슬픔처럼. 기독교가 종의 고통을 위무하는 방식이었다면 불교는 개체로서의 극복을 강조하지. 그래서 우린 거기에 심취하게 된 걸 거야.
반복.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고 있는 듯 혹은 팔짱을 끼고 윤무를 추듯 비슷한 반복들, 패턴들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극복하려 하지. 익숙해지던가 낯설게 보던가. 바꿔 말하면 생활에 몰두하든가 창조에 몰두하든가. 그렇더라도 붓다가 말한 대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지. 이 끝없음. 이 연속들. 절대적 하나라는 것이 가능한가 싶지. <우파니샤드>는 나도 읽었어. 그때 내게도 이 책은 어디론가 열리는 문이었지.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인 브라만[梵]과 개인의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我]이 하나[一如]라는 범아일여(梵我一如)˝ 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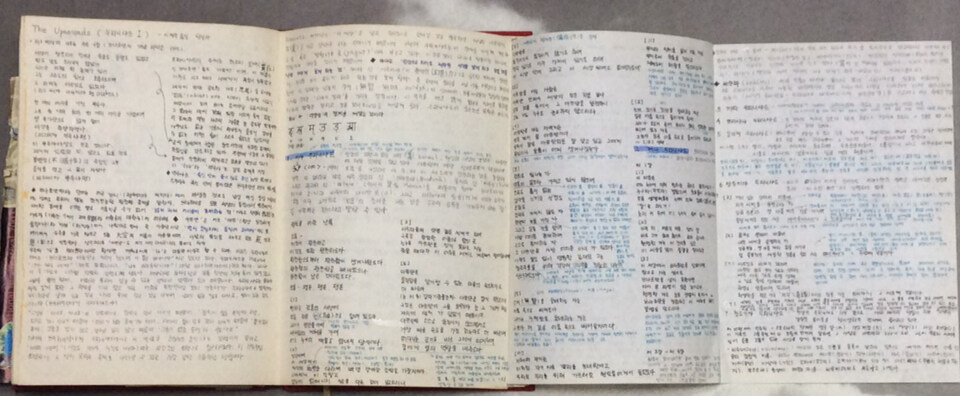
깨알같이 메모하며 몹시 고양되어 읽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은 그때 적은 문장들이 얼마나 낯선지. 우리 구조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봐. 삶 속 지루한 반복을 이기기 위한 망각과 변형. 우리가 아이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처럼. 질서와 무질서 혹은 선형과 비선형의 공존 속에 삶이 기능한다는 것. 그렇게 심장은 뛰고 눈송이는 불완전 속에서 완성되어 떨어져 내려.
참고가 될까 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싶어 이 말도 꺼내. 나는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두 번 있어. 아이였을 때와 어른이었을 때. 아이였을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맞았는데, 뭐랄까. 그건 차라리 평화로움이었어. 무언가 이뤄야겠다는 욕심도 없던 때였고 바득바득 살아야겠다는 열망도 없는 그런 나이였지. 기묘한 낯섦. 주변 사람들이 애태울 뿐이었지. 나라는 주체나 정체성의 문제는 없었던 거 같아. 본질과 관념을 엮으면서 문제가 어려워지지. 당신은 교통사고 후 내가 나인지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했어. 커서 죽음을 가까이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더군. 삶에 대한 욕심과 절망감이 순간마다 불길처럼 치솟았지. 내가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이 세계는 이미 그런 초월을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우린 더 집착하게 되는 걸까.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나. 내게 맞춰 끊임없이 내 구성체를 모으고 조립하는 나. 이걸 두려움이라 말해야 해? 본능에서 학습을 구분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야. 촘스키와 스티븐 핑커는 학습하는 언어 본능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잖아. 우리 뇌구조만 해도 파충류의 뇌부터 해서 다양한 파티션들이 서로 이해 상충하고 있어. 이 부분은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많은 보류들... 어떤 사람은 그걸 불가지론이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립의 한계라고도 말하지. 정보의 구조화 속에서 누군가는 예측 가능성을, 누군가는 예측 불가능성을 읽는 것은 의미심장해.
제임스 글릭 《카오스》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
˝불연속성, 잡음 버스트, 칸토어의 먼지와 같은 현상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하학에서 아무런 위치도 차지하지 못했다. 고전 기하학에서 다루는 모양은 선, 평면, 원과 구, 삼각형과 원뿔이었는데, 이는 현실을 고도로 추상화한 것으로 플라톤적 조화의 철학에 강한 영감을 주었다. 유클리드는 이들을 가지고 2000년간 지속되어왔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기하학을 만들었다. 예술가들은 도형들에서 이상적인 미를 발견했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론을 정립했다. 하지만 복잡성을 이해하기에는 이 도형들이 추상화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구름은 구가 아니다. 망델브로가 좋아했던 말이다. ˝
구름의 불규칙성 때문에 비행기 탑승객은 구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지. 구름에 대한 많은 계측을 통합해 우리는 구름을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 11차원에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볼 거 같아? ‘나‘라는 실체를 지금보다 더 파악하기 어렵겠지.
아아.... 내가 철야를 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쓰기는 곤란한 거 같아. 나중에 이 편지를 아마 고칠 거야. 답장은 바라지 않을 테니 한 달 혹은 6개월? 뒤 아무튼 한 번 더 읽어 줬으면 해. 더 정교히 다듬어 올렸으면 두 번 걸음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_~; 어제도 45명 중 운전자 한 사람만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어. 차체에 끼여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발견돼 응급차로 실려 가던 중 사망했다고 해. 세상 일은 먹먹하게 하는 공백들이 참 많아. 그렇지?
졸리다. 또 나로 합체되기 위한 잠, 이 시스템도 지겹지만 그나마 제일 조용하고 걱정 없는 곳이지. 당신도 잘 알 거야.
마지막 성냥은 과연 뭐가 될까. 희망이라 말하든 궁금증이라 말하든 이 때문에 우린 끝까지 가고 있는 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