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비평가, 사진이론가, 화가, 소설가, 다큐멘터리 작가, 사회비평가 등 수많은 타이틀은 존 버거(1926.11.5~2017.1.2, 런던 태생)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 누군가 붙인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것처럼. 내가 삶에 그렇듯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방식이 중요했을 뿐.
결국 그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수긍했을까. 단지 임할 뿐?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 이 소설을 써보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소설이 그렇게 만져 볼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시간의 특징에 대해 암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소설 <G>를 내려다보며...
존 버거, 파스칼 키냐르, 미셸 우엘벡, 필립 로스, 존 파울즈, 곰브로비치 (더더 많겠지) ... 그들은 ‘ 존재가 겪는 섹스(욕망)와 시간과 죽음‘ 사이의 궤적과 밀도를 측정한 작가군일 것이다. 문학의 오래된 주제이지만 그 연결들은 현대에 와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본다. 개인화된 현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이 피할 수 없이 닿게 되는 지점 아닐까 싶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걷고 있던 그들. 존 버거가 소설 <G>를 부르주아 문화가 와해되어 가며 개인의 욕망이 커지던 1886~1915년 사이로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숨이 나왔다. 아무리 내뱉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암흑. 그리고 각자 발견했던 빛. 다시 어둠.
˝그의 생각에, 미친 사람들은 전부 아니면 무를 요구했다.˝
˝세상의 일 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라.˝(세잔의 말)
˝모든 역사는 동시대의 역사다.˝(R. G. Colling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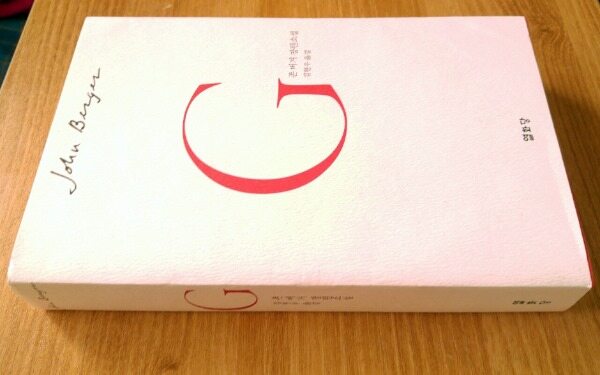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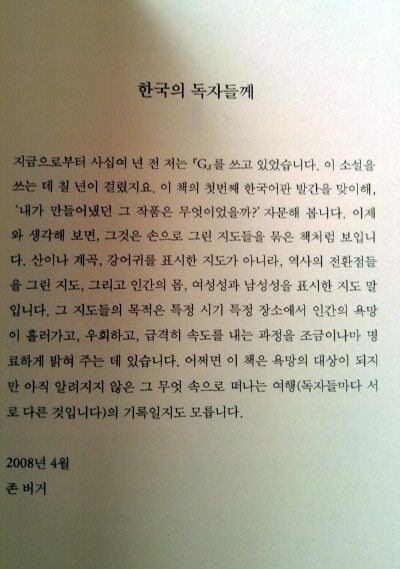
모든 것이 내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존 버거 에세이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밑줄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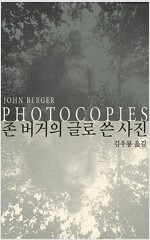
인간을 뺀 모든 신중한 동물,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내보이려 하지 않는다.
마을은 근년 들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겨울햇빛 아래 멀리서 보면, 마을은 이 세기가 시작되던 때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 마을은 신비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상과 닮게 그리는 것이 인물화의 조건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닮을 수도 닮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것은 신비로 남는다. 이를테면 사진의 경우 ‘닮음‘이란 없다. 사진에서 그건 질문조차 되지 않는다. 닮음이란 생김새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두 손가락 끝이 만나는 것같이 두 방향에서의 겨냥이 그림에 포착된 것이리라.
벙어리 털실장갑을 끼고 바흐를 연주하는 글렌 굴드
기하학이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을 보려는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앙리 까르띠에는 말했다.
산 위에 조금만 있어 보면 외롭다는 생각은 사라진다. 발가벗고 살기 때문에.
발가벗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동반자가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물론 마르셀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밤에 옷을 입고 잔다. 그럼에도 알파주에서 혼자 한 주 두 주 지내다 보면, 영혼은 윗도리를 벗기 시작하고 이윽고 알몸이 되면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의 눈에서 그것이 읽힌다.
영혼은 그렇다 쳐도, 가축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늘 있었다.
두 마리의 개가 소들의 이름을 죄다 알고 있을 정도지만, 그럼에도 소가 길을 잃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곳 산에서는 개연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소나무 숲이 지금 막 걸음을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은하수가 마치 모기장처럼 가깝게 보일 때도 있다.
어느 8월 아침에는, 우유 짜는 헛간에서 똥 치울 때 쓰는 외바퀴차의 손잡이가 얼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이 너무 빽빽해 걷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은 조약돌 사이의 빈틈을 찾는 작은 물줄기처럼 앞으로 나아간다. 그 물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조약돌이 된다. 인구 통계 그래프야 신문에서 보면 되지만, 이런 군중들 속에서는 손등에서 퍼져 나오는 따뜻함과 연료와 배기가스의 냄새, 시멘트 가루와 생선, 예피, 똥 냄새, 플라스틱 타는 냄새, 요오드팅크, 꿀과 식초 등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진 냄새에 의해 장강의 흐름과도 같은 끈질기고 격렬한 생육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 아테네의 오모니아 구역에서, 삶은 제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다.
햇빛에 구운 흙과 돌멩이, 풀, 엉겅퀴, 도마뱀, 조개 껍데기 화석, 또 야생 꽃상추,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그런 후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의 젖은 올리브 잎, 다음날 길을 따라 걸을 때면 발목에 감겨 오는 따가운 이른 오후의 정적, 마치 유년기 그 자체처럼 끝없이 이어지던 이런 일상들, 그것들은 하루와 함께 길 저쪽끝으로 꿈틀거리며 사라진 후 다음날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는데, 어느 것 하나도 오래 붙잡을 수 없었기에, 길은 늘 경이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사와 존(사진: 마리사 카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