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이킬 수 없는.
어딘가에서 불이 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한 채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너무 뒤늦게 알게 된다. 유나[*]는 죽었다. 나는 아프게 밥을 먹었다. 배는 부른데 아픔은 가시지 않는다.
[*] <그것이 알고 싶다>(976회, 열아홉 소녀의 사라진 7년, 2015. 3.14)
§§ 우리의 인격은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싸우고 난 뒤에 드러난다.
언제나 나는 내 의견의 관철이 아니라 다른 시각과 풍부한 관점이 모이길 바랐다. 나는 의견 충돌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대는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이후 내가 좋아요나 댓글을 달면 글을 바로 삭제하고 다시 올렸다. 내 마음 상함 보다 상대의 마음 상했음을 존중해주고자 시일을 기다렸다. 어느 날 그가 새 이웃으로 등록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 모르는 새 그는 이웃을 취소했다가 다시 이웃 추가를 한 모양이었다. 무엇을 위해 다시?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제 서로 잘 지내보자는 건가 싶어, 나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의례적인 댓글이나 좋아요로 동조와 관심을 보였다. 그의 분노는 여전했다. 내 좋아요가 달리자마자 그 글은 사라지고 다시 새 글이 등록되었다. 나중에 안 일인데, 간발의 차로 다른 이웃의 좋아요가 같이 달리면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다른 이웃과 덕담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 인간 사회에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위신을 위해 이웃 취소 부탁드린다는 비밀댓글을 남겼다. 일말에는 내 오해이길 바랐건만, 그는 내 비밀댓글을 시원스레 지우고 나도 지웠다. 상대가 끝까지 괘씸하게 굴어서, 비밀댓글로 달지 말 걸 그랬나 뒤늦게 생각했다.
안타까운 건, 그가 격찬하는 예술과 문화가 그의 인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이다.
하필 13일의 금요일에 절정이었다.
§§§ 자화상의 무용성.
좋건 싫건 나는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림의 추구를 놓아버린 뒤 나는 색이 사라진 내 세계를 바라보는 천형을 겪는다. 20년 전의 그림들은 집안 구석에서 곰팡이의 안락한 거처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들 속에 숨겨놓은 숨은그림찾기 목록을 나조차 잊어가고 있다. 내가 붙인 제목도 생각나지 않다니!

요즘 컬러링북이 유행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무엇을 마주하고 찾게 될까 궁금하다. 단지 잡념을 잊거나 작은 성취,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쉬운 일이다.
스케치의 구도와 데생력도 그렇지만, 색에서도 그 사람의 중요한 심상이 바로 드러난다. 색의 변환을 시도할 때조차 문체처럼 색의 구조성은 따라다닌다. 그것은 그의 전 작품에 드러나며, 그러므로 그림은 그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의 현현이다.
어제는 그림을 그리며 손과 어깨가 하나로 뭉쳐 보였던 게 충격이었다. 색도 잃고, 선의 구분도 잃고, 마지막에 남는 것을 과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이 나일까. 세상엔 무수한 추상이 있지만, 내가 바란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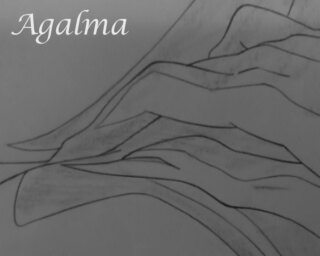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 절망에 대한 것을, 이 사회가 왜 이미지와 사물을 탐식하는 스펙타클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미 기원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영상들은 항상 자신과 꼭 맞는 허공의 길을 찾는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말한다. 별자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이름붙이고 바라보듯이.
현재 스펙타클 사회를 논하며 비판하는 자본주의, 소비사회, 시장경제 체계는 외적 발화점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또다른 체계로 바뀌든 우리 의식의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개개가 공동체와 선(善)의 의지를 부단히 세워나갈 때, 이 의식의 무소불위와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조화와 파괴의 각축...
내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듯이 세상 또한 그렇다.
ㅡAgalma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ㅡ 에피쿠로스 『쾌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