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막 소리 ㅣ 창비시선 340
문인수 지음 / 창비 / 2012년 1월
평점 :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시는 존재한다고 믿는다. 오규원이 말년에 발표한 시들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인간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도 시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본 사람은 안다. 인간 언어의 한계를. 그 절절한 마음과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역도 성립한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한계는 사유의 한계이고 앎의 범위가 내 존재의 범위라고 생각해 본적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도 아니면 시의 힘, 언어의 세계가 가진 해석의 틀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작은 점 하나 - 이시영
가장 적게 먹고
적게 일하며
느티나무 가지에 깃을 묻고 잠든 새는
하늘을 차고 오를 때 하얀 새똥을
지상에 남긴다
거대한 구두 발자국이 막 닿기 전
아침 햇살에 잠깐 보석처럼 반짝이며 응결하는
보도블록 위의 작은 눈부신 점 하나
머리가 희끗한 두 시인이 붉으레한 얼굴로 앉아있는 테이블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시집에 친필을 받는 일은 존경의 마음이라기보다 수많은 시간과 고민의 결과물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라고 하겠다. 이시영의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와 문인수의 『적막 소리』는 그렇게 내게 왔고 오랜만에 가슴을 적셨다. 오규원은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두 시인은 자신의 시와 서로의 시를 낭송하며 독자들의 가슴을 적시고 또 적셨다.
이 메마른 시대에 무슨 시 따위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메마른 시대에 시가 아니면 무엇을 읽는단 말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아 끝까지 낭송을 꺼린 이시영의 ‘어머니 생각’은 문인수의 ‘하관’과 짝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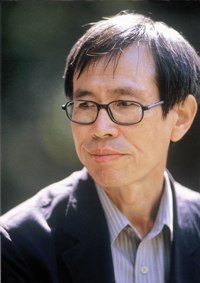 어머니 생각 - 이시영
어머니 생각 - 이시영
어머니 앓아누워 도로 아기 되셨을 때
우리 부부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문간방 안쪽 문고리에 어머니 손목 묶어두고 나갔네
우리 어머니 빈집에 갇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돌아와 문 앞에서 쓸어내렸던 수많은 가슴들이여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나 자장가 불러드리며 손목에 묶인 매듭 풀어드리면
장난감처럼 엎질러진 밥그릇이며 국그릇 앞에서
풀린 손 내밀며 방싯방싯 좋아하시던 어머니
하루종일 이 세상을 혼자 견딘 손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네
하관 - 문인수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창비 시선 340권과 341권으로 나란히 시집을 출간한 것도 두 시인에게는 억겁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고등학생 때 이미 전남일보로 등단하고 대학에 입학한 한 시인의 에피소드를 듣고 며칠 후 이성부 시인의 부음을 신문을 통해 듣는 우연처럼 두 시인의 시 낭송회가 기막힌 우연은 아니었을까.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야 비할 데 없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어느 문창과 여학생의 질문처럼 시인에게는 어떻게 시가 다가가는 걸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가.
저녁에 - 이시영
마른 나뭇잎 하나를 몸에서 내려놓고
이 가을 은행나무는 우주의 중심을 새로 잡느라고
아주 잠시 기우뚱거리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 현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의 결을 살려낼 줄 아는 이시영의 시와 소멸하는 것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길어올릴 줄 아는 문인수의 두 편의 시가 또 하나의 짝으로 읽힌다.
생(生) - 이시영
강한 거센 빗줄기 사이로 어떤 뼈아픈 후회가 달려오누나
그때 내가 그 앞에서 조금 더 겸허했더라면
 산 증거, 혼잣말 - 문인수
산 증거, 혼잣말 - 문인수
야, 딸아야, 일어나!
그 엄마는 오늘 아침에 또
스물두살 ‘아이’의 방을 바라 큰 소리를 질렀다.
……
풀썩, 그 엄마의 무릎을 꺾는
저, 죽음의 팔힘.
참, 너, 죽었지……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다가오는 모든 것이 전부 떠나가듯이. 이 순간, 이 하루가 송곳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생을 찌른다. 오늘 우리의 생은 어떠했던가. 무엇을 바라 그렇게 치열하게 내달렸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자각 후의 짧은 생.
최첨단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너무 빠른 속도로 뒤에 여백을 남기는 것은 아닐까. 슬픔도 기쁨도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스러져가는 까무룩한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죽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를 살아봐도 인생을 알 수 없고 더욱이 내일은 짐작조차 불가능하다. 늘어지게 잠이나 자야겠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최첨단
그래, 그것은 어느 순간 죽는 자의 몫이겠다.
그 누구도, 하느님도 따로 한 봉지 챙겨 온전히 갖지 못한 하루가 갔다.
꽃이 피거나 말거나, 시들거나 말거나 또 하루가 갔다.
한 삽 한 삽 퍼 던져 이제 막 무덤을 다 지은 흙처럼
새 길게 날아가 찍은 겨자씨만한 소실점, 서쪽을 찌르며 까무룩 묻혀버린 허공처럼
하루가 갔다. 그러고 보니 참 송곳 끝 같은 이 느낌, 또 어디 싹트는
미물 같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첨예하다.
120302-0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