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시작하는 다이어리에는 몇 개의 개인적인 목표가 적혀 있다. 아이를 재우고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싱숭생숭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무언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행한 것일 거다. 시간의 흐름의 인위적인 구획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나는 2016년에 이루고 싶은, 혹은 소망하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 것이다. 대학 새내기가 되었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은 해는 연도의 표지 만큼이나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 사이로 빠져나간 시간은 마치 무형질의 그것처럼 혼재되어 있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해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는 지를 기록하지 않는 한 그 해에 나를 스치고 혹은 뚫고 지나간 일들을 생생히 기억해 내기 힘들다.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추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삶을 온전히 복원해 내기는 힘들 것이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때로 나는 착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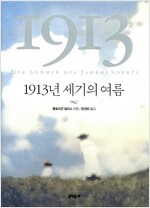
그럼에도 1913년, 대부분은 전운을 감지하지 못한 그 한 해에 역사, 예술사, 문화사에서 과연 어떤 족적을 얼마만한 깊이와 넓이로 남길 지 미처 모르는 루이 암스트롱, 피카소, 카프카, 스탈린, 히틀러, 토마스 만, 헤세, 릴케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들여다 보는 일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때로 같은 공간을 스쳐 지나간 시간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색다른 의미와 흥미를 지닌다. 한 세기가 훌쩍 흘러 우리는 고작 그들을 둘러싸고 흐른 1년을 월별로 스케치한 풍경을 볼 뿐인데도 개인적으로 카프카의 실패한 사랑의 흔적들을, 이십 대 중반의 좌절한 화가 히틀러가 어떻게 역사적 비극의 단초를 품게 되는 지를, 토마스 만이 이루어 낸 문학적 성과들에 어떤 희생이 따랐는 지를, 구도자적 모습이었던 릴케와 헤세가 실제 사생활에서 얼마나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랐는 지를 엿봄으로써 놓친 진실에 가 닿은 듯한 청량감을 느낀다. 미처 변명도 변호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펼쳐지는 그 무수한 일상들은 역사의 한 구절 대신 삶의 한 장을 이룬다는 동류 의식 때문이다. 이 유명 인사들이 시간 속에 남긴 족적들은 각각의 분야에서의 중량감으로만 측정될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살아냈던, 고뇌했던, 시간들을 채웠던 그 사소한 것들로부터 일종의 위안, 공감을 느낀다. 횡단을 가로지르는 절단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종단의 삶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1913년은 별 탈 없이 지나갔다. 죽지도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고, 상당히 내면적인 삶이었다."
-케테 콜비츠
p.352
어떤 한 해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늙어가는 한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생로병사'도 '별 탈'에 때로 들어가니 더욱 그러하다. 에른스트 융거는 소년 시절 아프리카를 꿈꾸다 정말 아프리카에 다다라 외인부대원이 되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며 1913년을 마감한다. 그랬다고 해서 그의 아프리카행이 무의미했을까. 모든 시도의 끝이 외형적으로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꿈과 선의와 연결되는 한 어떤 족적을 적어도 개인의 삶에서는 남긴다고 믿고 싶다. 그러니 무기력에 굴복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