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읽은 책도 어떤 것은 다시 읽어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가까이 있는 기억들은 썰물처럼 밀려 나가고 오히려 멀리 있었던 것들은 밀물처럼 밀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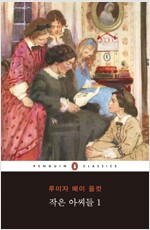

언제였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수도 있고 3학년 때였을 수도 있다. 계몽사에서 나온 파란 양장본의 <작은 아씨들>의 네 자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첫 장면을 만난 날. 나는 두고두고 이 네 자매의 이야기에 매혹되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이 첫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던 것 같다. 아름답고 현실적인 메그, 사내 같이 활달했던 조, 끝내 죽음을 맞아야 했던 착한 베스, 인형 같이 예쁜 인물값을 했던 막내 에이미. 그리고 이웃집 대저택의 멋진 훈남 소년 로리의 그 찬란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들은 내가 감히 꿈꾸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들과 정겨운 것들의 총집합 같이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우정 이상 사랑 이하의 감정을 나누었던 조와 로리가 끝내 부부가 되지 못했던 기억, 집을 떠나 전쟁터에 있었던 아버지의 귀환이 대미를 장식했던 후로 나는 두고두고 네 자매의 안부가 궁금했고 마침내 그때 다 듣지 못했던 그들의 후일담을 이제서야 듣게 됐다.
힘든 일들은 나의 것이기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고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세상에 대해 좀처럼 긍정적인 신뢰나 애정을 보낼 수 없는 참혹함을 느낀다. 편안한 일상은 너무나 허술하고 '존재'의 뿌리는 너무나 얕다. 생명은 단단하고 건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력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것이다. 그러니 삶이 때로 참 무섭고 처참하게 느껴졌다. 이럴진대 <작은 아씨들>의 이 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하나의 안식처로도 느껴졌고 그녀들의 삶의 자잘한 고충들과 굴곡들이 더없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도 했다. 그저 철없고 예쁘기만 한 소녀들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들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지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설명은 마냥 세상을 크고 단단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상상했던 시절 받아들였던 것과는 또다르게 다가왔다. 이제는 그네들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네 자매를 현명하게 양육하는 엄마 마치 여사의 교육관이나 태도가 더 전범으로 다가와 줄을 긋게 되는 엄마가 되었다.
"다들 어른이 되지 못하게 머리 위에다 큰 다리미를 이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조의 이야기는 '성장'이 담보하는 그 필연적인 고통과 상실에 대한 또다른 아쉬움과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절실하게 와닿았다. 베스가 죽음 앞에서 보이는 그 담대하고 의지어린 모습 또한 어렸던 내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목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마치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슬프기도 하지만 그 상실마저 가족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담담하게 소화해내려는 노력이 엿보여 뭉클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했다.
많은 순진한 믿음들과 확고부동했던 신념들은 시간의 풍화 속에서 닳고 이지러진다. 그럼에도 조가 남기는 이야기는 나의 마음 속에 반향이 크다. 그것은 걸핏하면 유년, 청년기의 그 순전했던 시선들로 도피하는 나에게 향한 것처럼 느껴져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테디, 우리는 이제 소년과 소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 행복했던 옛 시절은 돌아올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돼. 우리는 다 큰 성인들이잖아. 놀이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장난도 포기해야 해. 그 대신 각자에겐 진지하게 임해야 할 일이 있는 거지.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가슴 한켠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묻어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