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꾸준히 한 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보습학원에서 당시 영어입문자들에게 필수였던
동아컬러사전을 끼고 새로운 언어의 그 달콤하고 보드레한 어감이 좋아 신나게 시작했던 영어는
대학교 때 취업전장에 뛰어들기 위한 무장의 일환으로 변모했다.
무식하게 했다. 하루종일 영어 방송을 틀어놓고 생각도 영어로, 꿈도 영어로 꾸려고 애썼고 영어채팅도 해보려고 했다.
결과는 종이와 연필로 치르는 계량화된 시험 점수는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받았지만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만나게 되면 아주 과묵하고 이따금 던지는 어설픈 조크가 시덥잖은 반응을 얻어내는 바로 그 수준이상을 갈 수 없었다.
어설프고 나름대로의 치기를 덧씌워 나름대로 굴린 문장보다 콩글리쉬처럼 텁텁하게 내뱉는 단어만으로 더 무리없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정작 취업했을 때는 영어 무장을 완전 해제하고 오히려 다시 한글,숫자들과 씨름해야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 때 그 때의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영어에 퍼부은 그 수많은 시간들과 비용들이 고작 소피 킨셀러의 <쇼퍼홀릭>을 사전 좀 덜 찾고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길이었다는 깨달음이 남기는 그 불쾌하고 쓰디쓴 뒷맛이란. 결론은 주입식 교육 운운하는 그 진부함이 아니라
나의 영어 공부의 스타트가 지나치게 늦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만 열두 살의 겨울 새로운 언어를 모국어 위에
다시 프로그래밍하겠다는 그 옛날(지금은 많이 빨라졌으나)의 출발은 언어교육의 적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물론 그럼에도 네이티브 만큼은 아닐지라도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절친 한 명이 있긴 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보편적 범주가 아닌 예외적 특출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므로 계속 외국어 교육의 적기에 관한 나의 생각을
밀고 나가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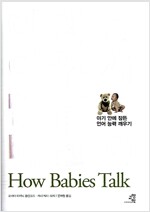
옹알이도 국적에 따라 다르다는 흥미로운 얘기부터 외국어 학습의 적기에 관한 논의까지 꼭 육아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이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신선하고 명쾌한 실례들로 가득한 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외국어 학습의 적기에 대한 얘기다. 우리는 바이 링구얼에 대해 흔히 그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습득 모두에 지연을 보인다는 사실을 많이 거론한다. 그것까지 아니라고 단정짓지는 못한다. 지인의 28개월 아이도 현재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 초기 지연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도 같다. 하지만 결국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게 된 사람들의 사고력과 추리력이 더 뛰어나단다.
이 책에 제시된 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산 햇수는 악센트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살기 시작한 나이가 네이티브와 얼마나 유사한 발음을 구사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3~7살에 영어에 노출되어야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외국어습득의 적기로 흔히 거론되었던 12살과 대단한 차이가 나는 연령이다. 물론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는 그 목표 지점에 대한 설정과 과연 외국어를 모국어마냥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과 맞부딪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싱가폴 영어, 인도 영어, 스페인 영어로 각자의 억양과 발음, 문화와 적절히 버무려진 특수한 내재화가 대세라는 의견도 있다. 꼭 정통 미국식 영국식 영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결국 소통이 목표라면 적당한 제스추어와 추측 등이 어우러져 공통의 이해의 지점에만 도달하면 된다.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영어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아무래도 적기에 투입된다면 더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효율성의 측면이다.
아이들은 희한하게 두 언어를 분리할 수 있고 언어의 문법의 내재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도 24~3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의 학습은 이 시기가 적기라는 얘기다. 한글도 모르는 아이한테 영어비디오를 틀어주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 시기에도 영어 교육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을 때 영어를 배우게 해 주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던 콩글리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엄마는 갑자기 숙연해진다. 사실 나름대로의 교육적 소신 때문이 아니라 귀찮고 게을러서였기 때문에 다시 내 아이에게 나의 그 지난한 외국어 공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게 하지나 않게 될런지 걱정이다.

 부지런한 엄마들의 얘기는 단순히 극성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것 이상의 가르침이 분명 있다.
부지런한 엄마들의 얘기는 단순히 극성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것 이상의 가르침이 분명 있다.
영어 그림책, 각종 영상자료들을 통한 홈스쿨링의 경로를 그려주는 그녀들을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나중에 나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비극을 피해갈 가능성이 는다.
그리고 자세의 문제다. 정말 아이에게 영혼의 자유와 여유로움을 선물하기 위해 조기교육을 염증스러워하는지 자신이 게으르고 쏟아낼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임)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발달장애인지는 모르고 돌 전부터 영어비디오를 틀어주었다며 슬픈 자책을 했던 엄마의 얘기. 다른 부모들은 다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겉옷도 없이 추운 실내 빙상장까지 들어와 연습하는 딸을 함께 떨면서 기다렸다는 엄마의 얘기. 극성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닌가 보다. 적절하고 진정한 극성은 아이에게 독이 되지 않는다. 극성엄마를 맹렬하게 비난해 댔던 내 자신이 실은 극성 엄마의 딸이 아니었던 열등감 때문이 아니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