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승을 보고 온 사람들
황화섭 지음 / 아침 / 2011년 6월
평점 :

품절


사후 세계가 궁금하지 않다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난 너무 궁금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죽으면 다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굳이 종교 분쟁을 불러 일으킬 생각은 없다. 진심으로 그냥 궁금할 뿐이다. 각자가 믿는 사후세계가 있겠지만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 더 죽게 되어서 사후 세계를 가게 되면 과연 현세에서의 일들은 다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생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이유는 각자 개인의 사연일 테지만 말이다) 저승에 가면 다 잊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 잊겠다고 죽었는데 잊혀지기는 커녕 모든 걸 다 기억하면서도 죽은 몸이라 더는 이도저도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 편해지겠다고, 다 잊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고통의 나날이란 생각이 든다.
이렇듯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 저승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만 막상 갔다 온(?) 사람은 드물고, 이마저도 증거가 없으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누구나 가지만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달 간격으로 태어나 이웃으로 살게된 옥명화와 오명화의 이야기가 처음이고, 설희, 송희 자매의 이야기, 그리고 강명식과 강용식 조손간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1부의 두 명화이야기는 확실히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그나마 제대로 된 이야기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오명화 대신 저승을 다녀온 옥명화가 오명화의 몸에 빙의되어 다른 사람의 앞길을 예견해 주면서 그로 인한 모든 수익은 전부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명화 장학회>를 통해서 쓰인다는 이야기다. 이름이 같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이웃에 살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 이것은 꼭 실화같기까지 하다.
하지만 다음 두편은 너무 싱겁게 끝난다. 동생 송희 대신 죽은 언니 설희가 저승을 경험하고 그냥 돌아 온다는 얘기이고, 설희가 이승으로 오는 동시에 송희가 저승으로 가는 배를 타고 온다는 그런 결말이다. 1부에 비해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더 큰 실망은 3부다. 두 조손간의 이야기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의 개연성도 없고, 스토리는 더 없고, 결말은 허무맹랑하고. 제목같은 내용을 기대했던 나에게 1부만이 괜찮았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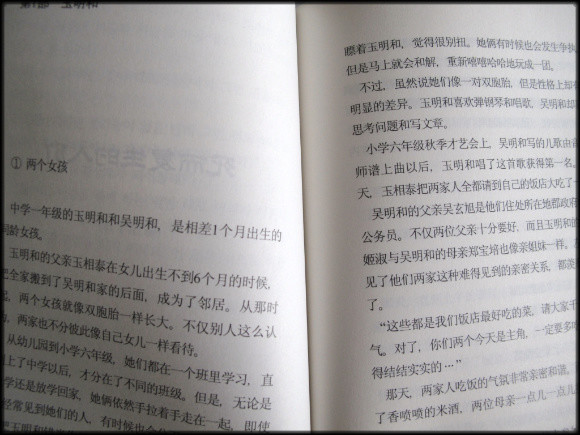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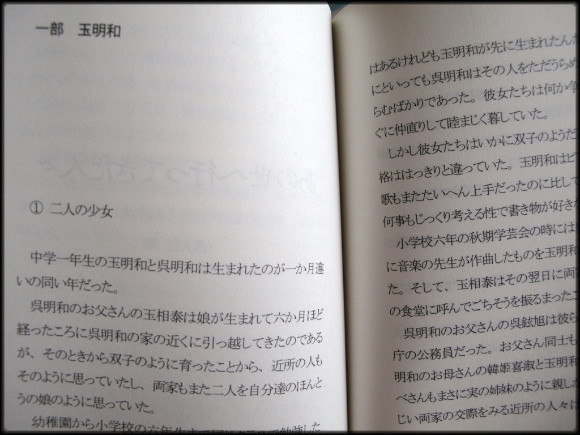
그럼에도 이 책이 특이한 점은 지극히 짧은 3편의 이야기가 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쓰여져서 한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제목에 완전히 낚였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소설이다.
애초에 저자가 의도했던 "사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는 취지는 어디론 갔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