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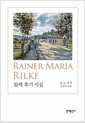
-
릴케 후기 시집 ㅣ 문예 세계 시 선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송영택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4월
평점 : 



토마스 만과 함께 독일 문학을 대표한다는 릴케, 그의 시집을 접하게 되었다. 솔직히 그토록 유명한 릴케의 시집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책 제목이 『릴케 후기 시집』이라 되어 있다. 그러니, 릴케의 작품시기를 둘로 딱 나눠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바로 그 후기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전기의 작품은 같은 출판사에서 2014년에 출간되었다).
처음 이 시집을 접할 때는 릴케의 유작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소개글에 ‘후기’라는 단어를 ‘말기’로 이해했다. 그랬기에 릴케의 마지막 시기의 작품들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릴케의 작품 가운데 중기 이후의 작품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시집에는 먼저, 릴케의 3기 시집(그의 작품세계를 4기로 나눴을 때) 『새 시집』의 작품들이 실려 있고, 그 다음으로는 < 새 시집 이후의 시 >로 여기에 실려 있는 시들은 릴케의 사망 후 발표된 작품들이다. 그러니, 릴케가 한참 활동할 때, 쓴 시들이지만, 사망 후 뒤늦게 발표된 작품들인 것이다.
그 다음 수록된 『두이노의 비가』, 『오르페우스에게 보내는 소네트』가 < 새 시집 이후의 시 >와 어쩌면 같은 시기의 작품들이고, 마지막 부분 < 후기의 시 >가 릴케 말년에 속하는 작품들이라 보면 되겠다.
과연 릴케의 시가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의 시를 접해본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건데, 외국 시인들의 시를 접하면 왠지 우리 시인들의 작품과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물론, 나의 메마른 감성 탓이겠지만, 우리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의 그런 감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독자인 나의 탓이겠다). 어쩌면 이것이 정서의 탓일까? 아니면 번역시의 한계일까? 아무튼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대가의 작품을 대하는 경외감을 잃지 않고 그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본다. 릴케의 시에 대해 평을 할 실력은 나에게 당연하게도(!) 없다. 그렇기에 시집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릴케 후기 시집』 안에 담겨진 그의 시들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물론 이러한 정리 역시 나의 견해일 뿐이다. 설령 그것이 시인의 의도와 상반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이미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나 독자의 손에 있음에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은 이미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하며).
아직 실행되지 못한 것 속을 헤치며 / 무겁고 묶인 것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고초는 / 백조가 땅 위를 걷는 어색한 걸음걸이와 흡사하다. // 그리고 죽는다는 것, / 우리가 매일 서 있는 발밑의 땅을 이제는 밟을 수 없다는 것, / 그것은 백조가 물에 들어갈 때의 그 불안감과 같다. // 그러나 물은 상냥하게 백조를 맞아들이고, / 백조의 가슴 밑으로 / 기쁘고도 덧없이 세찬 물결이 연달아 뒤로 밀려간다. / 그러나 백조는 더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 점점 의젓하고 왕자다운 기품을 지니고 / 유유히 물 위를 미끄러져간다.
< 백조 > 전문
시인에게 있어 죽음은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 마치 백조가 물에 들어갈 때에 품는 마음처럼. 그러나 물에 들어간 후의 백조는 기품 있다. 그리고 유유히, 의젓하며, 기품 있게, 그리고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 물 위(죽음의 두려움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미끄러져간다. 이것이 시인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시인은 바란다. 기품 있는 죽음의 순간을 맛보길 말이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길 소망해본다.
<백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의 경험>이란 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연기를 계속한다. 불안하게 간신히 익힌 대사를 되뇌면서. / 그리고 때때로 솟구치듯이 몸짓을 크게 하면서. / 그러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너의 존재가, / 우리들의 작품에서 밀려난 너의 존재가 //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리라. / 마치 저 진실의 인식이 내려앉을 때처럼. / 그런 사이에 우리는 갈채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 오로지 삶을 연기하는 것이다.
<죽음의 경험> 일부
비록 죽음이라는 떨쳐낼 수 없는 존재가 때때로 우릴 엄습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연기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린다.
그렇다면, 시인의 이런 고백, 죽음에 대한 견해는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오라, 마지막 고통이여,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 육체 조직 속의 엄청난 고통이여. / 정신 속에서 불탔듯이, 보라. 나는 지금 / 네 속에서 불타고 있다. 장작은 / 네가 불타오르는 불꽃에 동의하기를 오랫동안 거부하였다. / 그러나 나는 지금 너를 부양하고, 네 속에서 불타고 있다. (중략) 이 삶. 밖에 있는 것이 삶이다. / 나는 활활 타는 불꽃 속에 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오라, 마지막 고통이여> 일부
시인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다. 자신은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이런 죽음에의 수용은 그의 병든 육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수용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이 삶 밖에 있는 삶을 꿈꾼다. 이 밖에 있는 삶이 있다고. 그 삶으로 인해,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실 모호하다고. 물론 죽은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멀어짐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영원이 존재한다고.
이상한 일이다. 서로 관련되어 있던 모든 것이 풀려서 / 공간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 그리고 죽어 있다는 것은 고생스럽고, 보충해야 할 것이 넘칠 만큼 많은 것이다. / 그리하여 죽은 자는 차츰 약간의 영원을 느낀다. / 그러나 살아 있는 자는 모두 삶과 죽음을 너무나 단적으로 구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두이노의 비가』중 <첫 번째 비가> 일부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존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연기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자. 아울러 죽음 이면의 삶이 존재함과 영원의 실재를 믿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백조처럼 기품있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날 때는 모든 이의 웃음 속에 홀로 울고 나왔으니,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이의 울음 가운데 홀로 웃으며 갈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