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느끼고 아는 존재 -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고현석 옮김, 박문호 감수 / 흐름출판 / 2021년 8월
평점 :



통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저자는 탁월한 신경과학자이면서 철학과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관점이 굉장히 새롭고 독특하면서도 철학적이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딱 내취향의 책이기도 하다. 진화론은 더이상 그저 이론이 아닌 과학계의 정설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태초에 말씀 같은 것은 없었다고 단정하는 그러나 종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아예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주 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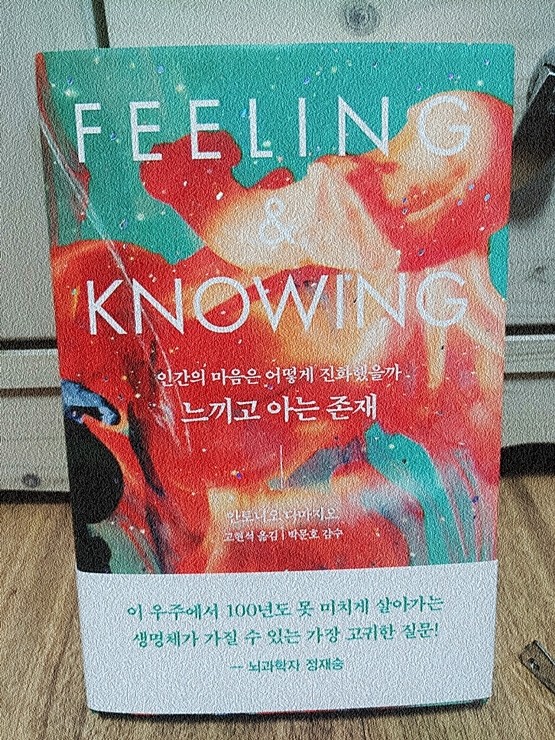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 라는 사유를 다루는 이 책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고통, 쾌락, 건강, 행복과 슬픔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다. 느끼면서 생각하며 생각하면서 느끼는 생명체인 우리는 그런 감각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다.
지능, 마음, 의식 이 세가지는 인간의 핵심이다. 크게 살아있는 유기체의 관점에서 생존과정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보는데 인간의 그런 지능은 명시적 지능과 비명시적 지능이 있다 .그 두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바이러스라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바이러스는 생명체 안으로 침투했을 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능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
존재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과 느낌과 앎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항상성은 유기체가 최적의 기능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리학적 범위 안에서 유기체를 유지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느낌인데 느낌은 상상과 표상, 간접경험 등으로 자아를 생성하는데 역할을 한다.

뇌의 크기가 커서 인간의 지능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뇌과학은 아주 낡은 것이다. 얼마전 읽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과 이 책의 관점은 매우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처럼 진화를 했는가하는 그 비밀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과학의 범위 안에서 매우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큰 몸집의 동물은 뇌도 크고 작은 동물은 뇌도 작다.
코끼리는 인간을 능가하는 거대한 뇌를 지니고 있지만 인간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인간의 이런 진화는 뇌가 발달하고 행동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필요에 의해 서서히 진화되어왔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행동들을 통제할 기관이 필요했고, 뇌가 발달을 했는데 뇌의 크기가 커진것이 아니라 재조직 되어 발달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직립 보행 및 손가락 발가락의 정교한 움직임 등을 통제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면서 감각적인 뇌가 필요하다.
움직임이 둔하고 한정되어있는 동물은 뇌도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고, 반대로 움직임이 세밀하나 동물은 뇌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의식과 느낌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느끼고 아는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느낌은 의식있는 마음의 생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지각활동을 하게 해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존재하고, 느끼고, 알게 되는 세 단계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적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진화적 산물이다.
인간은 끝없이 탐구를 한다. 다른 생명체는 그저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자손을 남기고 생존한다. 그러나 인간의 왜? 라는 의문은 끝없이 알고자 한다. 학문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근본적으로 그렇다.
마음의 기쁨과 고통은 그런 탐구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마음에 나도 모를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이 왜인지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다른 의문을 찾는다.
이렇듯 끊없이 탐구하는 것이 현재의 인간을 가능하게 됐다.
어찌보면 인간은 자신조차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인간의 근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누구는 종교를 믿고 누구는 과학을 탐구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결국 하나인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과학이고 신을 믿는 것은 좀 더 명확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다. 단순히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버리면 다 설명이 되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잡한 탐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신이 죽어버린 시대에도 종교는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몇 세기 전에 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담긴 기록들과 철학은 니체의 철학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 부터 과학은 이미 진화가 정설이고 그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그저 외면을 하거나 확증편향적 결과들을 조각내어 갖다 붙이고 합리화 하기에 급급하다. 뭐 그것조차 인간이기에 가능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을 믿는 동물은 없을테니까.
저자의 굉장한 지식에 감탄을 하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책이 독자들을 위해 쉽게 썼다는 것이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낡고 쉬운 전통적인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과학과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철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