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만루(二死滿壘)'의 문학과 '무타무주(無打無走)'의 문학
ㅡ 문학적 분류법에 관한 몇 개의 야구 이야기

▷ 사이토 지로(齋藤次郞), 『 아톰의 철학 』(손상익 옮김), 개마고원, 1996.
1) 11년 전의 이야기 한 자락: 1996년 여름, 나는 서울의 한 서점에서ㅡ아마도 강남역의 동화서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ㅡ당시 신간으로 출간되었던 사이토 지로(齋藤次郞)의 책 『아톰의 철학』을 찾고 있었다. 이 책은 데츠카 오사무(手塚治虫)의 생애와 그의 만화 세계를 다룬 책이었다. 다만 그때 나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책을 만화 코너에서만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다. 지금과 같은 우수한 성능의 검색용 컴퓨터를 서점에서 찾을 수 없었던 시기, 나는 나만의 '서툴고 원시적인' 검색 방법에만 의존하는 데에 스스로 조금씩 지쳐갔고, 결국에는 서적의 분류법에 있어서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전문가'인 서점 직원에게 책이 있는 장소를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내가 알아낸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이 '당당하게도' 철학 코너에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서광사와 민음사의 책들 가운데에, 문학과지성사와 창작과비평사의 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얄미운 곳에 그렇게 얄밉게 꽂혀 있었다는 것. 윤대녕의 소설집 『은어낚시통신』이 처음에는 레저 코너에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건 훨씬 더 나중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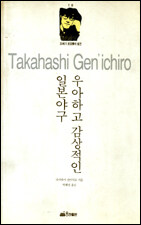
▷ 高橋原一郞, 『 優雅で感傷的な日本野球 』, 河出書房新社, 2006[新裝新版].
▷ 다카하시 겐이치로, 『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박혜성 옮김), 웅진출판, 1995.
2) 12년 전의 이야기 한 자락: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겠지만, 내가 『아톰의 철학』을 찾으면서 느꼈던 이 실소를 동반한 기묘한 감정을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原一郞) 또한 비슷하게, 하지만 나보다는 가볍게, 아마도 조소를 띠며, 어쩌면 약간은 자조 섞인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1988년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1995년에 처음 국역본이 나온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ㅡ얼마전에 새로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안다ㅡ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필자는 이 작품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시대의 정신 풍경을 그려보려고 했다. 그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도구를 필요로 한 것이다. 그 때문인지, 많은 책방에서 이 작품이 스포츠 코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 번 쓰인 작품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ㅡ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3쪽.
3)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 다카하시는 실로 많은 말들을 풀어놓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문학평론가는 물론이거니와 야구해설자조차도 실소하게끔 만들 귀찮고 성가신 '문학적' 아포리아가, 그것도 아무리 줄여봤자 최소한 세 개의 아포리아가, 너끈히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첫째, 여기에는 분류법의 문제가 있다. '아톰의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 코너로,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라고 하면 스포츠 코너로 분류되는 저 '웃지 못할 몰상식'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이 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 '당연하게' 보이는 비웃음의 근거를 그 자체로 고착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아마도 다카하시 또한 그럴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위'가 아니라 '현상'인 것. 그러므로, 비웃거나 탓하기보다는ㅡ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없을 것이다ㅡ마치 다카하시의 소설 속 주전 투수가 라이프니츠를 흉내 내는 것을 다시 한 번 흉내 내듯 "칸트 할아범"(『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59쪽)을 흉내 내면서, 우선 이 글은 이러한 비웃음의 담론 체계를 형성시켰던 가능 조건들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학이 한 "나라의", "한 시대의 정신풍경을" 그려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 오래된 사회적 반영론의 테제를 굳이 새삼스레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혹은 헤겔의 저 시대정신(Zeitgeist)을 어렵사리 기억해내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 자체로 역시 이미 '당연한' 명제일지 모른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순진한 의심을 품기도 했겠고, 또 누군가는 이에 대해 두 번 이상으로 중첩된 긍정과 부정의 회로를 거쳐 정당함과 부당함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 어디쯤에 이미 당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행히도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또한 '문학은 무엇을 그려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케케묵은 문학적 대상에 관한 물음을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과연 "한 번 쓰인 작품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의 국역본이 출간되었던 1995년이라면, 내 기억으로는 이 땅에 '저자(auteur)의 죽음'이라든가 '텍스트(texte)의 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인 성격' 등등의 이론들이 맹위를 떨치며 한 바탕 장안을 풍성하게 풍미하던 시기였다(나는 이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기보다는ㅡ'그렇다면 그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무슨 시기란 말인가'라는 물음은 차치하고라도ㅡ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적 이식문학론의 시기'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저 유명한 '이식문학'의 테제와 그 주창자 임화(林和)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단지 그대로 지나가버리기만 했던 유행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또한 작가와 작품 사이에서 벌어졌던 저 오래된 숙명적 역전과 재역전의 전적에 관해 재차 삼차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처럼 이 글은 적어도 저 세 가지의 골치 아픈 난제들 모두를 정확하고 적확하게 분석해가는 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 김윤식, 『 林和硏究 』, 문학사상사, 1989.
*) 개인적인 기준에서 김윤식 선생의 '최고작'을 꼽자면, 그것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도 아니고 『이광수와 그의 시대』도 아닌 바로 이 책, 『임화연구』이다. 나는 여전히, 비내리는 시나가와 역을 지나, 요코하마 부두에서 우산을 받고 서서, 내 자신조차 그 이름을 모르는 어떤 '누이'를 부르고 있는 기분이다.
4)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 '네 번째' 문제는 일견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ㅡ하지만 사실 언제나 나는 '개인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ㅡ어쩌면 문화 일반,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법 일반에 관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접속사에 관한 문제라는 외양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다카하시의 위 인용문 속에서 내가 시급하게ㅡ비록 12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시급하게ㅡ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따로 있는데, 그가 사용한 두 개의 '그 때문에'가 바로 그것. 첫 번째 '그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풍경"을 그리려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야구라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두 번째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앞의 세 가지 물음들 중 첫 번째 물음, 곧 '자연스러운' 분류법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미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야구'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라는 긴 어구를 이루고 있는 저 모든 수식어들이, 곧 성질(quality)과 양태(mode)와 국적(nationality)에 관한 저 모든 꾸밈말들이, '야구'라는 한 단어만을 집중적으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책이 스포츠 코너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는, 그런 일도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분류 체계의 성립과 인정과 수용에 관한 투덜거림의 외양을 취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이것이 일종의 '투덜거림'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번째 '그 때문에'는 다카하시의 서문 속에서 "그 때문인지"라고 하는 한 발짝 물러선 어법으로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분류법의 기원, 보다 정확히는 하나의 분류법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환경(milieu)'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우리의 중점은 분류 체계 일반의 구성 요소와 그 법적 정당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분류법을 두르고 있는 테두리가 만들어내는 여백, 어쩌면 이미 그 자체가 특정한 하나의 분류법을 미리 지시하고 구획하고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해야 할 바로 그 여백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여백' 또는 '바깥'은 문학이 품고 있을 저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의 비가시성(非可視性)과 비인과성(非因果性),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만드는, 그 원인 없는 시간에 원인을 부여하는, 가시성과 인과성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 박민규, 『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 한겨레신문사, 2003.
5) 2003년 혹은 1982년의 야구 이야기 한 자락: 이러한 '그 때문에'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시도하고 있는 또 다른 '야구 소설' 하나(하지만 이 두 소설을 '야구 소설'로 분류하고 명명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분류법일까). 분명히 1982년에 출간되었다면 당연하게도 야구 코너에 가장 먼저 가서 꽂혀 있었을 박민규의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화자는 야구 경기를 "인생의 축소판"(『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86쪽)으로 언급한다. 왜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인가? 어째서 80년대에 소년기를 보낸 화자의 시공간은 한 개의 야구장으로, 한 개의 야구공으로, 그렇게 '축소'되어만 가는가(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물어보아야 하는 물음 하나는, 이 2003년의 야구 이야기가 1982년의 야구 이야기의 압축된 '후일담 문학'은 아닐 것인가 하는 물음)? 소설의 화자는 청소년기의 어느 3루 끝자락에서 그만 덜컥, 그것도 야구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현실 인식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혹은, 그러한 현실 인식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여기서 독자는 왜 '마르크스'가 아니라 '주의'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야 했는지를 잠깐 동안이나마 음미해보아야 한다고, 나는 권고한다):
그날 밤 나는, 낡고 먼지 낀 내 방의 창문을 통해ㅡ저 캄캄한 어둠 속에 융기해 있는 새로운 세 개의 지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부유층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층들이었고, 각자가 묻힌 지층 속에서 오늘도 화석처럼 잠들어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보았다. 꽤 노력도 하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수치와 치욕을 겪으며 서민층에 묻혀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무진장, 혹은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면서도 그저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으며 중산층에 파묻혀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그리고 도무지 그 안부를 알 길이 없는ㅡ이 프로의 세계에서 방출되거나 철거되어ㅡ저 수십 km 아래의 현무암층이나 석회암층에 파묻혀 있을 수많은 얼굴들을, 나는 보았다.
ㅡ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129쪽.
6) 프로야구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계급의 구분은 정확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그 속에서 더욱 확연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소년의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다. 역설적으로, 하지만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소년의 삶에 강하고 독한 추동력을 부여한다. 여기까지는 저 유명한 근대화의 저돌적인 추동력에 관한 이야기와 정확히 짝을 이루는 어느(혹은 '여느') 소년의 흔하디 흔한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뒤도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메로스, 혹은, 소년이여, ['프로가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야망을 가져라 등등의 뒤틀린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소년에게 기이한 생존의 욕망과 기형적인 삶의 의지가 마치 일종의 약물처럼 투여되는 것이다.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만년 꼴찌 팀에로 오체투지 하듯 온몸을 감정이입 시켰던 이 소년에게는, 그러므로 야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야구의 확대판이자 실측지도였던 것. 삶이 야구 같은 것임을 깨닫고 삶을 야구처럼 살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살던 소년은 인생의 중간계투 시기에 일견 매우 맥 빠지는 결론에 도달한다:
세계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ㅡ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42쪽.
7) 기껏해야 이 가장 기초적인 근대 인식론의 명제 따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대의 원효(元曉)는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그렇게나 오래도록 퍼마셔야 했던가? 세계는 주체가 구성하는 한에서만 '세계'일 수 있다는, 이 근대 인식론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순진무구한 모토의 재탕 혹은 중탕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저 명제 자체의 진부함에 질려 등을 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년 스스로 구성한 세계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러한 구성 작용의 '대상'은 무엇인가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말하자면, 나는 이 성장소설의 '노에마'와 '노에시스'를 묻고 싶은 것이다). 일견 진부해 보이는 이러한 인식론이 장년이 된 소년의 비관적이고 진부했던 또 다른 인식론, 곧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야겠지만, 고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따름"(『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12쪽)이었던 과거의 인식론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기에. 또한 그것이 데카르트의 명제를 한 번 뒤집는 척만 한 후 다시금 칸트에게로 나아가버린 듯, 일견 맥이 풀려버린 인상을 주는 전회(轉回)이기에, 나는 더욱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대척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히려 가장 먼저 깨달았어야 했고 또 가장 먼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근대적인 너무나 근대적인' 인식론의 도식은 왜 이 소년에게 이리도 뒤늦게, 지각(遲刻/知覺)하여 도착했던가? 이러한 지각과 지연을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삶을 새롭게 분류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분류법, 그것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인생의 축소판이었던 야구에 관한 새로운 분류법의 탄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애당초 승부의 판가름이 무의미한 경기였다. 아니, 같은 룰이 적용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야구를 통해ㅡ두 팀은 격돌했던 것이다. 7회 초의 공격은 끝이 나지 않았다. 오른쪽 잡초 덤불 쪽으로 빠진ㅡ2루성 타구를 잡으러 간 <프로토스>는 공을 던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공을 찾다가 발견한 노란 들꽃이 너무 아름다워서였고, 또 모두가 그런 식이었다. 워낙 힘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괴소년은 그렇게 많은 포볼을 던지고도 도무지 지치지 않았고, 또 같은 이유로 아무도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 수비들은 계속 체력을 축적하고, 오히려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타자들이 지쳐만 가는 이상한 경기가 계속 이어졌다. 길고 긴 7회의 공격이 언제 끝날지가 요원했던ㅡ아직 원아웃인가 그랬고 스코어는 20:1인 상황에서, 결국 타임을 외친 올스타즈의 주장이 웃으며 걸어 나왔다.
"그만 하죠."
ㅡ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92쪽.
8) "노란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을 던지지 않는 야구와 "오히려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타자들이 지쳐만 가는" 야구는 이미 규칙과 분류의 체계를 서로 달리 하는 이질적인(hétérogène) 것일 수밖에 없다. 후자의 야구는 우리에게 익히 친숙한 '프로'의 야구이며, 전자의 야구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지 모른 또한 상상하자마자 머리를 흔들어 머리 밖으로 몰아냈을지도 모를 기이한 야구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열심히 할수록 쇠약해져만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 모를 괴물에게 살과 피를 빼앗기는 듯이 느껴지는 '프로'의 야구는 '이사만루(二死滿壘)'라는 절체절명의 상황과 규칙을 따르는 야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사만루의 절박하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하는 야구가 아닌, '프로'라고 하는 인간 이상(또는 이하)의 것을 강요하는 야구에 대항하여 자진해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는 야구, 나는 이러한 야구를, 하나의 대구(對句)를 이루기 위해, '무타무주(無打無走, no hit no run)'의 야구라 부르려고 한다.


▷ 우스타 교스케(うすた京介), 『 멋지다!! 마사루 3권 』, 대원씨아이, 1997, 111쪽.
*)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작전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만이 신나는 세상을 여는 열쇠다." 정말 그렇다. 공을 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달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마사루 일당은 정말 '치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는' 무타무주의 야구를 몸소 보여준다. 한국어판 전 7권, 일독과 재독을 강권한다. 또한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압권의 '번안'도 주요 관전 포인트.
9) 1988년, 또는 1995년, 혹은 어쩌면 어떤 먼 미래의 야구 이야기 한 자락: 야구가 사라진 시대에 출간되었더라면 서점의 야구 코너를 창시할 법한, 야구에 관한 도서 목록 작성의 초고가 되었을 법한 다카하시의 소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무타무주'의 야구라는 새로운 '분류법'의 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소설의 내러티브는, 사전 속의 야구에 관한 정의도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야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야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외형을 띤다:
야구[사어(死語)] ㅡ 아주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긴 것으로 둥근 것을 치는 게임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다. 지면에 네모난 것을 놓고 악귀를 쫓았다.
ㅡ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72쪽.


▷ Georges Bataille, Œuvres complètes. Tome I: premiers écrits 1922-1940,
Paris: Gallimard, 1970.
▷ 『 Review 』, 창간호(1994년 겨울호), 문예마당.
*) 바타이유는 초기에 『도퀴망(Documents)』 지를 통해 '건축(architecture)', '낙타(chameau)', '유물론(matérialisme)', '도살장(abattoir)' 등의 단어를 새롭게 정의내리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정의 내리기' 작업을 묶어 통칭 '비평적 사전(Dictionnaire critique)'이라 한다. 바타이유 전집 1권에 실려 있으며, 일독을 권한다. 예전에 발간되었던 잡지 『Review』에는 "X-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비슷한 형식의 '정의' 작업이 연재되었던 바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이다(창간호, 248쪽): "공윤 ㅡ 공연윤리위원회의 약칭. 영화를 비롯한 기타 대중문화 생산물들의 재미있고 자극적인 내용을 회원들끼리만 돌려보기 위해 만든 폐쇄적인 소규모 결사체. 이들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Gustave Flaubert, Le dictionnaire des idées reçues,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7.
▷ 귀스타브 플로베르, 『 통상 관념 사전 』(진인혜 옮김), 책세상, 2003.
*) 이러한 '새롭게, 뒤틀어서 정의 내리기'는 사실 플로베르 또한 이미 시도한 바 있었다. 플로베르의 '엄청난' 소설들을 읽는 일에 지쳐 있을 때, 혹은 그 어느 것에라도 지쳐 있을 때, 일독을 권한다.


▷ Gustave Flaubert, Bouvard et Pécuchet,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
▷ 귀스타브 플로베르, 『 부바르와 페퀴셰 』(진인혜 옮김), 책세상, 1995.
*) 앞의 책을 소개하고 보니, 역시나 이 책, 플로베르의 미완성 유작 『부바르와 페퀴셰』 또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책에 미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일독을 권한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국역본은 1995년에 나온 초판인데 현재는 절판되었고 얼마 전 책세상 세계문학 문고를 통해 두 권으로 분책되어 다시 나온 바 있다.
10) 나는 여기서, 어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몰지각하다고 생각했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분류법, 곧 11년 전의 저 '아톰의 철학'에 대한 분류법과 다시금 조우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는 의심해본다, 상상해본다, 생각해본다, 혹여, 『아톰의 철학』을 만화 코너가 아니라 철학 코너로 분류했던 것은, 어느 열성 삼미 슈퍼스타즈 팬클럽 회원의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작전이 아니었던가 하고, 아니면, 그때 내가 철학 코너라고 생각/착각했던 그 서가가 실은, 다카하시의 인물들이 때때로 야구에 대한 명언과 탁견과 열정이 담긴 책들을 꺼내보고 그 문구들을 공책에 옮겨 적곤 하던 야구 관련 코너의 서가가 아니었던가 하고. 또한 나는 여기서 푸코(Foucault)의 『말과 사물』을 '부팅'시켰던 저 유명한 보르헤스(Borges)의 중국식 동물 분류법과도 오랜만에 다시 조우하게 된다. 그래서 또 나는 의심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야겠지만, 실은, 이제껏, 이사만루의 잔인함과 숨막힘으로만 존재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혹은, 야구에는, 존재에는, 오로지 이사만루라는 분류법 외에 다른 분류법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존재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그리고 이어 나는, 어렴풋이, 알아챈다, 다카하시 소설 속의 등장인물 랜디 바스가 인류의 모든 책들을 야구에 관한 잠언과 해설로 인식하는 것처럼, 아톰과 철학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류 체계가 사실은 또 하나의 '야구 이야기'에 다름 아니었음을, 그것은 또한 삶의 축소판과 확대판을 아우르는 울타리와 여백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에 다름 아니었음을. 그리하여 다카하시가 새롭게 작성하는 실제 세계의 분류법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자, 야구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사람인 다카기 유타카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리얼 월드를 다음의 두 개로 분류하고 있다.
(1) 홈 베이스 위에 있는, 타자의 어깨로부터 무릎까지의 공간ㅡ즉, 스트라이크 존.
(2) 그 이외의 모든 것.
ㅡ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76쪽.


▷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66.
▷ 미셸 푸코, 『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대우학술총서), 1987.
*) 예전에 대우학술총서를 통해 출간되었던 이광래 선생의 국역복 『말과 사물』은 현재 그 '시대적 임무(초역과 소개)'를 마치고 '장렬히 전사(절판)'해 있는 상태. 능력과 열정 있는 역자(譯者/力者)가 어서 나타나 '이 시대에 맞는' 새 번역을 내주기를 고대한다.
11) 푸코가 잘 보여주었듯, 새로운 분류법으로 인해 탄생하는 것은 곧 새로운 인식론이며 새로운 담론의 체계이다. 그렇다면 이사만루와 무타무주 사이의 골이 가리키는 새로운 담론의 체계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기존했던 과거시제로서의 이사만루의 야구가 제한적인 경제가 지닌 협소한 윤리학적 체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도래할 미래시제로서의 무타무주의 야구는 이사만루의 야구가 '멸종'해버린 세상에서 만나게 될 하나의 새로운 삶의 미학 또는 미학적 윤리학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하나의 '허무맹랑한' 가설일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윤리와 존재의 '미학화'가 하나의 문학적 '유토피아(utopia)'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 해도, 이사만루의 야구가 사라진 무타무주의 야구 세상 속에서 다카하시의 소설이 짙은 '디스토피아(dystopia)'의 냄새를 풍기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러므로 이러한 물음은, 혹여, 무타무주라는 새로운 분류법의 문학적/스포츠적 체계가, 여전히 유토피아'주의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 담론 체계 안에, 그래서 결국 아직은 변증법적 이분법이라는 오래된 늪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묻는, 유독 우리 시대에 특히 더욱 진부해져버린 저 의심과 회의의 물음으로, 다시금 귀착된다. 다시금, 반복되는, 문학적 '아포리아'로서의 '유토피아'.
12) 물론 이사만루의 문학적(혹은 '시대적') 상황이 무타무주의 문학(어쩌면 '시대정신'?)으로써 타파되고 위반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일일 것이다(게다가 이러한 생각은 '위반'이라는 작용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몰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타무주의 문학이란 기존하는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당연하게도 어떤 '점수'도 낼 수 없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노히트노런은 언젠가 또 하나의 훌륭한 '상품'이 되고 '물신(Fetisch)'이 될지 모른다. 마치 우승 후에 연고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프로야구단처럼:
우승을 했으니까요. 그럼 서울로 가는 것이 이 세계의 룰입니다.
ㅡ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81쪽.
13) 그래서, 근대 문학이란, 곧 근대적 상황 속에서 잉태되었고 소비되고 있는 근대 소설이란, 본래부터 겉으로는 '무타무주'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무사득점(無死得點)'의 만루홈런 기회나 대량학살과도 같은 '삼중병살(三重倂殺)'의 기회만을 노리는 기민하고 약삭빠른 심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ㅡ실은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이ㅡ문학의 전장(戰場) 또한 결국은 피 튀기는 연장전에 돌입한 헤게모니 투쟁의 속편이었음을 씁쓸하게 반추하게 되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말했던바 사회적 실천을 떠맡은 중심적 예술 행위라는 의미에서의 근대 문학은 이미 종언을 고한 것으로 보인다(하기야 근대의 종언뿐만 아니라 문학의 종언을 발음하고 발언했던 이가 어디 이 '일본인' 비평가 하나뿐이었겠느냐마는). 위반하고는,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한계(limite)의 공간. 이 무한한 '영원회귀'의 운동 속에서ㅡ누구나 이 원환의 운동 속에서는, 소승적이 되기는 쉬워도 대승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일 터ㅡ누군가는 역사의 종언을 목격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복음의 창궐을 목도했을 것이다.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06.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 트랜스크리틱 』(송태욱 옮김), 한길사, 2005.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07.
*) '노동자는 또한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점... 사실 가라타니 자신은 표가 나게 언급하거나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최근 저작에서는 모스(Mauss)-바타이유(Bataille)-카이유와(Caillois)를 잇는 정치경제학적 계보의 수혜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가라타니 고진에 대한 다른 글을 따로 마련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다.
14) 9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을 체감한 푸념과 투덜거림이 내뱉었던 하나의 '문학적이고도 세속적인' 물음이 하나 있다: 왜 한국의 작가들은 더 이상 민족의 분단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더 이상 가장 '낮은' 곳으로도 임하려 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당신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여전히 얼마든지 많이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었)고, 또 누군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가 가져다준 영향이자 폐해라고 말할 것이(었)다. 혹은, 좀 더 에둘러 말하자면, '태백산맥' 사이로 외제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빛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지 않느냐고 안도하면서 말할 수도 있(었)고ㅡ이는 다시 말하자면, 조정래 식으로 삭히며 쌓아가던 것을 이제는 김영하 식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데ㅡ,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난장이가 쏘아 올렸다던 그 작은 공은 지금쯤 어느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되었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한 채로 반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 물음이 물음으로서 유효하다면, 그 유효성은 이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답을 내리려고 하는 결단의 조급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저 물음이 물음일 수 있는 가능 조건들을 탐색해야 한다는 생각 한 자락. 저 물음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물어져야 할 것은, 과연 '한국의' 작가란 도대체 누구인가, 작가라는 '직업' 앞에 '국적'을 표시하는 수식어가 첨가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시 그 국적의 '소유'를 표시하는 조사 "~의"가 흘레 붙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것인가 등등의 물음이다. 이 물음들은, 그러므로, 역사와 문학의 종언에 대한 물음들, 그리고 그러한 종언 이후에 비로소 겨우 다시 시작되는, '역사 없는' 시대의 문학에 대한 물음들일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이사만루'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둘'이라는 이분법이 죽고[二死] 그와는 다른 다종다양한 분류법들이 만개할 수 있는[滿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지극히 '은유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만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은 또한 '복음의 창궐'을 '복음'으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창궐'로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전제 조건의 한 형태일 것이다. 아마도 이 새로운 물음과 인식의 소재들은, 마치 민족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국경선들처럼 엄연히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확고한 분류법 그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일 것이고, 또한 하나의 물음이 또 다른 물음들을 촉발시키는 위반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래서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들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류법 하나쯤은 잉태시킬지 모르는 하나의 작은 반례(反例)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의 저 물음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사만루라는 절대적인 순간에 과연 무타무주는 '가능할' 것인가? 칠 수 있을까 칠 수 없을까 하는 선택적 물음에 직면하여 이 물음이 강요하는 대답을 찾는 것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숫제 이 물음의 틀과 영역을 바꿔버리는 일, 동문서답을 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되물어보는 일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어쩌면 이 역전된 물음이 우리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새삼스럽게 되물어야 할 오늘날 '우리' 문학의 물음일 것이며, 또한 이는 어쩌면 '한국의' [혹은 '일본의', '그 어딘가의'] 문학이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다시 되물어야 할 방치된 물음인지도 모른다. 치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치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 물음들.

▷ 박민규, 『 핑퐁 』, 창작과비평사, 2006.
*) 고백하자면, 나의 이 글은, 사실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다카하시 겐이치로와 박민규 사이의 어떤 접점에 대한 확장된 잡설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박민규의 최근작 『핑퐁』을 보고 나서, '표절'이나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박민규가 다카하시적인 세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혐의(?)를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 <슈퍼스타 감사용> vs <아는 여자>
'反-영웅', 혹은 '反-反-영웅', 마치 '포스트-'라는 접두어에 다시금 '포스트-'를 붙이듯이.
15) 이 시점에서 나는 두 개의 '야구 영화'를 떠올려본다(다시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이 두 영화를 '야구 영화'로 분류하는 분류법은 과연 정당할까).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에서 삼미 슈퍼스타즈의 '패전 처리 전문 투수' 감사용은 승리를 위해 공을 던진다. 거기에는 약자와 패자의 설움이 있고 패배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는 풀뿌리 같은 희망이 있지만, 반면 거기에는 '저들'ㅡ실제이든 가상이든ㅡ이 만들어 놓은 승리와 패배의 판 자체를 흐트러뜨리고 뒤집어버리려는 '문학적' 위반의 물음이 부재한다('영화' 속에서 '문학적' 위반의 어떤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은 정당한 분류법적 욕망의 발로일까, 하고 다시 한 번 자문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소설 속의 삼미 슈퍼스타즈와 영화 속의 삼미 슈퍼스타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갈라지고 있다). 반면 영화 <아는 여자>의 주인공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타자 쪽으로 신중하게 투구해도 모자랄 공을 엉뚱하게도 뒤로 돌아 경기장 바깥으로 길게 내던져버린다. 그 공은 야구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황당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멀리 멀리 날아간다, 달아난다, 뒤집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위반한다. 이제까지 '당연한 듯' 존재했던 경기의 규칙들은 바로 그 한 순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기이한 분류법의 일단이 반짝하며 출몰한다. 이 분류법은 투수가 마운드에 서서 상대편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면서도 몸소 노히트노런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신기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새롭게 열리게 되는 하나의 분류법이다. "기록의 경기"(『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50쪽)인 야구에서 아예 기존의 기록 체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또 다른 체계 하나가 찰나적으로 새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수비 실책도 아니고, 더구나 고의 사구는 더 더욱 아니므로(담장 밖으로 날려버린 그 공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투지의 데드볼', 말 그대로 '데드볼'?). 다카하시와 박민규의 인물들이 이 후자의 투수만을 진정한 '야구 선수'라 여길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못해 쑥스러울 정도로 새삼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저 확실성일 것인가 아니면 저 수치심일 것인가.


▷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trans. by G.E.M. Anscombe),
Oxford: Blackwell, 2001[5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 사족(蛇足) 한 자락: 새로운 규칙과 분류의 체계를 한 벌 짓는 일과, 규칙과 분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을 묻는 일은, 분명 서로 다르다.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해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매혹적인 샛길들을 지닌 무수한 물음들과 마주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의 일독을 권한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출간 50주년을 기념해 간행된 독영 대역판이며, 이영철 선생의 국역본도 또한 추천한다. 이 국역본은 최근에 책세상 출판사에서 비트겐슈타인 선집의 일환으로 다시 출간된 바 있다. 어쩌면 이 책을 하나의 '야구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은 '진짜' 야구를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니까.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1: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2: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3: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4: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5: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