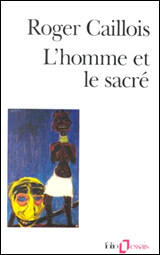
▷ Roger Caillois, L'homme et le sacré,
Paris: Gallimard(coll. "Folio essais"), 1988[1950¹].
1) 성(聖)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에 대한 고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분법'이란 뛰어넘거나 무화시킬 어떤 이론적 '정복'의 대상은 아니다. 곧, 칼로 자르듯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시킬 수 없는 이분법, 아니 어쩌면 너무도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려낼 수 있을 법한 이분법, 그래서 오히려 그 이분법 자체에 종말을 고할 수조차 없는 이분법, 경계선 위에서 스멀거리는, 극단적으로는 서로의 위치까지도 뒤바꿔버리는 역설(paradoxe)의 두 반쪽들이 그려내는 이분법... 그러므로 성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역설의 철학'을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철학(philosophie)인가? 바타이유(Bataille)와 데리다(Derrida)에 따르자면, 그렇다(그런데, 이들은 과연 '철학자'들인가?). 그리고 또한 그들에 따르면ㅡ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말하여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ㅡ철학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2) 성(聖)과 속(俗)은 각각 그 자체로서는 외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각기 상대편의 침범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곧 역설적으로, 성과 속이 상대편의 존재에 대한 상정과 그러한 상대편과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임을 말해준다. 반대편과의 대립을 통해서만, 즉 서로 간의 차이와 상대적 규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성과 속이, 또한 각각 반대편과의 접촉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종교의 모순적인 진리' 혹은 '성과 속의 역설적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카이유와(Caillois)가 말하는 것처럼, 성(聖)이란 "죽지 않고는 다가갈 수 없는 것(ce dont on n'approche pas sans mourir)"이다(p.25).
3) 성(聖)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양가성(ambiguïté)은 그것이 '더러움'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일견 표면적으로 성스러움과 더러움의 관계는 대립적인 이분법의 관계이다. 그러나 어떤 '고정적인' 상황을 떠났을 때 그 이분법은 모호한 형태로 유동한다. 성스러움을 파괴하는 불경한, 따라서 어떤 '더러운' 행위가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움으로 화(化)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유동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자면, 같은 종족을 살해한 자, 같은 종족의 여자를 취한 자, 같은 종족의 토템을 먹은 자는, 바로 그 '위반(transgression)'을 통해서, 더럽힘과 훼손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같은 종족 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직접 벌하려 하지 않는다. 감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곧, 그가 저지른 불경함과 그로 인해 그가 지니게 된 '더러움의 신성함'이 자신들에게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종의 경외감이 '반대편'에 위치한 권위를, 곧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성스러움을 형성한다. 이러한 성스러움의 역설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먼저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책들의 일독을 권한다. 모스의 대표적인 논문인 『증여론(Essai sur le don)』을 포함해서 그의 주요작들을 수록하고 있는 『사회학과 인류학(Sociologie et anthropologie)』을 가장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의 서두에는 학구열을 잔뜩 자극하는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의 서문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성스러움(sacré)과 희생제의(sacrifice)의 개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모스의 3권짜리 저작집, 특히 1권을 참조하기를 권한다(교환(échange)과 증여(don)의 개념에 관해서는 특히 3권의 일독을 권한다). 이 저작집은 모스의 사회학/인류학 체계 전반을 일별할 수 있는 훌륭한 편제가 특히나 매력적인 판본인데, 이 중 2권과 3권의 글들을 일부 발췌 수록하여 『사회학 시론집(Essais de sociologie)』이라는 제목의 문고판도 간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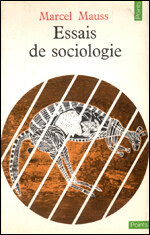
▷ Marcel Mauss,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aris: PUF(coll. "Quadrige"), 1999[1950¹].
▷ Marcel Mauss, Essais de sociologie,
Paris: Seuil(coll. "Points sciences humaines"), 1971.



▷ Marcel Mauss, Œuvres. Tome 1: les fonctions sociales du sacré,
Paris: Minuit(coll. "Le Sens commun"), 1968.
▷ Marcel Mauss, Œuvres. Tome 2: représentations collectives et diversité des
civilisations, Paris: Minuit(coll. "Le Sens commun"), 1974.
▷ Marcel Mauss, Œuvres. Tome 3: cohésion sociale et divisions de la sociologie,
Paris: Minuit(coll. "Le Sens commun"), 1969.
4) 균형적인 상호성과 질서의 세계가 우월성과 위계 또는 서열의 세계로 전이되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이는 물론 가장 '비역사적인' 역사적 추측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권력의 기원'이었을 것이다(이 역시 물론 가장 '비정치적인' 정치적 추측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그러한 상호적인 균형에 흠집을 내고 그것을 권력과 서열의 관계로 바꾸어 놓아야 했다(따라서 또한 이는 가장 '비역사적'이며 가장 '비정치적'인, 인류학적/종교학적 기원-목적론인 것). 말하자면, 누군가는, 위반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기원'이나 '태초'의 이미지로 윤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서나, 누군가는, 위반을 '해야만 했던' 것이 된다(따라서 이는 종교학적/인류학적 철학 혹은 인간학이 지닌 일종의 '프로토콜'이 된다). 전대미문의 전복, 오직 '전대미문'이라는 의미에서만 '기원적인', 과연 '전대미문'이나 '전무후무'라는 것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품는 한에서만 '원형적인', 그런 '최초의' 전복. 그러므로 모든 왕조의 시조, 곧 첫 번째 왕은 언제나 찬탈자이자 전복자였으며 위반하는 자이자 폭군이었던 것. 물론 여기서의 전복과 찬탈을 그 이전 '왕조'에 대한 것으로 즉물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차용증서도 없이 차용하자면, 일종의 '자연사(Naturgeschichte)'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 금기의 체계가 근본적인 동질성에 대한 금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근친상간은 쉽게 동성애의 상징이 된다. 호모(homo-)적인 것, 동질적인 것, 동류의 것은 곧,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생산/출산(reproduction)의 관점에서 근친상간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띠게 되는 것. 그것은 마치 동족을 먹는 행위(homophage)와도 같은 것이 된다. 자기 부족의 토템을 먹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상징적' 문맥에서 금지되는데, 섹스가 흔히 음식을 '먹는' 행위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카이유와가 말하고 있듯이, "음식물과 여자와 희생물들은 외부에서 찾아져야 한다(Aliments, femmes et victimes doivent être recherchés au-dehors)"는 것(p.110).
6) 카이유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p.76): "속(le profane)은 안락과 안전의 세계이다. 두 개의 소용돌이가 그 세계를 한계 짓는다. 안락과 안전이 더 이상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규칙에 대한 확고하고도 조심스러운 복종이 인간을 짓누를 때, 이 두 현기증(deux vertiges)이 인간을 끌어당긴다. 그리하여 그는, 규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벽(barrière)으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성스러운 것이란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에 오직 그것을 넘어서거나 깨뜨린 사람만이 이해하고 소유하게 될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얼마나 모스-바타이유적인 관점이란 말인가.
7) 상호성과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하는 두 부족 간의 질서와 금기의 체계는 위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곧 축제가 갖는 기능에 다름 아닌데, 금기(interdit)가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한 사회의 한계(limite)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과 속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기와 위반은 단순한 대립 관계나 상극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기의 질서가 주기적으로 위반의 작용과 행위를 '요청'한다고 하는 사실이 '조화'의 이데올로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반이 금기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바타이유적 주제를 떠올려 볼 때, 금기와 위반의 주제를 단순히 넓은 의미에서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이론으로 환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바타이유의 『저주의 몫(La part maudite)』을 어떤 잃어버린 '조화'와 '균형'에 대한 회복과 복권의 이론으로 읽는 것은 '저주의 몫'이라는 영역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저주의 몫』은 미뉘(Minuit) 출판사의 원판본과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의 전집판 7권, 이 두 판본을 추천한다. 미뉘 출판사의 판본은 『저주의 몫』의 모태가 되는 바타이유의 초기 글 「소비의 개념(La notion de dépense)」 또한 수록하고 있으며(이 글은 전집판에서는 1권에 수록되어 있다) 장 피엘(Jean Piel)이 서문을 달았다. 전집판 7권의 장점은 『저주의 몫』을 전후로 한 '일반경제' 관련 바타이유의 저작과 강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전집판의 7권과 8권은 바로 바타이유의 이른바 '저주의 몫' 3부작을 둘러싼 저작들에 할애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조한경의 바타이유 국역본들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번역들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다행히도' 현재는 대부분이 절판인데), 특히나 『에로티즘』의 국역본이 행한 거의 '폭행' 수준의 번역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


▷ Georges Bataille, La part maudite, Paris: Minuit(coll. "Critique"), 1967[1949¹].
▷ Georges Bataille, Œuvres complètes. Tome VII, Paris: Gallimard, 1976.
8) 파괴의 기쁨을 선사하는 축제는 구질서와 신질서 사이의 '간빙기', 시간이 정지해 버리는 시간을 구성한다. 카이유와가 말하듯, 축제에서는 "규칙들에 반(反)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반대로 실행되어야 한다(Tout doit être effectué à l'envers)"는 것(p.151). 또한 "이러한 신성모독들은 바로 그것들이 위반하고 있는 금지사항들 자체만큼이나 역시 의식적(rituels)이고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들은 금지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성(sacré)에 속한다"는 것(p.155). 이 역설의 철학, 역설의 인간학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카이유와의 문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일 터(p.183): "성(sacré)은 삶을 부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삶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이 흘러나오는 원천(source)이며 동시에 삶이 사라지는 하구(estuaire)이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