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환절기 감기가 ㅠ 어서 육신을 벗고 혼을 순수하게 하는 활동을..
파이돈
recollection argument(72e~7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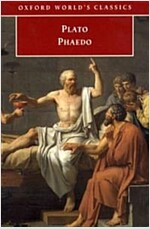


1. 상기 논증의 도입(72e~73a)
케베스는 소크라테스가 자주 말해왔던 배움(learning/Lernen/instruction)이란 상기함(recollection/Wiedererinnerung/ressouvenir)이라는 주장을 환기시킨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상기하게 되는 것들을 이전에 어느 때인가 우리가 배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만일 우리의 혼이 지금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어딘가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혼은 죽지 않는 어떤 것이다. 케베스가 설명하길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만약 누군가가 훌륭하게 질문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진실 그대로 스스로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람들에게 앎(knowledge/Erkenntnis/science)과 바른 추론 능력(correct account/richtige Einsicht/jugement droit)이 이들 안에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기의 과정은, 누군가가 그들을 도형이나 그런 유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인도할 때 명확하게 증명된다.1)
2. 소크라테스의 상기 논증 개시(73c1~74a8)
케베스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시미아스는 배움이 왜 상기인지 의아스러워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논증을 시작한다.
2-1. 상기의 일반적 조건 제시(73c1~74a7)
명제 : 만일 y에 의해 x를 상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우리는 x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한다(73c1~c3). 2) 우리는 감각적 지각(sense-perception/wahrnehmen/sensation)을 통해 y를 알아볼(recognize/erkennt/connaître) 뿐만 아니라 또한 x에 대해 생각하게(think of/vorstellt/a l'idée de) 된다(73c6~c8).2)3) x는 y와 같은 앎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앎의 대상이다(73c8~c9). 4) x가 y를 닮았을 때, 우리는 x에 대해 y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다(74a5~a7).
2-2. 상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예시(73d~73e) : 1) 리라를 보고 리라의 임자인 소년의 모습(form/Bild/image)을 떠올리는 경우 2) 누군가가 시미아스를 보고 케베스를 상기하는 경우 3) 그린 말들이나 그린 리라를 본 이가 어떤 사람을 상기하는 경우 4) 그린 시미아스를 본 이가 케베스를 상기할 경우 5) 그린 시미아스를 본 이가 시미아스 자신을 상기하게 될 경우
☞ 요컨대, 상기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알게 되는 개별자를 혼이 이전에 인식하고 기억하는 보편자인 형상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2-1에서 4)의 조건, 즉 닮음에 의해 상기를 할 때, 상기함의 실마리가 된 것이 그 유사성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필연적인가? 가령 사람들이 그림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미지인 탓으로 그림의 원본이 되는 것이 갖는 특성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초상화를 보고서 그것이 어떤 인물보다 부족하다고 늘 말하는가? 그것은 매번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연시되고 무시되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2-2의 사례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기되는 것이 같은 앎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앎의 대상이라고 하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리라에 대한 앎과 사람에 대한 앎이 다르다는 것은 리라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시미아스와 케베스의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없다. 케베스나 시미아스나 수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종적 개념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라를 보고 그 주인을 상기하는 경우 양자는 원본과 복사본을 따질 필요가 없이 동등한 존재의 질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을 보고 그림에 그려진 원래의 대상을 상기하는 경우는 양자가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인 경우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 중 형상과 감각적 개별자의 구분에 가장 적합한 것은 시미아스와 그림 시미아스의 경우일 것이다. 위 논변의 요점은 우리가 그림 시미아스를 시미아스와 연관시키는 것은, 시미아스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기함은 닮은 것들로 또는 닮지 않은 것들로 해서도 성립하는 것이지만(74a2~a3), 닮은 것으로부터의 상기와 닮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상기는 대칭적이지 않다. 그림을 보고 시미아스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림이 시미아스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리라를 보고 그 주인을 떠올리는 사람이 리라와 그 주인이 닮지 않아서 상기하는 것이 아니다(Gallop, 118).
3. 같음 자체의 도입과 본격적인 상기 논증
3-1. 우리는 같음 자체가 무엇인지 안다(74a9~d3).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1) 우리는 같은 무엇인가, 같음 자체(the equal itself/das Gleiche selbst/l'Égal en soi-même)가 있다고 본다(74a9~b1). (2)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도(what it is/was es ist/que c'est quelque chose) 알고 있다(74b2~3). (3)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같은 사물들, 예컨대 나무토막이나 돌들 같은 사물을 보고서 이것들과는 다른 같음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74b4~b6). (4) 같은 나무토막들이나 돌들은 똑같은 것들이면서도, 때로 어떤 이에게는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같은 것들 자체(the equal themselves/die gleichen Dinge selbst/L'Égal en soi)는 때로는 같지 않은 것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같음(equality/Gleichheit/lÉgalité)이 같지 않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같음 자체와 같은 것들은 다르다(74b7~c6). (5) 이들 같은 것들은 같음 자체와는 다른 것들인데도, 어쨌든 이것들로 해서 같음 자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얻는다(74c6~c10). 같음 자체는 같은 것들을 닮은 것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다. (6) 어떤 것을 보고서, 이 봄으로 인해 다른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되는 한, 그것이 닮은 것이건 닮지 않은 것이건 간에, 이게 상기함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74c13~d3).
☞ 소크라테스는 같음 자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음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지닌 상태에서 그것을 준거로 대상들의 같음을 판단한다고 본다. 이때 같은 사물들과 같음, 같음 자체가 구별된다. 같음 자체는 기준이고 같은 것들은 이 기준을 통해 평가된다. 그런데 같음은 두 개 이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쓰는 술어, 관계 개념이다. 그렇다면 같음 자체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역설적으로 같음 자체는 결국 감각적 사례들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음의 형상은 비관계적인 속성(non-relational attribut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Gallop, 128), ‘같음 자체는 항상 같다’는 문장은 자기-지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3)같지 않음 자체(Inequality itself), 부정의 자체, 나쁨 자체라는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형상이 범형(paradigm)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부된다(Gallop, 125).
『파이돈』에서 처음으로 형상 이론이 도입되는 위 대목과 이후의 논변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같음 자체를 단순히 같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같음과는 구별되는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같음의 개념은 인식 능력의 일부라기보다는 인식 능력과 별개로 어디엔가, 예컨대 저승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야만 혼이 생시 이전에 이 앎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음은 우리의 개념적 사유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같음 덕분에 우리가 개념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상들은 개별자들과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하는 초월적인 것이고, 좋음 자체와 같은 형상은 추상으로부터 나온 단순한 논리적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객관적 실재이다(Bluck, 175).
명제 (3), (4)로부터 (5)가 추론되는데, 이에 따르면 상기는 일종의 매개적 인식이다. 그러나 (6)의 주장처럼 x를 보고 y를 떠올리는 것이 상기가 되기 위해서는, y가 x를 봄과 동시에 상상된 어떤 것이나 인식 능력에 의해 고안된 허구가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Gallop, 126). y에 대한 생각이 상기이기 위해서는 y가 기억 속에 있다가 망각된 것이어야 하며(그러나 이것은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비록 소크라테스는 양자가 닮거나 닮지 않거나 상관없다고 하지만, y와 상기의 실마리가 된 x 사이에 단순히 자의적인 연상 작용을 넘어선 긴밀한 관계(예컨대 닮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3-2. 우리는 형상에 대해서 개별자들이 갖는 부족함을 안다(74d4~75a4).
(7) 같은 것들(나무, 돌)은 같음과 같은 그런 것이 되기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74d4~d8). (8) 주위의 같은 사물을 보면서 이들이 같음 자체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것이 닮기는 했으나 훨씬 모자란다고 그가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을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임이 필연적이다(74d5~e5). (9) 우리는 실제로 주변의 같은 것들을 보면서 같음 자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74e6~e8). (10) 우리는 같은 것들이 같음과 같은 것이 되려고 하지만 훨씬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같음(the equal/das Gleiche/l'Égal)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필연적이다(74e9~75a4).
☞ 우선 (7)에서 같음 자체에 비해 같은 것들이 못 미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a) 어느 사람에게는 같게 보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b) 어느 때에는 같아 보이나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c) 어떤 것과는 같으나 다른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로 보더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같음은 완전한 형상으로서 같음 자체에는 못 미친다는 뜻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판단의 배후에 형상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즉 같음, 정의, 아름다움 등의 개념을 감각적 지각 자체에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 서술할 때 그러한 형상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잣대로 사용한다. 상기 논변의 주안점은 사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일정한 보편적 앎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은 나중에 다시 문제로 등장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상기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일상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8)은 이후의 논증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도입되는데, 과연 이것이 필연적인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감각적 지각의 사물들이 갖는 속성이나 관계의 성격이 지닌 불완전성이 인지되기 위해서는 꼭 같음 자체라는 형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제 판단이 언제나 완전함의 형상을 구비한 후에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비감각적인 형상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서로 다른 여러 시점이나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들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같음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Gallop, 127)은 불가능할까? 또한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이 판단에 있어서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떤 사물의 같음이 불완전하다는 판단 ‘이전부터’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만약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즉 우리의 감각을 하기 이전에 형상을 이미 알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개별자들을 형상들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75a4~75c6).
(11) 우리가 같음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물을 보거나 느끼거나 다른 감각적 지각으로 인해서이다(75a5~a10). (12) 모든 감각 대상이 같음 자체에 이르고자 하지만 그것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감각함(sense-perception/Wahrnehmung/sensation)으로 인해서이다(75a10~b3). (1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접한 같은 것들을 같음 자체와 관련지을(refer/beziehen/rapporter) 수 있으려면, 감각적 지각을 할 수 있기 이전에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75b4~b9). (14) 우리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as soon as we were born/gleich von unserer Geburt/dès notre naissance), 즉 태어난 뒤에 감각적 지각을 하게 된다(75b10~b12). (15) 그러므로 우리가 같음에 대한 앎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음이 필연적이다(75c1~c6).
☞ 실제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어떠한 두 사물도 같음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같음의 기준이나 개념,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각적 지각은 같음 자체를 생각하도록 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준다.5)이때 (13)은 상기 논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텐데, “감각적 지각 이전”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논쟁거리이다. 감각 이전의 시점은 혼이 감각 지각 활동을 하기 이전일 수도 있고, 더 이전에 혼이 육체와 결합하기 이전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같음의 개념은 선험적인 것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초월적인 것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후와 감각활동 이전의 짧은 순간에 같음의 개념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이렇게 본다면, 같음의 형상은 생시 이전에 존재함으로서 상기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선험적 형식으로서 범주 개념 같은 것이 될 것이다.
3-4.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형상들에 대한 앎을 망각하며 상기에 의해 형상에 대한 앎을 재획득한다(75c7~76d6).
(16) 만일 우리가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75c7~e1). 즉 만약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앎을 갖게 되어 이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면, 같음이나 더 큼과 더 작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 등 ‘~인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 앎들을 갖게 되고서는 그때마다 잊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 일생을 통해 늘 알고 있을 것이 필연적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앎을 갖게 되고서는 이를 잃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앎의 잃어버림은 망각이다. (17) 만일 우리가 같음에 대한 앎을 망각했다면, 같음을 인식하기 위해 상기가 필요하다(75e2~e8).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갖게 되었다가 태어나면서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이것들과 관련하여 감각적 지각들을 이용함으로써 언젠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앎들을 도로 갖게 된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 일컫는 것은 자신의 것인 앎을 되찾아 갖는 것(regaining/Wiederaufnehmen/ressaisir), 즉 상기이다. (18) 따라서 우리 인간 모두가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지니고 태어나 일생을 통해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상기에 의해서 그 앎을 획득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76a1~a8). (19) 모든 사람이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76b1~c2).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give an account/Rechenschaft geben/rendre compte). 그러나 모두가 같음 자체 등등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 이때 우리의 혼이 형상에 대한 앎을 획득하는 시점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난 뒤는 아니다(76c6~c7). 혼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에 앞서, 몸들과 떨어져 그 이전에 있었으며 지혜(wisdom/Einsicht/pensée)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21) 소크라테스는 그 앎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므로, 그 앎을 갖게 되는 순간에 잃어버린다고 한다(76d1~d4). (22) 결론 : 우리는 같음 자체를 상기한다(76c3~c4).
☞ (16)에서 같음의 형상과 더불어 언급되는 더 큼(the larger)과 더 작음(the smaller)이라는 형상(75c10)은 문제적이다. ‘더’라는 비교급은 크기의 형상 규정을 느슨하게 만드는데(Hackforth, 71), 더군다나 우리는 같음 자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큰 것’과 큰 것들을 비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16)의 주장에서, 같음 개념에 대한 인식은 무의식 상태에서 잠재되어 있는 경우와 어떤 계기로 인해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로 더 분석될 수 있을 것 같다6).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앎을 잃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알고 있다는 것의 규정이라기보다는 다만 망각하지 않음이라는 소극적 규정으로 보인다. 상기되는 앎과 망각된 앎이라는 양자택일 밖에 없다면, 무지(ignorance)의 상태를 제대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Burger, 79). 즉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완전히 망각해서 상기해야만 경우와 그것이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그 앎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망각이 아니라 추론으로 극복되어야 할 무지라면, 생시 이전의 앎에 대한 상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라면 우리가 형상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소크라테스는 앎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16), 앎을 망각했다면 상기가 필요하다(17)고 주장하면서 배중률(Law of Excluded Middle)을 적용한다(Gallop, 132). 그런데 시미아스는 태어남과 동시에(at the very moment of birth/bei der Geburt/à l'heure de la naissance) 형상에 대한 앎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76c14~c15). 소크라테스는 과연 태어날 때가 아니라면 언제 형상에 대한 앎을 ‘잃어버리게’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가능성을 물리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일컬어 그가 태어날 때 시각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애초에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잃는다는 표현은 무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가 시각을 갖게 되더라도, 시각을 다시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소크라테스가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그 앎을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며, 혼이 생시 이전에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미아스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다(Gallop, 134).
위 대목에서 또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19)의 ‘모든 사람이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이 (2)에서 ‘우리는 같음 자체를 알고 있다’는 언명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음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쓸 줄 안다는 말인지 아니면 같음의 철학적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근거를 대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박한 앎이 아닌 철학적 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2)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같음을 수학적인 것으로 보고, (19)에서 모두가 알지는 못하는 형상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양자의 비일관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Hackforth, 76). 그러나 위의 언급 속에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수학적인 형상과 도덕적인 형상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2)에서 ‘우리’를 철학자로 보고, (19)에서의 ‘우리’를 일반 그리스인들로 보면 위 명제들을 조화시킬 수 있겠지만(Gallop, 120) 이 제안 역시 문제가 있다. (2)의 논의는 상기 논증의 범위를 처음부터 철학자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시키게 되지만, 이어지는 표현에 따르면 상기는 형상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역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76c4). 이렇게 되면 애초에 전제로 도입하는 명제가 이미 도출하려는 결론을 선취하는 모양이 되고 마는 것 같다. 아마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에서의 모두가 아는 형상을 직관적인 형상 인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19)에서 모두가 알지는 못하는 형상을 추론적이고 논증적인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 대목에서 시미아스는 내일이 되어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면 적절한 설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76b).
4. 논증의 요약 및 결론(76d6~77d5)
4-1. 논증의 요약과 형상과 혼의 관계 :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 이와 같은 모든 존재(Being/Wesen/réalité)가 있고, 즉 형상이 이미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 또한 있으며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을 것이 필연적이다. 형상들도 있고 혼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것이, 그리고 형상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혼들 또한 있지 않다는 것이 필연적이다(76d5~e8). 형상과 혼 사이에는 놀랍도록 똑같은 필연성이 있고, 결국 논의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혼과 존재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으로 귀착한다. 아름다움과 좋음 등의 것들은 모두 최대한의 의미에서(in the fullest possible way/in dem allerhöchsten Sinne/a la plus haute réalité possible) 있다(77a1~a5).
☞ 소크라테스는 형상들의 존재와 혼의 태어나기 전에 있었음이 똑같이 필연적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는 형상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상기 논변은 혼의 불멸성을 전제해야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즉 만약 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안의 초감각적인 형상을 정립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알려질 수 없기 까닭에 불합리한 것이며, 또 만약 형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혼이 태어나기 이전에 혼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Bluck, 64). 그러나 혼과 형상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혼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육신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과 형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4-2. circular argument와 recollection argument의 결합 : 시미아스와 케베스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혼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납득하겠지만, 죽은 뒤에도 혼이 여전히 있을 것인지는 아직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77a8~b2). 즉 혼이 사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7c1~c5). 이에 소크라테스는 윤회 논증과 상기 논증을 합친다면 이미 혼의 불멸성은 증명되었다고 대답한다. 즉 만약에 혼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 속으로 들어와 태어나는 것이 죽음과 죽어있는 상태 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태어나는 것이 아님이 필연적이라면, 혼은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혼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77d1~d4).
☞ 앞에서 언급된 것에 따르면, 순환 논변이 육화되지 않은 혼의 존재 여부만을 다룬다면, 상기 논변은 혼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70b3~4)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미아스와 케베스의 요구는 단지 사후에도 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모든 산 것은 죽은 것으로부터 왔음을 주장하는 순환 논변이 “태어남 이전의 시간은 죽음 이후의 시간(the time before birth is the time after death)”임을 보장하기 때문에(Hackforth, 80), 태어나기 이전에 혼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상기 논변과 순환 논변이 결합되면 혼의 사후 존재도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ackforth의 말은 다소 궤변처럼 들린다. 순환 논변은 죽음->삶->죽음의 순환을 보여주고, 상기 논변은 생시 이전에 형상을 인식하는 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자의 결합에서 혼의 사후 불멸이 증명되려면 우선 두 논변의 가설이 옳아야 한다. 특히 상기 논변에서 문제되는 혼은 혼 일체가 아니라 어떤 형상에 대한 앎을 간직하는 개별적인 혼이기 때문에, 특정한 혼이 육신에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어떤 앎을 간직한 채로 살아남으리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Gallop, 136).
참고문헌
플라톤,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03. Plato, Phaedo, translated with notes by David Gallop, Oxford : Clarendon Press, 1988.
Plato, Plato's Phaedo, a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appendices by R. S. Bluck, London : Routledge, 2001.
Plato, Plato's Phaedo,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R. Hackforth,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laton, Phaidon(Werke in acht Bänden : Bd. 3.), hrsg. von Gunther Eigler,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0.
Platon, Phédon(Oeuvres complètes : Tome Ⅳ-première partie.),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Paul Vicaire, Paris :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83.
Ronna Burger, The Phaedo : a Platonic labyrinth,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84.
1) 이는 특히 Meno에서의 상기에 관한 논의(81c~86c)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Phaedo에서 상기는 Meno에서처럼 기하학적 명제의 증명을 다루지 않으며, 감성적 인식의 획득을 논의한다는 차이를 가진다(Gallop, 115). 우리의 배움이란 상기라는 주장은 일견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배움이란 사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Gallop, 113).
2) 이 대목에서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알아본다recognize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안다는 의미로 쓰였다. 반면 안다는 것know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상들에 대한 앎을 가리킬 때로 구별된다.
3) 플라톤이 형상을 가리킬 때 쓰는 어법은 당시 희랍어에서 질(quality)과 실체(substance)가 명확하게 분화하지 않은 탓으로, 우리가 흔히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같음이라는 말은 오늘날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플라톤의 형상은 그 자체로 실재성을 지니는 것이다. 형상이 갖는 보편자로서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같음 자체라는 형상은 일종의 추상화(abstraction)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플라톤의 요점은 형상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Bluck(63~4) 참조.
4) 그러나 상기가, 특히 메논에서 그랬던 것처럼, 추론과 논증을 통한 인식에 관한 이론인지, 직관적인 형상 인식에 대한 이론인지는 상기 논변 전체를 두고 평가해보아야 할 점으로 남는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상기 논변 내내 반복하는 ‘같음’이라는 형상에 대한 언급은 인식의 기초적인 모델로 수학을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참조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5) 형상에 대한 앎이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온다는 말도 따져볼 만하다. 그는 여러 차례 감각이 주는 부정확성에 대해 비판하지만, 이러한 감각적 지각이 없다면, 상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감각에 의거한 탐구는 나중에 형상에 대한 추구에서 방해물이 될 뿐인 것으로 로고스에 의거한 탐구와 구별된다(99d4~e6). 한편 칸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감각적 지각과 선험적 인식의 관계에서 플라톤의 상기설을 연상시킨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시간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식도 경험에 선행하는 것은 없고, 경험과 함께 모든 인식은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I. Kan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pp. 214~5(B1).
6) 다른 맥락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앎의 소유와 사용을 구분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외 옮김, 이제이북스, 2006, p. 241(1146b3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