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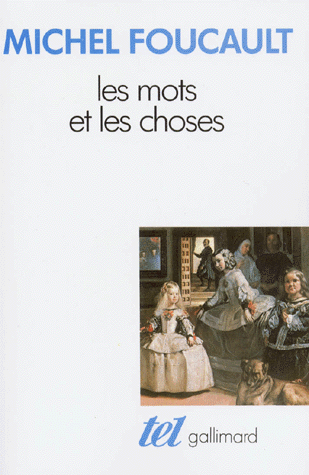
알라딘에서 검색하면 한글로 번역된 푸코의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이광래의 <말과 사물>이다. 수업 때문에 한참 전에 절판된 이 책을 보는데 정말 뭐랄까. 평소에 아무리 발 번역이라도 한글 번역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아무리 해도 낯설은 외국말의 한계, 시간절약 등등),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번역본은 정말.. 과연 어디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를 지경이다. 일단 오타가 너무 많다. 심지어 약력에도 철학박사가 천학박사로 표기되는 해프닝이.. 첫장을 펴면 보르헤스Borges가 보르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 감성학이 미학으로, 경험의 보편 타당한valable 조건이 유용한 조건으로 번역되면서 칸트가 공리주의자로 둔갑하는 등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아래는 원본과 영역본을 대조해서 고쳐본 9장의 요약.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오역이 많을 것 같다;;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푸코 전공자나 기타 유능한 분들이 모여서 언젠가 번역에 한번 나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신간이 나왔다.

『말과 사물』 9장 인간과 그 분신
1. 언어로의 회귀
문학의 출현, 주해로의 회귀, 형식화에 대한 관심souci, 문헌학의 구성 등, 언어가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새로이 출현함에 따라 고전주의적 사유의 질서는 소멸된다. 연속된 표상/재현들을 분석하여 그것의 운동을 포착하고, 분산시켜 영속적인 표에 재배치하는 그물망의 체계, 말mot과 담론discours, 특성과 분류, 등가성과 교환 등으로 구성된 전체계상의 구분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무너져 가는 최후의 요새는 이 그물망 가운데 최초의 것, 즉 담론이다. 담론은 표상이 하나의 표 위에 전개되도록 해준다. 따라서 담론이 표상 내에서 표상을 질서짓는 최초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를 멈출 때, 고전주의적 사유 역시 멈춘다.
고전주의와 근대성/현대성의 문턱seuil은 말mot이 표상과 교차하여 자연발생적인 사물에 대한 그물망(인식)을 제공해주길 멈추었을 때 결정적으로 그어졌다. 언어langage는 일단 표상과 분리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분산된 형태로 존재해왔다(문헌학자, 형식화의 추구, 해석의 추구, 기록행위 자체 등). 이러한 산란 상태로 인해, 언어는 노동이나 생명의 운동과 비교할 때 유별난 운명을 갖는다. 박물학의 표가 분산되었을 때 표 안의 생물은 생명의 수수께끼 주위에 다시 모였으며, 부의 분석이 소멸되었을 때 모든 경제 과정은 생산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반면 일반문법 - 담론 - 의 통일성이 깨어졌을 때, 언어는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철학적 반성은 대상이나 개념적 모형, 근본적 기반 등에 대해 생명 내지 노동의 영역에서 지칠 줄 모르고 탐구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철학적 반성의 주요 관심은, 철학의 과업에 대립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예컨대, 말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묵시적 내용으로부터 해방되든가, 유연해지거나 유체화되어야 한다. 언어는 지성entendement의 공간화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생명의 운동과 고유한 지속durée propre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1)언어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유의 영역에로 돌아왔다. 문헌학자인 니체가 철학적 과업과 언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최초로 결합시킨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언어는 니체가 개척한 철학적-문헌학적 공간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된다. 모든 담론의 보편적 형식화, 세계의 전체적 주석에 대한 주제, 기호의 일반 이론, 더 나아가 모든 담론을 하나의 말로, 모든 책을 한 페이지로, 전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변형시켜 재흡수한다고 하는 주제 등. 그러나 담론의 세분화된 존재를 불가능에 가까운 통일성 내에 가두려는 노력은 말라르메가 죽기 전까지 헌신했던 과업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과업이다. 말라르메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니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니체가 문제로 삼은 것은, 선과 악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Agathos(좋은, 고결한, 용기 있는, 유능한)라고, 타인에 대해서 Deilos(위험한, 나쁜, 폭력적인, 영악한)라고 지칭할 때, 니체가 문제삼은 것은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qui parlait>를 인식하는 것이다. 누가 말하는가? 라는 니체의 질문에 말라르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고독에 있어 그 섬세한 떨림에 있어, 그 무에 있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말의 수수께끼같은 위태로운précaire 존재 자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니체가 결국 말하고 질문하는 주체, 즉 Ecce homo로서 자기 자신에 토대를 두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누가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한 데 비하여, 말라르메는 담론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부터 스스로를 지움으로써 담론 자신에 의해 구성된 위대한 책Livre의 순수한 의식cérémonie에서 집행자로서만 모습을 드러내길 희구한다2).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언어란 무엇인가? 기호란 무엇인가? 언어와 존재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지만 침묵하지도 않는 문학이라고 불리는 언어는 무엇인가?
오늘날 제기되는 이 모든 질문들은 니체의 질문과 말라르메의 답변 사이를 결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19세기 초 담론의 법칙이 표상으로부터 유리되고 언어의 존재 자체가 파편화됨으로써fragmenté 가능해진 질문이며, 니체와 말라르메에 의해 사유가 급격하게 언어라는 유일하고 난해한difficile 존재에로 되돌려졌을 때 불가피하게 된 질문이다. 언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니체가 인간과 신을 동시에 죽이고 회귀le Retour와 더불어 신의 다양한 새로운 빛을 약속했을 때 그가 모색하던 것이 아닐까? 언어가 문헌학적 객관성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일어났던 언어의 파편화는 고전주의적 질서가 파괴되면서 초래된 가장 최근의 명백한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언어의 상실된 통일성을 복구하는 것은 19세기에 진행된 어떤 사유의 결말을 짓는 것인가 아니면 19세기의 언어와 양립할 수 없는 형식을 모색하는 것인가? 언어의 산란 상태dispersion는 담론의 소멸이라고 해도 좋을 고고학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는 분명히 안다. 이러한 대의를 나는 칸트나 헤겔보다도 퀴비에, 보프, 리카도로부터 더 분명하게 배웠다.
2. 왕의 자리
우선 우리는 하나의 담론이 끝나는 곳과 아마도 노동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말mot의 지위를 정당화하기란 어려운데, 이는 마치 극에서 절박한 장면을 해결하는 등장인물un coup de théâtre artificiel/deus ex machina을 설정하는 것처럼 고전주의 시대의 표상의 거대한 상호작용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는 역할을 돌연히 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상호작용의 법칙을 <시녀들>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림 속에는 표상이 매 계기마다 표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화가, 파레트, 캔버스의 표면, 벽에 걸린 그림과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 거울). 그림 속의 모든 선들, 특히 반영 중앙부에 나오는 모든 선들은 표상되고 있으나 그림 속에 부재한 어떤 것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표상된 화가가 자신의 화폭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지만, 또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화가가 자신을 표상할 때 화가의 눈앞에 있는 대상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며, 그림 속에 묘사된 시선이 화가 자신의 실제의 위치인 동시에 왕이 점하고 있는 허구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화가와 왕이 제한없이 교대로 위치하는 애매한 장소의 점유자가 바로 자신의 시선으로써 그림을 하나의 대상, 즉 그 본질적 부재manque의 순수한 표상으로 바꾸는 감상자이기 때문이다.
고전주의 시대 사유에 있어, 표상이 그 자신에 대해 존재함과 동시에 표상 속에서 자신을 표상하는 인물은 자신을 어떤 이미지 내지 반영reflet로서 알아본다reconnaissant. <하나의 표/그림tableau>에서 교차하는 모든 선들을 한데 묶는 인물인 그는 결코 그 표 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18세기 말 이전에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기껏해야 생명력, 노동 생산력, 언어의 역사적 두께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은 지식savoir이라는 조물주가 겨우 200년 전에야 창조했던 극히 최근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빨리 성숙하였다. 물론 일반문법(기억, 상상력), 박물학(종, 속), 부의 분석(필요, 욕구)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존재를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의식이 없었다. 고전주의 시대 에피스테메는 어느 면에서는 인간에 고유하고 종별적인spécifique 영역을 따로 다루지 않는 선들을 따라 분절되었다s'articule.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있어서는 <자연nature>의 기능과 <인간본성nature humaine>의 기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은 실재의 무질서한 병치를 통해 질서화된 존재의 연속체 속에서 차이différence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인간 본성은 이미지의 진열을 통해 무질서한 표상의 연쇄 속에 동일성l'identifique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대립을 통해 인간본성과 자연과의 적극적인positif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인간본성과 자연은 동일한 요소(동일자, 연속성, 지각되지 않는 차이, 단절없는 연속)와 함께 활동하며, 끊임없는 틀trame에 대해 분리가능한 동일성과 가시적 차이들을 배열하도록 하는 일반적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본성과 자연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이 작업은 성공할 수 없다. 표상의 연쇄는 이중화 능력(상상과 기억souvenir 속에서, 비교하는 다양한 주의 속에서)에 의해 무질서한 지면 밑에서 존재들의 단절없는 연속을 재발견한다. 이로써 인간은 세계의 표상을 표상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담론의 지배력souveraineté 하에서 세계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 말하는 행위, 아니 오히려 (고전주의 시대 언어 경험에서는 가능한 한 본질적인 것에 접촉하려 하기 때문에) 명명nommer 행위 속에서 인간본성은 사유의 선형적 연속을 부분적으로 다른 존재들의 연속적인 표table로 변형시킨다. 인간본성은 담론을 통해 자체의 표상을 이중화하는, 즉 이 담론이야말로 인간본성과 자연을 연결하는 것이다. 반대로 존재의 연쇄는 자연의 작용jeu에 의해 인간본성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거대하고 끝없는 연속면은 구별되는 특성들과 얼마간 일반적인 특징들과 동일화의 표시들, 결국에는 말mot 속에서 분명하게 각인된다. 존재의 연쇄는 담론이 되며, 그럼으로써 존재의 연쇄는 인간본성이라든가 표상의 계열série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거대한 이론적 결과들이 수반된다. 고전주의 시대의 사유에서 인간이 자연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여타의 존재들처럼 자연을 매개로 생득권droit de naissance으로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지식savoir의 메커니즘과 그 기능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권위를 지닌 일차적 실재로서, 난해한 대상이자 가능한 모든 인식의 지고한 주체인 인간의 모습은 자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학, 문헌학, 생물학의 법칙에 따라 살고 말하고 일하는 개인에 관한 근대적 테마,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여 이 테마가 인문과학의 등장과 관련된 이 테마는 고전주의 시대의 사유에서는 배제되었다. 표상과 존재가 만나는 장소, 자연과 인간본성이 교차하는 장소에서 고전주의적 사유가 나타내고 있던 것은 바로 담론의 힘이다. 즉 표상하고 있는 한에서의 언어langage이다. 여기서 언어란 사물들이 말의 투명성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명명하고, 재단하며découpe, 조합하고, 합성 또는 분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는 지각의 연속을 하나의 표로 변형시키며, 존재의 연속체를 특성들caractères로 재단한다. 담론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표상들은 진열되고 병치되는 반면, 사물들은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분절화된다.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의 심오한 소명은 항상 어떤 표/그림tableau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 표/그림은 항상 투명해지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16세기에 그 그림은 저 은밀한 일관성consistance에 의해 해독되어야 할 하나의 말로 농축되었고, 세계의 모든 사물과 관련되었었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관성은 상실되었지만, 그 그림은 아직 오늘날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다양한 실존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요컨대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이란, 존재가 정신의 시선regard에 표상되고, 표상이 존재를 존재의 진리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표상과 존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반투명한 필연성nécessité에 불과했다. 고전주의 시대의 경험에 있어서 사물과 사물의 질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말의 지상권souveraineté을 거쳐야만 한다. 이 시기의 말들은 르네상스 시대처럼 해독되어야 할 표시도 아니었고, 실증주의 시기에서처럼 충실하고 제어가능한 도구도 아니었다. 그보다 말들은 존재가 현시되고se manifestent 표상이 질서화되기 위한 기초로서 무색의 격자réseau incolore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에 대한 반성은 비록 그것이 부의 분석이나 박물학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일반적 배치disposition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부의 분석이나 박물학에 대해 길잡이 역할rôle recteur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결과는 표상과 사물의 공동 담론discours commun이자 자연과 인간 본성이 교차하는 장소인 고전주의적 언어가 <인문과학>이 될 만한 것을 거의 절대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서구 문화 내에서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가 남아 있는 한, 인간의 실존이 결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언어 속에는 표상과 존재가 함께 묶이기 때문이다. 17세기에 <나는 생각한다>와 <나는 존재한다>를 연결해주었던 담론은 가시적인 형태로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담론 속에서 결합되었던 것은 바로 표상과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는 존재한다>로의 이행passage은 명증성évidence의 빛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의 담론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 담론의 영역과 기능은 바로 스스로 표상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나란히 분절화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이행에 대한 반론이 성립되고 정당한 권리를 지니려면, 그 반론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담론 - 표상과 존재의 결합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갖지 않는 담론 - 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표상을 우회contourne할 수 있는 문제틀problématique만이 그 같은 반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주의적 담론이 존재하는 한 코기토에 함축된 어떠한 문제 제기
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3. 유한성의 분석
박물학이 생물학이 되고 부의 분석이 경제학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반성이 문헌학이 되었을 때, 그리고 존재와 표상의 공통 장소였던 고전주의적 담론이 소멸되었을 때, 인간은 그러한 고고학적 변동의 심층적 운동 속에서 인식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라는 애매한ambiguë 위치에 등장한다. 인간은 종속된 군주이자 관찰되는 감상자로서 <시녀들>에서 왕에게 할당된 위치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 빈 공간 속에서 모든 등장인물들(모델, 화가, 왕, 감상자)은 이렇게 요구하는 듯하다. 표상의 모든 공간이 어떤 육체의 시선regard de chaire에 관련되어야만 한다고 말이다. 퀴비에와 그 동시대인들은 생명vie이 생물의 가능 조건을 제공하기를 요구했고, 리카도는 노동이 교환, 이윤, 생산의 가능 조건을 제공하기를 요구했다. 최초의 문헌학자들 역시 언어의 역사적 심층에서 담론과 문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는 표상이 생물, 필요, 말 등을 위한 기원의 장소 내지 진리의 원초적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표상은 생물, 필요, 말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하나의 결과, 즉 그것들을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의식 내에서 그것들의 다소 흐릿한 보증인répondant/counterpart에 불과하게 된다. 이제 인간이 사물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낸 표상은 더 이상 사물의 질서화된 표를 하나의 지배적 공간 내에서 전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표상은 인간이라는 경험적 개체에 있어서는 사물 자체와 사물의 내적 법칙에 속하는 질서의 현상phénomène 혹은 외관apparence에 불과하다. 이제는 존재들이 표상 속에서 현시하는 것은 그것의 동일성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해 정립된 외적 관계에 불과하다. 나름대로 고유한 존재를 소유하고 스스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 생물, 교환대상, 말에 의해 비워진 공간에 모습을 나타내자, 생명, 교환대상, 말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위치였던 표상을 떠나 사물의 심층으로 물러나 생명, 생산, 언어의 법칙에 따라 좌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것들의 와중에서 인간은 그 법칙들에 의해 형성된 원환 속에 갇혀 그것에 의해 지시되고 요구를 받게 된다. 우선 인간은 노동, 생명, 언어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구체적 존재는 그것들 속에서 규정된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생물이요, 생산의 도구요, 자신에 선행하는 말들의 운반매체véhicule라는 존재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다. 인간이 소유한 지식이란 그에 대해 외적이며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에 선행하여 인간을 포위하고 있으며, 인간을 자연의 한 대상에 불과한 것 또는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될 얼굴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인간의 유한성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지식의 실증성에 의해 밝혀졌다. 우리는 뇌의 해부, 생산 경비의 메커니즘, 인도-유럽어의 활용체계를 알고 있듯이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한성에 대한 최초의 발견은 실제로는 불안정하다. 유한성은 결코 스스로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유체계에 따른다면, 유한성이란 그것이 부정하는 무한성l'infini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상정될 수 없을까? 종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생산과 노동의 형태는 여전히 수정되고 있다. 또 인간이 역사적 언어가 지니는 과거의 불투명성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기호체계를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실증성 속에서 이 유한성은 실제로 무제한성l'indéfini이라는 역설적인 형식 속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 유한성은 한계limite의 엄격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경계borne는 없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 진전cheminement의 단조로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에는 육체corps가 주어졌는데, 그 육체는 다름아닌 인간 자신의 육체로서, 그것은 애매한 공간의 한 단편fragment이지만, 자신의 고유하고 환원불가능한 공간성을 사물의 공간에 대해 분절되는 것s'articule이다. 이 육체라는 동일한 경험에 욕망désir이 주어짐으로써 모든 사물의 가치 및 상대적 가치가 결정되는가 하면, 거기에 어떤 언어가 주어짐으로써 모든 담론이 가능해진다. 말하자면 이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해주는 이러한 실증적 형식들 각각은 그 고유한 유한성을 배경으로 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한성은 결코 가장 완벽하게 정화된 실증성의 본질이 아니라, 실증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에 불과하다. 모든 경험적 실증성과 인간실존의 구체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유한성을 발견한다. 그 유한성은 육체의 공간성, 욕망의 간극béance, 언어의 시간 등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의 유한성과 근원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 경우에 한계는 외부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규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유한성은 인간 자체의 고유한 사실에 의존하며, 모든 구체적 한계의 실증성을 개방시키는 근원적인 유한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경험성empiricité의 중심부에서는 유한성에 대한 분석으로의 필연적인 상승이나 하강이 지시된다. 인간은 유한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무한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모든 형식들을 그의 실증성 속에서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보여준 인간의 존재 양태의 첫 번째 특징, 인간의 존재 양태가 완전히 전개될 때 공간은 반복répétition의 양태-실증적인 것le positif과 근본적인 것le fondamental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의 양태-일 것이다. 경험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에 이르기까지 유한성은 스스로 대답한다se réponde. 즉 이 유한성은 <동일자Même>의 형상figure 내에서 실증성과 그것의 기초와의 동일성과 차이에 불과하다. 어떻게 근대적 반성이 고전주의적 지식에 의해 질서화된 표의 형식에서 그 정점인 표상의 진열을 지나 어떤 <동일자>에 대한 사유 - 여기서는 차이가 동일성과 같은 것이다 - 으로 향하게 되었는가는 명백하다. 이 유한성의 분석 전체 - 이것은 근대적 사유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된다 - 가 전개될 장소는 바로 근본적인 것 안에서 실증적인 것의 반복에 의해 열린 이 거대하고도 좁은 공간의 내부이다. 우리는 초월론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을 반복하고, Cogito가 사유되지 않는 것impensé을 반복하며, 기원origine으로의 회귀가 후퇴recul를 반복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바로 그곳이다. 고전주의적 철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동일자>에 대한 사유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장소도 바로 출발점인 그곳이다.
유한성의 관념이 명백히 드러나기 위해 과연 19세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17~8세기의 사유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적 생존을 영위토록 하고, 노동하도록 했으며, 불투명한 말들로 사유하게 한 것은 역시 인간의 유한성이었다. 인간의 한계, 즉 무한에로의 부적합성inadéquation à l'infini은 경험적 내용의 존재와 이 내용의 직접적 인식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설정했다. 그러므로 무한성에 대한 부정적 관계 - 창조로도, 타락으로도,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도, 무한한 존재 내의 규정détermination으로도, 총체성에 대한 특수한 관점으로도, 표상과 인상impression의 결합으로도 개념화할 수 있는 - 는 인간의 경험과 그로부터 획득하는 지식에 선행하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유한성(무한에 대한 부정적 관계)은 회귀라든가 순환도 없이 단 한번의 운동으로 육체, 필요, 말의 실재를 위한 기초와 그것들을 절대적 인식 내에 지배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19세기 초에 형성된 경험은 유한성의 발견을 무한성의 사유 내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지식savoir fini에 의해 유한한 실존의 구체적 형식으로서 소여되는 경험들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고전주의 시대의 사유에 있어서는 유한성(무한성의 기초 위에서 실증적으로 구성된 어떤 규정)은 소극적négative 형식들(육체나 필요나 말이나 이 셋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지식)에 설명을 제공하는 반면에, 근대적 사유에 있어서는 생명, 생산, 노동(이것들은 자체에 고유한 실존과 역사성 및 법칙을 갖고 있다)의 실증성이 그 셋의 소극적 상호관계로 인한 인식의 제한적 성격에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역으로 인식의 한계는 생명, 노동,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항상 제한된 경험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실증적으로positivement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적 내용들이 표상의 영역 내에 자리잡고 있는 한, 무한성l'infini의 형이상학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도 하다. 무한성의 이념iée과 유한성 내에서 무한성의 규정이라는 관념이 경험적 내용이 인간의 유한한 형식임과 동시에 표상 내에서 그 위치와 진리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내용들이 표상으로부터 유리되고 자신의 존재 원리를 스스로의 내면에서 갖게 되었을 때, 무한성의 형이상학은 무용해졌다. 이때부터 유한성은 그 스스로에게만(내용의 실증성으로부터 인식의 한계limitation로, 인식의 제한된 실증성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제한된borné 지식에로) 끊임없이 참조한다renvoyer à ell-même/refer back to itself. 이로써 서구의 사유의 장champ 전체는 전도된다. 이전에는 표상 및 무한성으로 구성된 <형이상학>과 생물, 인간의 욕망, 언어 상의 말들에 대한 <분석analyse>과의 사이에 상호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유한성과 인간 실존에 대한 <분석론analytique>과 그것에 대립(비록 상호연관적 대립이지만)하면서 생명, 노동, 언어의 형이상학을 구성하려는 하나의 영속적 유혹이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은 즉시 반박되는 것, 즉 내부로부터 잠식되어 가는 유혹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때의 형이상학은 인간의 유한성의 규모로 축소된 형이상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 사유는 자신에게 고유한 형이상학의 유혹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대적 사유가 유한성에 대한 분석으로서 가치를 지닌 한에서 생명, 노동, 언어에 대한 반성은 형이상학의 종언을 표현함을 보여주려 한다. 즉 생명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환상의 장막이라고, 노동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소외된 사유와 이데올로기라고, 언어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문화상의 에피소드라고 각각 비난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종언은 서구 사유에서 발생했던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의 부정적 측면에 불과하다. 이 대사건이란 다름아닌 인간의 출현이다. 형이상학의 영역을 그토록 축소시킨 것은 결코 인간의 실증성의 부족misère/lack이 아니다. 단순히 외관에서만 보면, 근대성의 출발점은 인간이 자신의 유기적 조직organisation 내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이고, 인간이 노동의 중심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이며, 인간의 사유가 언어의 주름pli 속에 자리잡기 시작할 때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유한성이 끊임없이 자기에로의 참조 속에서 사유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문화는 근대성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문턱을 넘어섰던 것이다. 물론 지식의 다양한 분과들의 차원에서, 유한성은 항상 구체적 존재로서 인간에 의거해, 인간의 실존에 할당될 수 있는 경험적 형식에 의거해 지적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지식의 다양한 분과들의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선험a priori를 발굴하려는 고고학적 차원에서는, 근대적 인간 - 육체적이며 노동하며 말하는 존재로서 지시될 수 있는 - 은 유한성의 형태figure로서만 가능할 뿐이다. 근대 문화는 그 자체에 의거해서, 유한한 것에 관해 사유하기 때문에, 인간에 관해 사유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고전주의 시대의 합리주의가 인간에게 세계 질서 내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자는 모두 인간에 대해서는 사유할 수 없었다.
4.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
유한성의 분석론에서 볼 때 인간은 낯선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un étrange doublet empirico-transcendantal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체의 인식connaissance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그 자신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분석의 장소가 표상이 아니라 유한 속에 있는 인간이므로 문제되는 것은 경험적 내용에서 출발하여 인식의 조건을 밝히는 일이다. 근대적 사유의 일반적 움직임에서는 이 경험 내용이 내성introspection 또는 다른 어떤 분석 형태를 통해 발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대성의 경계선은 인간 연구에 객관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l'homme이라고 불리는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를 구성함으로써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종류의 분석이 탄생한다. 하나는 육체corps의 공간 내에서 조직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초월적 감성학esthétique transcendantale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식은 해부학적-생리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든가, 인식의 형태들은 육체의 독특한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든가 하는 것들이 발견된다. 요컨대 인간의 인식에는 하나의 <본성nature>이 존재하는데, 이 본성은 인식의 형태를 결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인식의 경험적 내용 가운데에서 명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분석은 얼마간 오래되고 극복되기 힘든 인간의 가상illusion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종의 초월적 변증학dialectique transcendantale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인식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인식은 인간들 간에 형성된 관계 및 때와 장소에 따라 취하는 특수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인간의 인식에는 <역사histoire>가 있는데 이 역사는 경험적 지식을 통해 주어질 수 있으며 그 경험적 지식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두 종류의 분석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구나 양자는 모두 하나의 분석론analytique 혹은 <주체의 이론>3)으로부터 면제되며, 오직 자기 자신에 의거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초월론적 반성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내용 그 자체contenus eux-même이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 인식의 본성 내지 역사에 대한 탐구는 일종의 비판을 전제하는데, 이 비판 과정에서는 비판의 고유한 영역을 경험적 지식의 내용에까지 끌어내릴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비판은 순수 반성활동이 아니라 다소 모호한obscurs 일련의 분할이 낳은 결과이다. 즉 이 분석은 기초적이고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인식과, 적어도 안정되고 확정된 형태로 형성된 인식을 구별한다(이 분석이 인식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분석은 가상과 진리, 이데올로기적 망상chimére과 과학적 이론을 구분한다(이 분석이 인식의 역사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분석보다 더 모호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분석, 즉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다. 실제로 객체objet의 질서에 속하는 진리 - 육체와 기초적 지각을 통해 확고하게 형성된 진리요, 환상이 분쇄되고 역사가 소외되지 않은 상태로 출현하는 진리 - 가 존재하는가 하면, 반면에 담론의 질서에 속하는 진리 - 인식의 본성과 인식의 역사로 하여금 참된 언어에 입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 - 도 존재함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진실된 담론의 양태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다음의 둘 중 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이 참된 언어는 경험적 진리 속에서 자신의 토대와 모델을 발견하려 하는데, 경험적 진리는 자신의 발생génese을 자연과 역사 속에서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 실증주의적positiviste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객체의 진리는 그것의 형성을 기술하는 담론의 진리를 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참된 담론은 자기가 규정한 자연과 역사를 지니는 진리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종말론적eschatologique 형태의 담론이 있게 된다(철학적 담론의 진리는 형성 중에 있는 진리를 구성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초월론적인 것의 차원에서 경험적인 것의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모든 분석에 내재하는 동요이다. 꽁트와 마르크스는 종말론(인간의 담론에서 발생한 객체에 입각한 진리로서의)과 실증주의(객체의 진리에 의거해서 규정된 담론의 진리로서의)가 고고학적으로 분리불가능indissociable함을 확인했다. 즉 경험적인 동시에 비판적이고자 하는 담론은 실증주의적이며 종말론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환원되고 약속된 진리로서 나타난다. 또한 비판철학 이전의 소박함이 분할되지 않은 채로sans partage 지배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 소박한 담론으로부터 출발한 근대적 사유는 환원의 질서도 아니요, 약속의 질서도 아닌 담론의 장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담론은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을 분리하려고 하면서도 양자를 항상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 담론은 인간을 하나의 주체로서, 경험적으로 획득되었지만 가능한 한 근원에 가까이 접근한 인식의 장소로서, 그러한 내용들에 직접 현시되는 순수형식으로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담론이다. 요컨대 이 담론은 의사-감성학과 의사-변증학에 대해 주체의 이론 안에서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육체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 모두가 뿌리박고 있는 제3의 매개항 안에서 양자를 분절화하는 분석론의 역할을 하는 담론이다. 근대적 사유에서는 그같이 복잡하고, 그처럼 과잉결정되었으며surdéterminé, 그처럼 필수적인 역할이 체험된 것le vécu/actual experience에 대한 분석4)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실상 체험된 것이란 경험expérience에 대해 모든 경험적 내용이 주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경험 내용 일반을 가능하게 해주며 경험 내용의 일차적 뿌리enracinement를 지시해주는 근원적 형식forme originaire이기도 하다. 체험된 것은 또한 육체의 공간과 문화의 시간의 사이, 자연의 규정과 역사의 무게 사이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와 자연이 (육체를 통해) 환원불가능한 공간성의 경험 속에 자리잡아야 하며, 무엇보다 역사의 운반자인 문화가 자신의 침전된 의미signification의 직접성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반성에서 어떻게 체험된 것에 대한 분석은 실증주의와 종말론에 대한 근본적 반론으로서 확립되었는가, 즉 어떻게 그것은 초월론적인 것과 관련된 망각된 차원을 복구하려고 노력했는가, 어떻게 그것은 진리란 오직 경험적인 것에로만 환원된다는 소박한 담론을 추방했는가를 이해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체험된 것에 대한 분석은 혼합된 성격nature mixte을 가진 담론이다. 이 분석은 애매한 지층을 향하고 있는데, 그 지층은 구체적인 지층이기도 하지만, 소박함의 토대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사물의 실증이 제거된 지층이다. 또한 이 분석은 육체에 의해 윤곽지어지는 근원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자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능한 객관성을 분절화하려 한다. 또 경험 내에서 은폐됨과 동시에 드러나는 의미론적 두께épaisseur semantique에서 출발하여 한 문화의 가능한 역사를 분절화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인간에 있어 경험적인 것이 선험적인 것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긴급한 요구를 주의깊게 완수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양자가 정반대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내지 종말론적 형태의 사유(마르크스주의는 그 첫 번째 서열이다)와 현상학에 의해 고무된 반성을 연결시키는 그물이 얼마나 조밀하게 짜여 있는가는 분명하다. 최근에 양자가 <접근rapprochement>하게 된 것은 완만한 타협의 질서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5). 즉 고고학적 배치의 차원에 있어 양자는 인간학적 공준postulat anthropologique이 성립한 순간, 즉 인간이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로서 출현했던 순간부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 간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와 종말론의 진정한 논쟁점은 체험된 것으로의 회귀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이상하게 보이는 다음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실존하는가? 우리는 인간에 관해 최근의 알려진 내용에 가려져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세계나 세계의 질서나 단순한 존재로서 인간은 실재했지만 인간 그 자체는 실존하지 않았던 시기 - 이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 를 더 이상 기억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체의 사유가 인간은 이제 <약속과 위협Promesse-Menace/promise-threat>이라는 절박한 사건의 형식6)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초인surhomme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할 때, 왜 그 사유가 우리를 그토록 혼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었고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회귀retour의 철학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오래전부터 사라져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근대적 사유, 우리의 휴머니즘은 모두 인간의 비존재라는 위협적인 굉음을 들으며 조용히 잠들어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며 인식을 통해 우리에게 세계의 진리를 열어주는 유한성에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묶여 있는 곳은 호랑이의 등이 아닐까?
5. 코기토와 사유되지 않은 것l'impensé
실로 인간이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의 위치에 있다면, 즉 인간이 역설적 형상이라면, 이때 인간은 하나의 코기토라는 직접적이며 지고한 투명성 속에 있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자기의식에로 정당하게 인도되지도 인도할 수도 없는 어떤 객관적 불활성l'inertie objective내에 거주할 수도 없다. 인간은 항상 개방되어 결코 결정적 한계가 주어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답사되는 차원을 지닌 존재 양태이다.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로서 인간은 또한 오인méconnaissance의 장소이기도 하다. 근대적 형식의 초월론적 반성은 자연과학에서가 아니라, 칸트의 경우처럼 인간을 항상 자기 인식에로 소환하는 <알려지지 않은 것non-connu>의 실존 가운데서 자신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이제는 이전처럼 자연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필연적 판단을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인간은 사유되지 않은 것을 사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인간은 생명, 노동, 언어의 주체일 수 있는가? 여기서 칸트의 질문에 대한 4중의 전위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리가 아니라 존재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의 가능성이 아니라 원초적 오인의 가능성이, 과학에 대한 철학이론들의 기초되지 않은non fondé/unaccountable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설명될 수 없는 경험의 전 영역에 대한 명석한 철학적 의식에로의 회복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초월론적인 질문에 대한 이러한 전위에서 출발함으로써 오늘날의 사유는 코기토라는 주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사유되지 않은 것의 존재 불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은 역시 오류, 착각, 꿈과 광기, 근거 없는 생각의 모든 경험을 토대로 했던 것이 아닌가? 근대의 코기토는 우리의 초월론적 반성이 칸트적 분석과 구별되는 그만큼, 데카르트의 코기토와도 구별된다.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사유를 우리가 오류 내지 착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유를 무해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근대적 코기토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자기에 대해 현전하는 사유pensée présente à soi와 사유 내에서 사유되지 않은 것non-pensée에 뿌리를 둔 것과를 분리 내지 연결하는 거리distance에 가장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대적 코기토는 사유의 내부에서, 주위에서, 하부에서 사유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유에 낯선 것도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사유의 분절화를 가장 명료한 형식 하에 가로지르고 이중화하며 재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근대적 코기토란 모든 사유가 어떻게 여기 밖의 다른 장소hors d'ici, 즉 그 자체에 매우 근접해 있는 어떤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새롭게 던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코기토에 고유한 이 이중의 운동은 왜 <나는 생각한다je pense>가 <나는 존재한다je suis>라는 명증évidence으로 인도될 수 없는가를 설명해준다. 가연 나는 내가 말하는 이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손으로 수행한 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가 나의 내면에서 깊이 느끼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코기토가 존재의 긍정affirmation으로 인도되기보다는 존재에 관련된 일련의 의문들interrogations로 인도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사유되지 않은 것과 뿌리깊은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데카르트나 칸트의 분석과는 멀리 떨어진 반성형식이 정립된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으로 순수하게 역사적인 질서ordre와 관련된 것이다. 현상학은 코기토라는 데카르트적 테마와 칸트가 흄의 비판으로부터 이끌어낸 초월론적 동기와의 종합을 이룬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후설은 서구적 이성ratio을 순수철학에 대한 급진화이자 순수철학에 고유한 역사의 가능성의 토대인 어떤 반성으로 재정향함으로써, 서구적 이성의 가장 심원한 소명을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후설이 이러한 종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초월론적 분석이 그 적용점을 전환하고(자연과학의 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코기토가 그 기능을 전환했기 때문에(여기서 코기토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사유로부터 필증적apodictique 실존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는가s'echapper를 보여줌으로써 존재에 대한 다양하고 끊임없는 의문으로 인도된다)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오래된 서구의 합리적 목표의 회복이라기보다는 18~9세기의 전환기에 근대적 에피스테메에서 발생한 거대한 단절rupture에 대한 민감하면서도 매우 공식화된 인정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상학은 그것이 反심리주의의 방식으로, 아니 오히려 선험적이고 초월론적인 동기에 관한 문제를 재생시켰다는 점에서는 반심리주의에 대립하여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의 은밀한 유사성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위협하는 근친성voisinage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또한 현상학이 비록 코기토에로 환원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항상 질문들, 특히 존재론적 질문에로 인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현상학적 기획은 체험된 것에 대한 기술 - 경험일 수 밖에 없는 - 과 <나는 생각한다>의 우선성을 제거하는met hors circuit 사유되지 않은 것의 존재론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용해하고 있다.
두 번째 결론은 적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사유되지 않은 것과의 관계에, 엄밀히 말하면 양자가 서구문화에 쌍둥이처럼 출현한 데에 관련된다. 그런데 실제로 무의식적인 것l'inconscient 내지 사유되지 않은 것의 온갖 형태는 인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의 보상récompense이 아니었다. 고고학적 차원에 있어 인간과 사유되지 않은 것은 동시대적이다. 이는 사유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사유되지 않은 것이다. 사유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으며, 인간에 대해 타자l'Autre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 외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불가분indispensable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 사유되지 않은 것은 19세기 이래 줄곧 인간의 침묵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집요한 분신 이상이 아니어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반성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보충적인 형태, 타자나 그림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헤겔의 현상학의 경우에는 대자Für sich에 대립되는 즉자An sich, 쇼펜하우어의 무의식적인 것die Unbewußte, 마르크스의 소외된 인간, 후설에 있어서는 암묵적인 것l'implicite, 현실화되지 않은 것l'inactuel, 침전된 것sédimenté, 상술/수행되지 않은 것non-effectué/Nichtausgefürte였다. 모든 근대적 사유는 사유되지 않은 것을 사유하는 법칙에 의해 관통된다traversé/imbued. 말하자면 대자의 형식으로 즉자의 내용을 반성한다든지, 인간과 그의 고유한 본질을 화해시켜 소외를 종결시킨다든가, 경험에 직접적이며 무력한désarmée 명증을 제공하는 지평horizon을 명확히 한다든가, 무의식의 베일을 거둔다든가[사르트르], 무의식적인 것의 침묵 속에 몰입하거나 무의식의 끊임없는 웅얼거림에 귀기울이는[프로이트] 등등.
근대의 경험에 있어 인간을 지식의 대상으로 정립함으로써 이 새로운 형상이 에피스테메 영역에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은 내부로부터 사유를 내부에서 사유에 붙어다니는 하나의 명법impératif을 함축한다. 근대의 종교적 도덕을 별도로 하면, 서양은 오직 두 가지 윤리 형식을 가질 뿐이다. 고대의 윤리형식(스토이즘 또는 에피큐리아니즘)은 세계의 질서에 의해 분절화되었으며, 그 질서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지혜의 원리라든가 정치체cité의 원리를 연역해낼 수 있었다. 18세기의 정치적 사유 조차도 여전히 이 형식에 속한다. 반면에 근대적 윤리 형식은 어떠한 도덕도 정식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명법이라도 사유 내에, 그리고 사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파악을 위한 사유의 운동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근대적 사유가 순수 사변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유는 이제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유는 해방하는 것이나 노예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사유는 본래 하나의 행동action, 하나의 위험한 행위acte périlleux인 것이다. 사드, 니체, 아르토, 바타이유는 그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정치적 선택 없는 철학이란 없으며, 모든 사유는 진보적이거나 반동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수 있는가? 그들이 어리석은 점은 모든 사유가 한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한다exprime고 믿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비자발적인 심오함은 그들이 사유의 근대적 존재 양태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 인간에 대한 인식은 그 가장 모호한 형식에서조차 윤리학, 또는 정치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근대적 사유의 특성은 인간에 대해 타자인 것이 인간에게 동일자로 되어야만 하는 영역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6. 기원의 후퇴와 회귀
인간의 존재 양태와 인간에 관한 반성을 특징짓는 최후의 특성은 기원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고전주의의 사유가 이상적인 발생에 입각해 확립하려 했던 관계와 다르다. 18세기에 있어서 기원에로의 회귀는 표상에 대한 순수한 복제redoublement에 가능한 한 접근해 보려는 시도였다.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하나의 표로서 생각했다. 이러한 표의 존재들은 연속적으로 짜여있는 하나의 질서 속에 서로 잇닿아 있었다. 또한 언어의 기원은 사물의 표상과 소리나 몸짓의 표상 사이의 투명성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기원은 이러한 표상의 순수한 연속suite pure이라는 측면에서 모색되었다. 그러므로 상기가 적용할 수 있고, 상상력이 어떤 표상을 새롭게 표상할 수 있었다.
근대적 사유에 있어서 그 같은 기원은 더 이상 설정될 수 없다. 우리는 노동, 생명, 언어가 어떻게 그것에 고유한 역사성을 획득하고 그 역사성에 깊이 잠겨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비록 이 세 영역의 전 역사는 내부로부터 그 기원을 향해 있었으나, 결코 자신의 기원을 참되게 언표할 수는 없었다. 기원이란 마치 원뿔의 잠재적 꼭지점sommet virtuel과도 같은데, 모든 차이, 분산, 불연속은 기원이라는 하나의 동일성의 점에로 모여, 하나의 감지 불가능한 <동일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일자>는 여전히 내부로부터 파열되어 이내 타자가 될 힘을 지닌다.
인간이 형성된 것은 19세기 초 이래 이러한 역사성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은 사실 이미 만들어진 역사성과 연결될 때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들의 시간을 통해 윤곽지어지는 그 기원과 결코 동시적이지 않다. 인간은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하고자 노력할 때, 자신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생명을 배경으로해서만 자신의 고유한 시작propre commencement을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노동하는 존재로 재파악하고자 할 때, 이미 사회에 의해 제도화되고 지배된 인간의 시공간 밖에서는 그러한 존재의 가장 기초적 형식조차 규명할 수 없다. 인간이 구성된 언어에 우선하는 말하는 주체로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할 때, 그가 발견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언어의 가능성뿐이다. 그는 결코 모든 언어를 가능하게 했던 최초의 단어, 하나의 더듬거림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기원으로서 구실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성은 항상 이미 시작된 것을 토대로 해서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기원이란 것은 결코 시작commencement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기원이란 인간 일반, 모든 인간이 이미 시작된 노동, 생명, 언어에 따라 분절화되는 방식 이상의 것이다. 이 기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생명, 노동,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주름pli에 진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원적인 것l'originaire의 차원은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다. 이 표면surface에는 노동, 생명, 언어에 의해 일종의 침전물로서 형성되고 저장된 복잡한 매개물들이 나름의 역사를 지닌 채 거주하고 있다. 최초의 대상이 조작되고, 가장 단순한 필요가 표현되고, 가장 중립적인 단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재생하는 것은 인간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지배하는 시간의 매개물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인식되고 있지 않다. 말하고 실존하고 일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부터 노동, 생명, 언어의 진리와 기원을 은폐하는 거대한 그림자의 영역이 사방에서 이러한 인식을 뒤덮고 있다.
근대적 사유가 <정신현상학> 이래로 끊임없이 기술했던 기원적인 것은 고전주의 시대에 재구성하고자 했던 이상적 발생과 전혀 다르다. 인간에 있어 기원적인 것이란 동일성의 정점sommet에로 회귀하거나 지향하지 않으며, 타자의 분산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동일자의 시점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기원적인 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인간 이외의 어떤 것에 연결시켜 주었던 그 무엇이다. 그것은 인간보다 오래되어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을 인간의 경험에 편입시키는 그 무엇이다. 역설적이지만, 인간에 있어 기원적인 것은 인간의 탄생 시간이나 인간의 경험 중 가장 오래된ancien 핵심을 알려주지 않는다. 기원적인 것은 인간 자신과 동일한 시간에 속하지 않는 그 무엇에 인간을 연결시키며, 인간과 동시대적이 아닌 모든 것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인간의 경험도 사물에 의해 전적으로 성립되고 제한되었기에, 아무도 인간에게 하나의 기원을 제시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편에서 이러한 불가능성은 사물의 기원은 항상 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사물의 탄생은 시간 속에서 그 불빛을 찾을 수 있으나, 인간은 기원이 없는 존재, 조국patrie이나 생일이 없는 존재요, 탄생의 장소를 갖지 않으므로 그의 탄생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적인 것에서 직접 도출되는 사실은 인간이란 자신을 자신의 실존과 동시대적이게 만드는 기원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이다. 경험적 질서에서 사물들은 항상 인간에 대해 후퇴reculées pour lui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의 원점은 파악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인간은 사물의 후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신이 후퇴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사유가 해야 할 하나의 임무가 주어진다. 이 임무는 사물의 기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기원은 사유가 여전히 사유해야 할 어떤 것인 동시에 항상 사유에 대해 새로운 어떤 것이며, 결코 성취될 수는 없으나 항상 더욱 가까이에 접근한 절박함 속에 약속되는 어떤 것으로 된다. 기원은 항상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며 사유가 향해가는 반복이며 항상 이미 시작된 회귀이다.
18세기에 기술된 이상적 발생을 망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가능해진 바로 그 순간에, 근대적 사유는 이미 기원에 관한 문제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문제틀은 우리의 시간 경험의 기초로서 쓰였다. 근대적 사유는 다음 두 가지의 실증주의적 시도들을 용인했다. 한편에서 실증주의는 시간의 단위unité가 회복됨과 동시에 인간의 기원도 존재의 연속적 계열 내에서 하나의 날짜, 주름에 불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시간적 연대기chronologie를 사물의 연대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다른 한편 실증주의는 개별적 또는 문화적 시간에 따라 인간이 사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과학 등을 연대순에 따라 일렬로 늘어놓으려는 정반대의 시도도 용인했다. 이러한 두 가지 시도 모두에 있어, 사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상호 종속적이다. 그러나 두 가지의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시도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기원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특징짓는 근본적 불균형asymétrie을 지적해주기에 충분하다. 근대적 사유는 기원적인 것의 영역을 회복하려는 과업이 주어지는 순간, 기원의 후퇴를 발견한다. 근대적 사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즉 근대적 사유는 점차 완성되고 심화되길 멈추지 않는 후퇴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적 사유전체가 운명적으로 회귀에 깊이 몰두하고 재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헤겔, 마르크스, 슈펭글러에 이르기까지 사유의 테마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사유란 사유의 완결을 지향하는 운동과정에서 자체 내에 몰락을 겪는 것이요, 자신의 충만한 빛을 밝히는 것이요, 자신의 원환을 완결짓는 것이요, 자신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난 낯선 형상들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바다로 다시금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이러한 회귀의 반대편에는 횔덜린, 니체, 하이데거의 경험이 있다. 여기서는 회귀가 기원의 극단적인 후퇴 - 신이 사라지고, 사막이 확장되며, 기술techne이 그의 의지의 지배domination를 확립한 -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완결이나 몰락이 아니라, 오히려 기원이 후퇴한만큼 기원을 해방시켜주는 끊임없는 찢어짐déchirure이다. 그러므로 가장 극단인 것extrême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7)
결과적으로 사유는 자기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기원에 관해 사유하는 자신의 무한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서, 인간이란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과 동시대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을 분산시키고 그를 그의 고유한 기원으로부터 멀리 끌어내는 어떤 힘puissance 속에, 아마도 영원히 빼앗겨 버린 절박함 속에서 그에게 기원을 약속하는 그러한 힘의 영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힘은 인간에게 낯설지 않으며 이미 친숙해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시간 - 인간 그 자신인 시간 - 은 인간이 출발했던 여명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약속된 또 다른 여명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간 - 시간이 경험에 주어질 수 있는 기초로서 - 이 표상의 철학에서의 시간과 어떻게 다른가는 분명하다. 표상의 철학에서 시간은 표상 위에 일종의 선형적 연속의 형식을 부과함으로써 표상을 분산시켰다. 이와 반대로 근대적 경험에 있어서는 기원의 후퇴가 모든 경험보다도 더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자기의 실증성을 빛내고 현시하는 곳은 바로 기원 내에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유한성이라는 처음의 테마와 만난다. 그러나 이 유한성은 애초에는 인간에게 지워진 사물의 무게 - 인간은 생명, 역사, 언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 로서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 차원은 인간 존재와 시간 사이의 불가분의insurmontable 관계이다.
7. 담론과 인간의 존재
위의 네 가지 이론적 선분(유한성에 대한 분석, 경험적-초월론적 반복에 대한 분석, 사유되지 않은 것에 관한 분석, 기원에 대한 분석)이 고전주의 시대 언어를 구성하던 네 개의 종속된 영역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관계는 일견 유사성과 대칭성의 관계이다. <동사>-<유한성>, <분절화>-<경험적-초월론적 이중화>, <지시>-<사유되지 않은 것>, <파생dérivation>-<기원> 등의 상응.
그러나 19세기의 네 가지 이론적 선분들과 고전주의 시대의 언어 이론의 네 영역과의 상응성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반문법의 공간을 윤곽지었던 네 가지 이론적 선분들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18세기 말 표상의 이론이 붕괴됨과 동시에 분열되었고, 그 기능과 차원, 타당성의 전 영역을 변화시켰다. 고전주의 시대에 있어 일반문법의 기능은 하나의 언어가 어떻게 표상의 연쇄 속에 도입될수 있는가, 어떻게 담론의 단순한 선 위에 나타나 동시성의 형태들을 전제로 하는 언어로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반대로 19세기 이래 발전한 인간 존재의 양태 분석은 표상의 이론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분석의 임무는 사물 일반이 어떻게 표상에 주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처럼 인간과 사물의 공존 속에서 표상이 개방한 거대한 공간을 통해 현시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유한성,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그를 떼어놓는 동시에 그것을 약속하는 분산, 시간의 통제할 수 없는 거리이다. 인간에 관한 분석론은 담론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표상의 이론이 일차적이냐 파생적이냐에 따라 체계의 균형은 송두리째 수정된다. 표상의 우월성이 사라져버린다면 담론의 이론도 해체될 것이다. 이 형태는 두 가지이다. 우선 경험적인 차원. 네 개의 구성적 선분들은 여전히 발견되나 그것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완전히 전도된다. 동사의 특권적 지위 의 이론 -> 내적 문법구조에 대한 분석, 분절화의 이론 -> 굴절의 이론, 어근radical의 이론 -> 표상적 어근racine représentative의 이론, 파생 -> 언어의 근친관계. 다음으로 기초의 차원. 이 기초의 차원에서도 네 개의 선분은 여전히 잔존하나 새로운 분석이 사물과의 과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전과 다르다. 이 분석은 네 개의 선분을 이전처럼 언어 내부의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두고 있는 표상의 영역으로부터 해방시켜 저 외부성extériorité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담론에 대한 고전주의적 분석은 그것이 표상의 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두 가지 분석으로 분리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문법적 형태의 경험적 인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한성의 분석론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의 존재(표상이라는 의심되지 않는 명증에 근거한)와 근대적 사유에 등장한 바의 인간의 존재 사이에 내재하는 양립불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존재양태에 관한 분석론은 오직 표상적 담론에 관한 분석이 해체되고, 옮겨지고, 전도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립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의 이론으로 순진하게 회귀하는 것이 될지 모를 모든 일을 회피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언어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와 언어의 존재에는 소멸될 수 없는 간극béance이 형성될지도 모른다. 아마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선택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 싶다. 출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서구 문화에 있어 어떤 시대이건, 인간의 존재와 언어의 존재가 공존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분절화될 수 있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양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의 사유의 근본적 특징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담론에 대한 분석이 유한성에 대한 분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 기호 및 말에 관한 고전주의적 이론이 문제삼은 것은 유사성에 의해 연속된 표상들이 어떻게 안정된 차이와 제한된 동일성으로 구성된 영속적인 표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반면 유한성의 분석론은 인간은 결정된 존재라는 전제 하에 이러한 결정성의 기초란 근원적인 한계 속의 인간 자체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 분석론은 경험의 내용이란 이미 그것에 고유한 조건이라는 사실과 사유는 경험 내용을 회피하는 사유되지 않은 것에 처음부터 항상 붙어다니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인간과는 동시대적이 아닌 기원이 어떻게 하나의 절박한 것으로서 떨어짐과 동시에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요컨대 그것은 어떻게 타자,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동시에 가장 가까운 것이자 동일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에 진력한다. 이로써 우리는 차이Différence의 질서에 관한 반성(이러한 반성은 연속체의 존재론을 전제하며, 형이상학을 전제한 완전성 속에서 전개되는 단절없는 충만한 존재를 요구한다)으로부터 그것의 모순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일종의 변증법과 존재론의 한 형태를 함축하는 동일자Même에 관한 사유로 이행해왔다. 근대적 사유는 더 이상 완결되지 않을 차이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성취될 동일자를 드러내려는 사유이다. 이와 같은 작업에는 분신의 동시적 출현과 자신과 분신을 연결하는 조사 <와et> 속에 자리잡은 간극이 전제된다. 즉 후퇴<와> 회귀, 사유<와> 사유되지 않은 것,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 실증의 영역에 속하는 것<과> 그 영역의 기초를 이루는 질서에 속하는 것의 동시적 출현과 간극이 전제되는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사유는 사물들을 하나의 표 속에서 공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표상의 순수한 계기가 지니는 고유성에 연결시켰다. 시간이 공간을 기초한 것이다. 반면 근대적 사유가 사물의 역사와 인간에 고유한 역사성을 기초로 밝혀낸 것은 <동일자>의 내부에서 빈 공간을 만드는 거리distance creusant이다. 이 간극의 양 끝에서 동일자는 분산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 근대적 사유로 하여금 여전히 시간을 사유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심오한 공간성이다.
8. 인간학의 잠
인간에 대한 분석론으로서 인간학anthropologique은 우리가 아직 그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유의 한 구성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간학은 표상이 자기에게 고유하고도 유일한 운동을 통해 종합과 분석의 작용을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던 순간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가 지배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경험적 종합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적 종합은 <나는 생각한다>의 지상권이 그 한계, 곧 인간의 유한성에 도달했던 바로 그 순간에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칸트가 그의 전통적 3부작의 세 가지 질문에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을 덧붙였던 <논리학Logik>에서 이미 정형화되었다. 말하자면 그의 세 가지 비판적 질문(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은 네 번째 질문, 즉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질문은 19세기 초 이래 사유를 관통하고 있다. 비록 칸트의 경우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끊임없이 양자 간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의해 근대철학을 특징짓는 혼합된 차원의 반성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주름 속에서 초월론적 기능은 자신의 강압적인 그물로 움직임 없는 회색인 경험성의 공간을 뒤덮는다. 반대로 경험적 내용들은 생기를 얻어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초월론적인 것을 멀리 내쫓는 담론에 즉각적으로 포섭된다. 이때 이러한 주름 안에서 철학은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번에는 독단론의 잠이 아니라 인간학의 잠이다.
사유를 그와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적 사변형을 그 기초부터 파괴하는 것 말고 다른 수단은 없다. 왜냐하면 사유는 이 잠이 너무도 깊은 까닭에 이 잠을 오히려 깨어있음으로 체험하며, 그럼으로써 사유는 오직 자기의 내부에서 하나의 기초를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독단론의 악순환circularité을 근본적인 철학적 사유만이 지닐 수 있는 명민함 내지 깊은 고뇌와 혼동한다. 아마도 우리는 니체의 경험을 인간학의 뿌리를 뽑는 시도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니체는 문헌학적 비판의 방식 내지 일종의 생물학주의biologisme를 통해서 인간과 신이 서로에게 속해있는 지점, 즉 신의 죽음이 인간의 소멸과 동의어가 되며, 초인에의 약속이 무엇보다 인간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지점을 다시 발견했다. 여기서 니체는 현대의 철학이 사유하기를 재개하기 시작한 문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에도 현대철학의 진로를 계속 지배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회귀의 발견이 진실로 철학의 종언이라면, 인간의 종언은 철학의 출발점에로의 회귀일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단지 인간이 사라진 빈 공간 속에서만 사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빈 공간은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채워져야 할 공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유의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개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간학은 아마도 칸트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유의 노정을 지배하고 통제한 근본적인 배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치는 우리의 눈 앞에서 해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인간 및 인간의 지배와 해방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이들, 여전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든 이들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철학적 웃음rire philosophique, 말하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그런 웃음으로 반대할 수 있을 따름이다.
1) 푸코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나, 베르그손을 염두해두는 표현으로 보인다. 베르그손, 「형이상학 입문」,『사유와 운동』, p. 203. "형이상학이 참으로 형이상학이려면, 그것은 개념을 떨어버려야만 한다. 또한 적어도 경직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개념들이란 유연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거의 유동적이다시피한, 요컨대 직관의 그 떠다니는 형태를 표본으로 삼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표상이다." 또한 p. 229 "그렇게 하여 정신은 유동적인 개념에 이르게 된다. 이 개념은 실재의 모든 굴곡을 따라가면서 사물의 내적 생명의 운동 자체를 획득할 수 있다."
2) 말라르메가 말하는 책le Livre은 바로 시에 대한 개념 자체, 단 한권 밖에 없는 책, 우주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책이다. 세계 전체는 그 책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책은 오직 그 내부의 질서만 존재할 뿐 바깥은 없는 책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인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우주에 의해 작성되는 책으로서, 말라르메의 시인소멸론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완전히 죽었으며, 내 정신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장 불결한 지역도 영원입니다. (...) 이제 나는 비인칭이며, 이미 형이 알고 있던 스테판이 아니라, - 과거의 나였던 것을 통하여 정신적인 우주가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전개해나간다는 하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1867년 5월 14일 앙리 카잘리스에게 보낸 편지) 스테판 말라르메, 『시집』, 황현산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5, p. 33에서 재인용.
3)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체계는 초월적 요소론은 초월적 감성학(실증주의)과 초월적 논리학으로 분류된다. 초월적 논리학은 다시 초월적 변증학(종말론)과 초월적 분석학으로 나뉜다. 재래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초월적 변증학을 제외한 초월적 분석학 부분이 보통 칸트의 초월철학이라고 간주된다.
4) 특히 메를로 뽕띠의 현상학에서 Le vécu(lived experience, Erebnis)는 데카르트(사유/연장)나 칸트(감성/지성) 식의 이원론에 비해 양가적이고 애매한 성격을 갖는다. 이 체험된 것에서 형식과 내용,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 기초짓는 것과 기초지어지는 것 등이 혼합되어(zweideutig, ineinander) 나타난다.
5) 푸코가 여기서 생각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현상학적 마르크스주의(사르트르나 메를로 뽕띠 또는 이후 Enzo paci, Tran duc tao 등으로 대표되는)의 등장을 염두해 두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6) 이 대목 역시 정확한 인용이 없으나, 다만 종래의 인간이 약속과 위협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는 것”,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동물로서의 인간 주체를 만들기 위한 고통과 처벌의 기제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반해 니체의 초인은 죄와 양심의 가책을 극복하는 순진무구한 존재, 적극적 망각의 존재로 나타난다. 니체, 『도덕의 계보』의 제2논문 참조.
7) 가장 먼 것Ferne이 가장 가까운 것Nähe이다. 이는 서양철학을 존재 망각의 역사로 파악하는 하이데거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이때 가까움이나 멂은 물리적 차원에서 측정되는 성격의 거리Abstand가 아니다. 가령 현존재Dasein는 존재적으로는 가장 먼 것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다. Michael Inwood, A Heidegger Dictionary, Blackwell, 2000, p. 138. 또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근본적 존재방식으로서의 가까움이 거리두기Entfernung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p.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