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야 비로소 시집은 끝난다
1
시 한 편 읽으면 일어나 도서관 주위를 빙빙 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 한 편 들이면 꽉 차는 좁은 마음 무거워 다리를 질질 끌며 오래 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걸음이 큰 원을 그렸다가 작은 원을 그렸다가 시작과 시작이 다시 만나지 않는 나선을 그렸다가 하고 싶다.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말은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뜻이지 모두가 각자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은 아니라서, 모두의 중심을 그러모아 성대하게 소각하고 싶다. 중심과 중심이 맞부딪혀 이가 빠진 동그라미들의 윤곽선을 풀어 진동하는 끈으로 만들고 싶다. 끈은 무엇을 묶는다.

모퉁이 / 안도현
모퉁이가 없다면
그리운 게 뭐가 있겠어
비행기 활주로, 고속도로, 그리고 모든 막대기들과
모퉁이 없는 남자들만 있다면
뭐가 그립기나 하겠어
모퉁이가 없다면
계집애들의 고무줄 끊고 숨을 일도 없었겠지
빨간 사과처럼 팔딱이는 심장을 쓸어내릴 일도 없었겠지
하교 길에 그 계집애네 집을 힐끔거리며 바라볼 일도 없었겠지
인생이 운동장처럼 막막했을 거야
모퉁이가 없다면
자전거 핸들을 어떻게 멋지게 꺾었겠어
너하고 어떻게 담벼락에서 키스할 수 있었겠어
예비군 훈련 가서 어떻게 맘대로 오줌을 내갈겼겠어
먼 훗날, 내가 너를 배반해 볼 꿈을 꾸기나 하겠어
모퉁이가 없다면 말이야
골목이 아니야 그리움이 모퉁이를 만든 거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들이 모퉁이를 만든 거야
2
빗님 덕분에 한 며칠 시원했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 있었다. 여름이 끝났구나 하고. 여름한테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면서 아마추어 냄새 나게 이거 왜 이래. 위아래로 검은 옷 입고 걸었더니, 기름 없이 튀겨준다는 마법의 기계 속에 갇힌 오징어 튀김이라도 된 것 같았다. 확인해 봤는데, 꼴랑 32도였다. 뭘까. 38도인데도 견뎌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32도만 돼도 햇님 눈알을 콱 찌르고 싶은 날도 있다. 날씨와 몸뚱이 중에 어느 놈이 이렇게도 일관성이 없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군.
그러나저러나 읽었다. 아직 비가 내리던 27일에는 그레이슨 페리의 『남자는 불편해』, 나쓰메 소세키의 『태풍』, 이기호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진중권의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 인상주의 편』, 김혼비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누치오 오르디네의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 있음』를 읽었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이 쨍쨍한 28일 오늘은 김민철의 『하루의 취향』,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쓰고 박종대가 번역한 『일러스트 공산당 선언·공산주의 원리』, 박차민정의 『조선의 퀴어』,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를 읽었다.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과 이현우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는 이틀을 이어 읽었다. 언제나 그렇듯, 저 중에는 다 읽은 아이도 있고 아직 읽고 있는 아이도 있다. 하루 치 할당량 8권x80쪽을 완수하려면, 오늘은 밤이 떠나기 전에 두 권의 책을 더 펼쳐야 한다.


『남자는 불편해』는 불편하지 않고 통쾌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가 사람을 훨씬 더 불편하게 한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에 대해 다정한 서재친구 ㄷ님은 기절한다고, 역시 다정한 서재친구 j님은 100권을 사서 옥상에서 뿌리고 싶다고 평하셨다. 그 두 분을 굳게 믿고 책을 빌렸는데, 역시 믿음이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기절을 경험한 ㄷ님의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j님의 지갑 사정에도 이상이 없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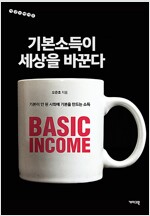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의 경우, 오찬호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보다 8개월 뒤에 출간되었는데(번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찬호의 책을 삼켜버렸다. 이 책을 읽으면 오찬호의 책도 읽은 것과 진배없게 되었다.

『책에 빠져 죽지 않기』가 배송되었다. 바로 띠지를 버리고(잠깐만, 띠지가 없었나, 띠지가 있는 애는 다른 애였나.....?) 침대에 몸을 던졌다. 발장구를 치면서, 우리 로쟈님이 알라딘 밖에서는 어떤 글을 쓰고 계시려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휘리릭 책을 펼쳤다. 그리고는 정신이 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200쪽이라고 한다. 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