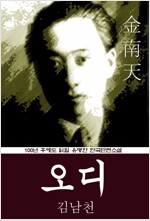산딸기철이다. 시장에 가서 산딸기, 자두, 살구, 체리를 욕심껏 사서 동네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나눠 먹었다. 슬픈 마음을 숨기려 그 애도 나도 더 크게 웃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가라앉고 끝까지 진이 빠졌다.
지난 달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파를 먹어보았다. 술 마시고 한 밤에 남의 집 담장 안의 비파나무에 손을 댔다. 살구빛으로 잘 익은 비파는 달디 달았다. 어제 산 살구는 빛깔 좋고 크기도 컸는데 단맛이 안들었다. 이 가뭄에 달지 않기도 어려웠을 텐데. 내 입맛이 까칠 했던 탓일까.
아침에 기사를 보니 요즘 내 증상이 화병과 같다.
욱하고 무기력하고 쩜쩜쩜
산딸기 사러 가고픈 걸 보면 무기력은 아니려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디를 검색해보니 100년 후에도 읽힐 유명한 한국단편소설도 있었다. 체리를 검색하니 가질수 없었던 치명적인 사랑 체리도 있고.
달고 굵어서 맛있는 체리는 큰나무에서 열린다. 아주아주 긴 장대가 필요한.
동네 사람들이 체리를 딸 때 지나가기만 해도 한 소쿠리씩 얻어 먹을 수 있었던 체리를 1키로에 만오천을 주고 샀지만 그 때만큼 맛있지 않았다.
산딸기. 체리. 살구. 비파. 좀 있다 무화과
이런 거나 먹으며 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