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를 바라보는 늙은 엄마와 20세를 갓 넘긴 청춘의 딸이 함께 여행할 때 여행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 게다가 늙은 엄마는 이미 여행지를 두어 차례 다녀갔던 곳이라면? 누가 가이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직업상 가이드가 아니라면 이전과 같은 여행지에서 경험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새로움으로 설레야 할 여행이 기존의 경혐으로 퇴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행지가 새롭지 않다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여행에서 매너리즘은 여행의 적이다.
그래서 딸에게 맡겼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두어 군데 - 큐 가든, 코톨드 미술관 등 - 를 빼곤 모두 딸 의향대로 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방법이 달라져서 결국 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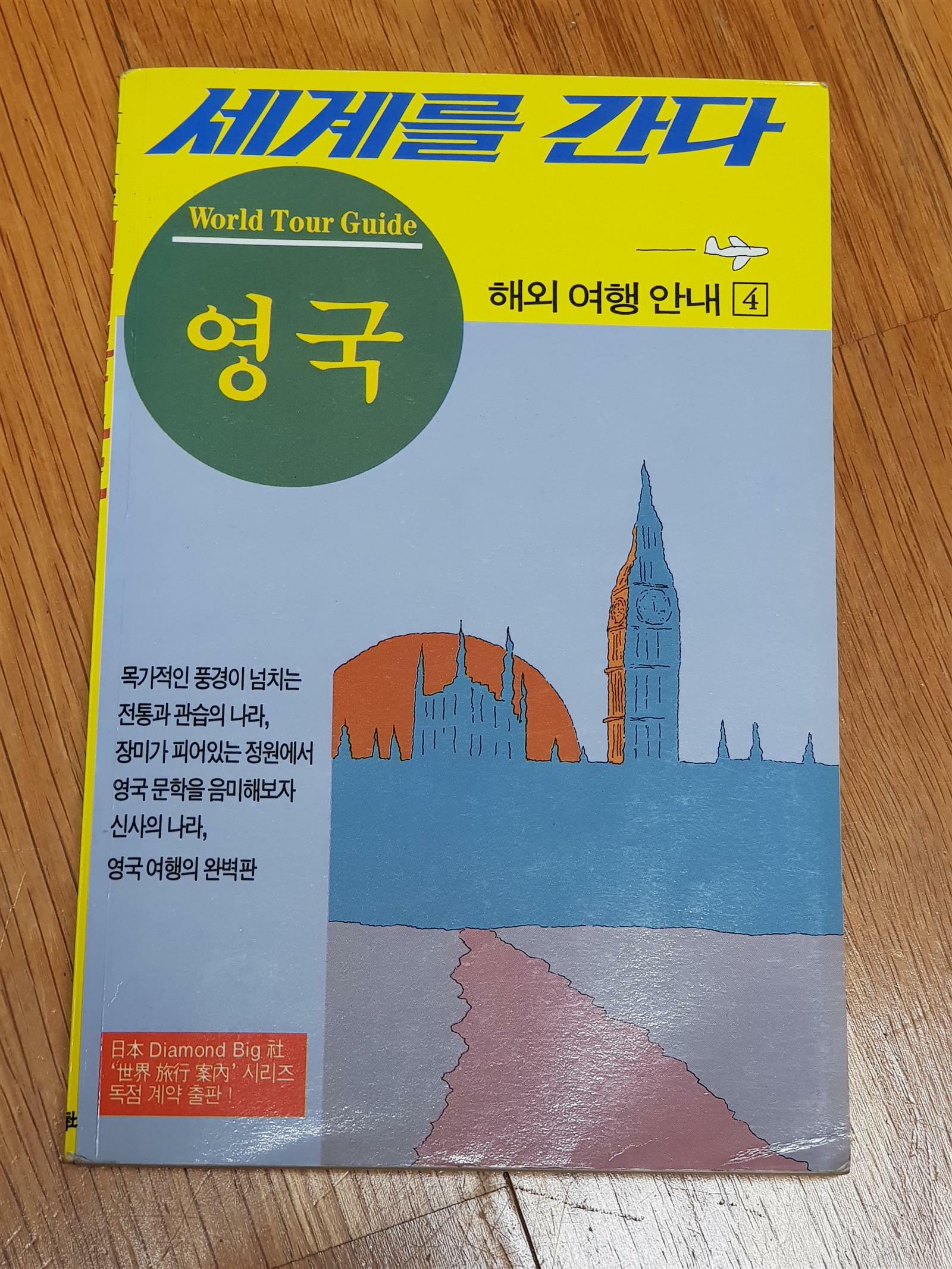
90년대 초중반에는 여행안내서라면 일본에서 나온 <세계를 간다> 시리즈가 거의 전부였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약 한 달 간 영국을 일주했다. 지도가 틀려서 숙소를 찾는데 고생한 적도 있지만 대충 이 책 한 권으로도 여행이 가능했다. 길을 헤매다가 모르면 입을 열어 "Excuse me~~~" 하면서 길을 물으면 백이면 구십 구 정도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흠,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가이북조차 필요없는 세대이다. 게다가 온갖 가이드북이 넘쳐난다. 가이드북을 두어 권 챙겨가지만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있나 알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 입을 열어 영어를 구사해볼 기회도 거의 없다.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지도앱이 깔끔하게 망설임없이 길을 안내해준다. 타고갈 대중교통 수단부터 몇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도 지시해준다. 얌전히 스마트폰만 따르면 된다. 영어?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듣기평가할 때마다 나오는 길 묻기 시험 문항은 그 존재여부를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도대체 입을 열어 길을 물을 기회가 없다. 써먹지도 못할 영어회화 몇마디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고급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체력이 왕성한 20대의 딸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신세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내게는 신선할 게 별로 없는 여행지를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딸의 시각에 기대어 짐짓 새로움을 탐할 수 있었으니까. 체력적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마담 투소 밀랍인형 박물관에서는 유명인과 나란히 포즈을 잡을 수 있다. 홍콩에도 이 박물관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코웃음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갈 곳도 많은데 굳이 그런 곳을...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상상 이상이었다. 아침 나절을 꼬박 이 박물관에서 보냈는데 유명인 밀랍 인형뿐만 아니라 4D로 상영되는 짤막한 스크린 애니메이션도 그럴 듯했다. 내게도 아직 동심이 남아있었다니... 여러모로 흥겨운 경험이었다.

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런 놀이기구를 타지 않았을 터이다. 입장료는 오죽이나 비싸던지. 이 런던아이와 마담 투소 입장권을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하는데 일인당 가격이 45파운드(약 7만 원)에 달한다. 그래도 일단 탑승해보니 세월이 저만치 뒤로 물러가버렸다. 딸은 10대로 나는 40대로. 그러면 됐지 뭐, 여행에서 뭘 더 큰 걸 바라나.


타워 브리지. 과거엔 저 다리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런던여행이 풍요로웠었는데 이번엔 아예 두 발로 꼭꼭 밟아가며 샅샅이 훑어버렸다. 모두 딸 덕분이다.

살짝 가슴 떨리는 척.
여행이 꼭 진지해질 필요 있나.
딸, 고마워.
잠시 나이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