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 엠 러브 - I am love
영화
평점 :

상영종료

밀라노의 명문 레키 가에 시집간 러시아인 엠마는 기품 있는 마님이라 할 수 있다.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엠마는 절제된 몸짓과 미소로 그 집안의 중심을 지켜주는 인물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래 보였을 뿐이다.

엠마라는 이름은 남편이 지어준 것이다. 그녀의 본명은 따로 있었다. 러시아에서 예술품 복원가였던 아버지 집에 드나들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예쁜 여자라며 지금의 엠마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사랑해서 그녀를 원했다기 보다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컬렉션으로 소유하듯 그녀를 들인 것이다. 낯선 이국 땅에서 고국이 그리워진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러시아식 수프를 끓였고, 아들 에두는 그 맑은 수프를 무척 좋아했다. 에두에게 있어서 그 수프는 어머니의 향기며 어머니의 사랑이고 가족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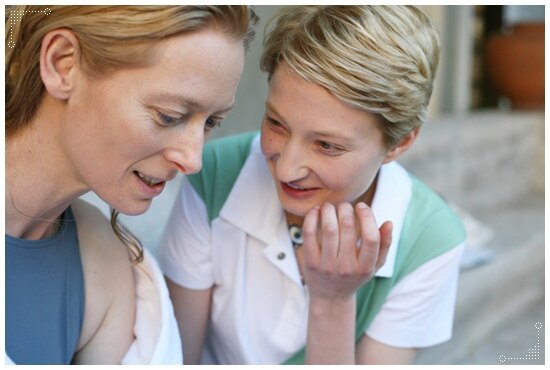
딸 베타는 여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남친과 헤어졌다. 베타는 오빠에게 먼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고 이어서 엄마에게도 제 사랑을 소개했다. 베타는 엄마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고 충분히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 엠마는, 어쩐지 그런 딸을 부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 솔직함과 당당함을, 그 용기를 말이다.
마치 조각상처럼 아름답고 걸치는 모든 게 명품이 되어버리는 자태를 갖고 있지만 그녀의 속사람은 헐벗은 채 떨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결핍을 채워준 것은 뜻밖에도 음식이었다. 아들 에두의 친구인 요리사 안토니오가 만든 새우가 들어간 요리 한 접시에서 그녀는 신세계를 만난 듯 전율했고 온 세상과 결별이라도 한 것인 양 홀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심지어 조명도 그녀만 비추고 함께 식사 중이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에두의 부인)는 어둡게 비췄다.
작품 속에서 안토니오는 자연과 본능을 대변했다. 엠마는 안토니오 앞에선 무장해제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것은 그녀가 속해 있는 레키 가의 반대쪽 같았다. 그와 눈빛을 마주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도 빛이 났다. 벌이 날아와도 내치지 않고 눈이 부셔도 햇볕을 가리지 않아도 될만큼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미련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에게 머리카락을 내맡기고 그가 싹뚝 잘라준 머리카락은 숲속의 엠마를 더욱 빛나게 했다.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드러진 보석이 없이도 충분히 반짝였던 엠마. 그 순간순간에 아들 생각은, 남편 생각은, 가문 생각은... 났을까? 가문까지야 생각하지 않아도 가족은 좀 생각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박제된 것 마냥 살아가던 그녀가, 마침내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 행복감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면,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영화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는 레키 가문이 속물 근성은 있을지언정 아주 위선에 가득한 집은 아니었다. 자식들도 비교적 반듯하게 자란 편이었고 그녀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안정감과 안전함이 때로 사람을 숨막히게도 만들지만, 그래도 온전히 그녀에게 이입되어 지지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밟혔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의도치 않았던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장례식을 치른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해야 했을까? 그날, 꼭 떠나야 했을까? 잘 모르겠다.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묻고 싶다. 그 순간에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른 여인이지 않았을까?
영화는 대사가 많지 않고 조금은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빛과 음악을 아주 잘 조합시켰다. 격정적으로 흐르던 음악은 때로 숨을 막히게 해서 엠마의 가파른 감정선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몹시 피곤해졌다.
엠마를 보면서 떠올리게 된 인물은 박범신의 '비즈니스'에 나오는 엄마였다. 그녀가 자식의 학원비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몸을 팔았던 것과는 동기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지만 마지막에 제 가정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닮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지지해주기 힘든 선택이었다. 남(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것도 마땅치 않은 거니까... 인간이 아무리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선택 앞에서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했던 게 아닐까?
영화의 제목이 아이 엠 러브. 이탈리아 원제도 나는 사랑이다-라고 검색 결과에서 봤다. 제목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 된다. 나는 사랑이다... 이때의 '나'는 대체 누구인 걸까? 엠마인 것일까, 아님 사랑 그 자체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주체와 객체 덕분인 것 같다. 사랑 그 자체는 맹목적이기 쉬우니까.
영화의 내용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영화를 참으로 매력적으로 만든 것은 주인공 틸다 스윈튼과 음악이었다. 틸다 스윈튼은 나니아 연대기에서 얼음여왕으로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차갑고 고고한 매력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난다. 1960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쉰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다. 키도 180으로 껑충 큰데 싱겁기는커녕 연기가 진국이다. 올란도는 영화로 보는 게 좋을까, 책으로 보는 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