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나의 봄에게
한섬 지음 / 꿈공장 플러스 / 2022년 3월
평점 :



시집을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결혼 전이다. 결혼식 식순에 축시를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읽었던가. 어쨌든 6년 만에 눈에 띈 시집이 바로 한섬 시인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나의 봄에게>다. 표지의 파란 하늘 아래 붉은 꽃을 보자마자 출산을 3주 앞둔 5월의 마지막 날, 저녁 산책길에 찍었던 붉은 장미가 떠올랐다. 내 추억을 떠오르게 해준, 손바닥만한 예쁜 시집을 고마운 마음으로 펼쳤다.

유치원에서 햇살반인 딸아이가 저자 소개의 '햇살'을 손으로 짚으며 읽는다. '햇살'을 닮은 사람이고 싶다는 시인은 왠지 따뜻한 사람일 것 같다. 목차를 보며 마음이 몽글몽글한 느낌이다. '오늘도 내일도 맑은 날에', '꽃빛이 쏟아지던 밤에', '벚꽃비가 흩날릴 때', '눈이 부신 그런 날들', '그리다, 별과 너를', '네가 반짝이던 겨울', '오늘을 걷다가 문득', '가보지도 않은 그날이 설렜다' 등 감성적이면서 예쁜 말들이 마음에 쏙 든다.
여유를 부리고 싶은 때에 조금씩 읽었다. 시를 읽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시를 읽을 때의 느낌이 느리게 나타났다. 산문이 아닌 운문에서 느껴지는 심오함이랄까. 예전이었으면 그냥 읽어내려갔을 텐데,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씩 해본다. 한섬 시인의 블로그 닉네임인 '해달별'을 제목으로 한 시는 한 번 더 읽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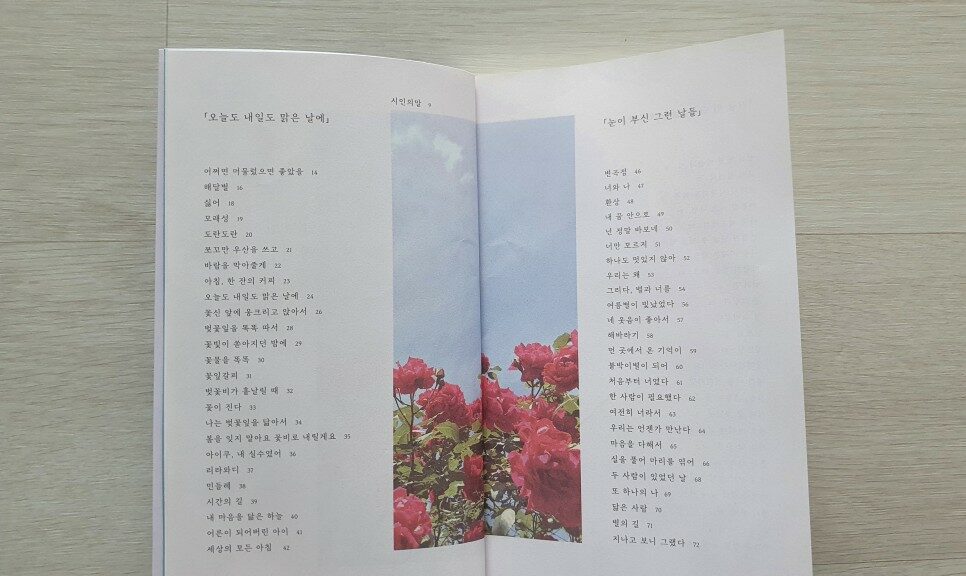
「오늘도 내일도 맑은 날에」 : '아프다, 슬프다'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다. 어린 시절의 내가 어른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시간들, 커피에서 나는 슬픔의 맛, 두고 온 마음, 그리움과 눈물, 세월의 흐름에 안쓰러운 마음, 무너져 내릴 듯한 하늘, 소리 없는 울음 등 내가 너무 감정이입해서 읽었나? 학생이던 시절의 옛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건 나뿐일까? 중간중간 「싫어」나 「아이쿠 내 실수였어」처럼 무겁지 않은 시도 나온다.
「눈이 부신 그런 날들」 : 내 세상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네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잊을 수 없는 너, 처음부터 너였고, 너만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옛사랑을 떠올리게끔 하는 시들이 가득하다.

「지금 이 순간, 삶은 흐른다」 : 지긋지긋한 하루, 너무 넓은 세상, 잃어버린 별을 찾아 헤매고, 비록 함께하지 않아도 기억만으로 함께하기.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날아올라, 살아 있음을 느끼고, 소중한 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자. 매 순간이 삶의 목적이라는, 마치 강의를 들은 기분이다.
「가 보지도 않은 그날이 설렜다」 : '설렘'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언제였던가. 눈에 밟히던 겨울꽃, 겨울이 보내준 인연, 기나긴 겨울밤, 놓아버리려던 매서운 겨울에 온기를 전해주던 인연.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때때로 찾아오는 휴식. 무거웠던 머리는 시를 읽으며 가벼워진 느낌이다.
마음에 와닿는 시가 몇 편 있어서 필사도 해보려고 한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나의 봄에게>, 제목도 표지 사진도 예쁜 시집을 따뜻한 봄날에 잘 읽었다. 봄에 태어난 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