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떻게 죽을 것인가 -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KBS 선정 도서
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죽음을 가까이 맞이한 시점에서 인간다운 마무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버드 의대 교수 아툴 가완디. 의사로 그리고 아들로 그가 겪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공부를 하며 생명을 구하는 방법만 배웠지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랐다는 저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용납하지 않는 현실의 괴리를 다양한 사례로 알려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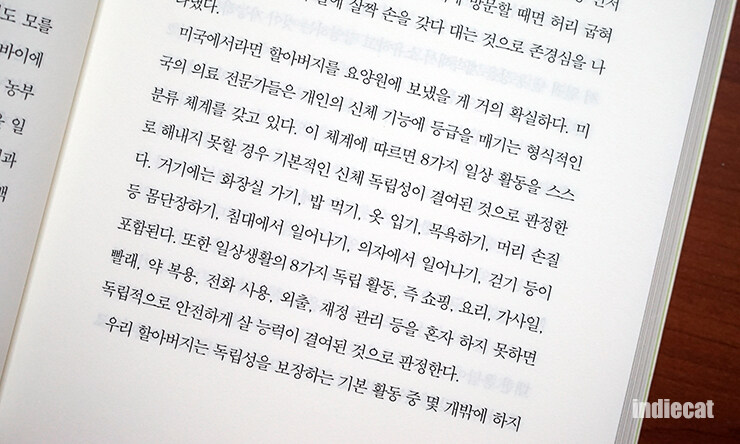
인간은 독립적인 자아라는 것이 삶에서 더욱 중요해졌는데, 질병이나 노환으로 더는 독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보다는 상당 시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보내는 노년 시기. 무엇보다 과학의 발전으로 나이 들어 죽어 가는 과정은 의료인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 노환 문제는 대부분 혼자 감당하거나 의사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변한 거지요.
하지만 저자는 정작 의학계는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환자는 물론 의료진조차 궁극적인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현실에 대처하도록 돕는 일이 안되어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의학은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노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대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 부자연스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p60

우리가 늙고 쇠약해져 더는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됐을 때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고생만 하지 않으면 되지'하며 단순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질병 없이 노환 그 자체만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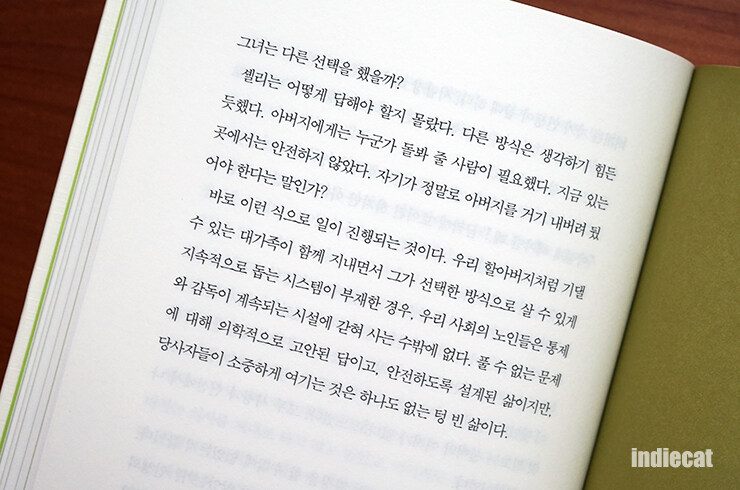
당연한 삶의 사이클을 거부하는 인간의 습성으로 봤을 때 연명치료냐 존엄한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해답은 없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자세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합니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답을 스스로 찾으려면 삶에는 끝이 있다는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부터 필요합니다. 존엄사 문제는 고통을 연장하는 실수와 가치 있는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실수 중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해요.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족과 대화하길 꺼리고, 본인도 준비 없이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미루기만 하지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많지만,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한 사회, 개인이 낳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처해 온 패턴을 보면, 노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병원 병실을 비우기 위해 시작된 요양원 개념처럼 그저 대안을 찾는 피상적인 결과가 대부분이고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정작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던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외롭지는 않은지 하는 것보다 약을 빼먹지 않았는지, 넘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만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 질병과 노화의 공포는 단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다. 그것은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 p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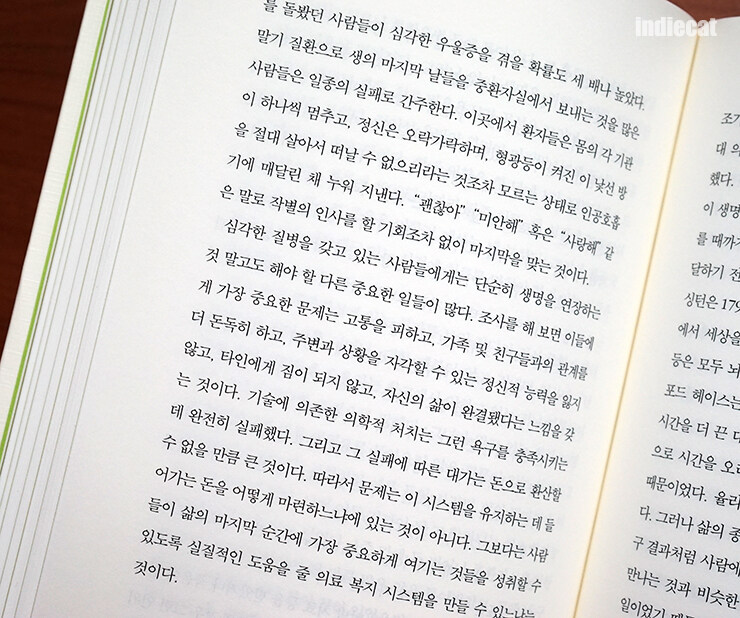
저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케어를 받길 원하는지에 대해 의사들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해요. 어떤 질병들은 더 오래 살려는 노력을 멈춰야만 더 오래 사는 (이 부분도 환자와 의사 간에 생각하는 기간 차이가 상당하더군요. 환자는 더 오래 산다고 하면 한 10년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몇 주, 몇 달 정도입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문화된 노인병 관리를 받을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더라는 사례를 통해 의사에게는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 - p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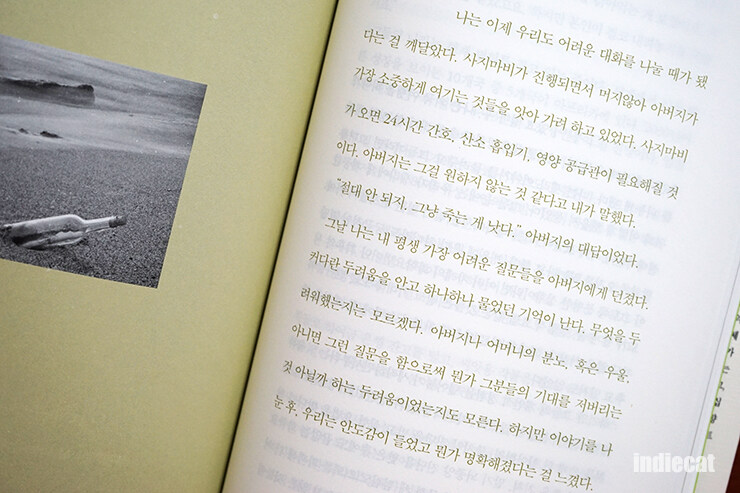
한 사람의 끝이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로 (가족) 넘어가는 시점이 옵니다. 저자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평소 이 부분에 관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면 결정을 하는 입장이 된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한 후회를 어떻게든 하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닌지, 괜한 욕심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하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다 보니 노령화에 적응하는 문제를 대면하는 것을 미루기만 하지요.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그걸 이뤄내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직관과 통찰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기에 어렵지만 직면해야 할 감정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이런 과정은 좋은 죽음을 위해서가 아닌 결국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묵직한 주제지만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더불어 노후 대책에 관한 고민도 절절히 다가오네요. 입 밖으로 꺼내기 껄끄롭다는 생각에 부모님과의 이런 대화를 은연중에 피하고 있었던 부분 역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바라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