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여름이었다. 친구와 나는 토요일에 만나 영화를 한 편 보았고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빌딩에 들어갔다. 전시회 이름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니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책들을 몇 권 팔고 있었다. 그중에 한 얇은 잡지에는 한 영화감독의 인터뷰가 실려있다고 되어있더라. 나야 관심없는 영화감독이었지만, 그 당시 내가 좋아하던 사람의 최애감독 아닌가. 나는 얼른 그 잡지를 사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친구와 좀 더 걷고 맥주를 마셨다. 맥주를 거의 다 마셔갈 때쯤, 문자메세지가 왔다. 내가 좋아하는 그였다. 그는 예정에도 없이 불쑥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갑자기 너무 신났다. 응, 갈게. 그렇게 답했다. 아니, 이건 무슨 일이지, 그를 생각하며 사둔 잡지가 가방 안에 있는데, 그런데 마침 오늘 볼 수 있다니!
나는 친구랑 헤어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그를 보러 갔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후훗, 그 때 나는 편하게 나오느라 슬리퍼 차림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에게로 가면서야 내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것을, 땅바닥에 철푸덕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아, 모르겠다. 에헤라디여~
나는 그를 만나 활짝 웃고는 마침 내가 너를 주려고 이걸 샀지 뭐야, 하며 내가 준비해간 잡지를 내밀었다. 그는 기쁘게 받아들었고, 우리는 맥주를 시켜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분 좋은 토요일이었고 기분 좋은 마무리였다.
며칠후, 나는 그에게 그 인터뷰를 읽어봤느냐 물었다. 그는 '아, 그 잡지의 존재를 잊고 있었네' 라고 답했다. 그 잡지의 표지에서 그 감독을 발견하고 기뻤던 것, 그 잡지를 집어들고 설레이며 계산했던 것, 이걸 그에게 줄 수 있어 신나했던 것 모두가, 그 대답 하나에 비틀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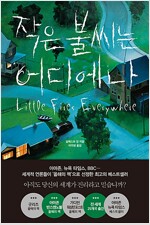
무디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펄에게 가장 실망했다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펄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트립을 택할 정도로 경박했다. 물론 펄이
자기를 택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자신은 여자아이들이 반할 유형이 아니었다. 하지만 트립이라니, 그 점은 용서할 수 없었다.
깊고 맑은 호수로 알고 뛰어들었다가 그것이 무릎까지 차는 얕은 연못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 그래,
일어섰다. 진흙이 묻은 무릎을 씻고 진창에서 발을 빼냈다. 그 뒤에는 더욱 조심했다. 그때부터 무디는 세상이 예상보다 작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대수학
수업 중에 펄이 화장실에 가자 무디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펄의 책가방을 열고 몇 달 전에 자신이 펄에게 준 조그마한
검은색 몰스킨 수첩을 꺼냈다. 의심했던 대로 책등은 갈라진 자국 없이 말짱했다. 그날 저녁, 무디는 방에서 홀로 수첩을 한 움큼씩
찢어내 꼬깃꼬깃 구긴 다음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휴지통이 구겨진 종이로 수북해지자 무디는-옥수숫대에서 벗겨낸 겉껍질처럼 이제
속이 텅 비어 축 늘어진-수첩의 가죽 표지를 맨 위에 떨어뜨리고는 휴지통을 발로 차 책상 밑으로 집어넣었다. 펄은 수첩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했는데, 왠지 그것이 무디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p.407)
무디는 펄이 항상 글을 쓴다는 걸 알고, 몰스킨 수첩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펄에게 그걸 선물했다. 그러나 펄은 무디가 아닌 무디의 형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무디는 자신의 형이 완전 형편없는 놈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펄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펄의 가방에서 자신이 준 몰스킨을 다시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아프게도, 펄은 그 수첩이 없어졌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했다.
어제 가만가만한 요가가 끝나고 매트에 누워 송장자세를 취하면서 아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파고들었다. 행복하네, 요즘엔 요가가 이런 행복을 줘, 하다가 그 여름날의 토요일 오후가 떠올랐다. 그래 그랬었지, 하고 좋고 설렜던 기억들과 그 날의 햇빛이 떠오르다가, 그러다 며칠 후 그가 내가 준 잡지의 존재조차 몰랐었다는 걸 떠올리자 조금 슬퍼졌다. 조금.
그리고 이내 괜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