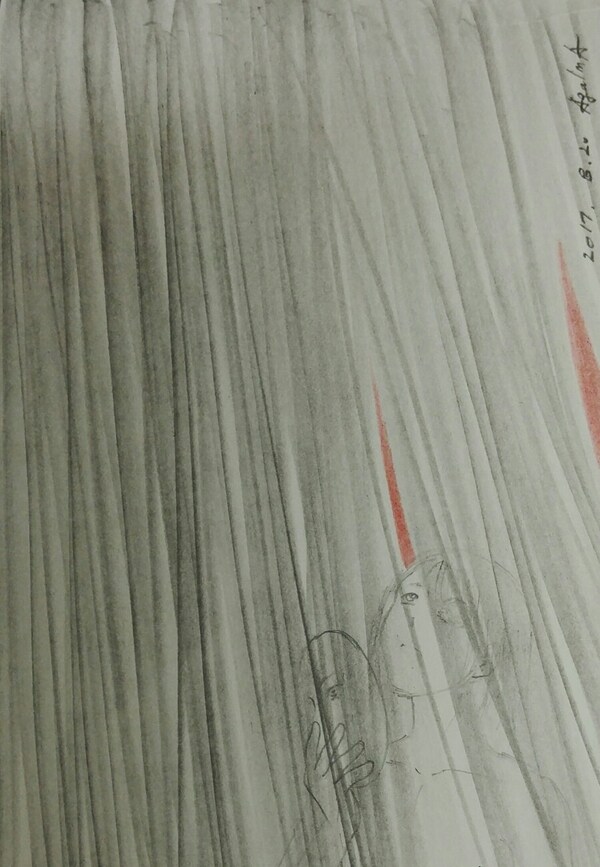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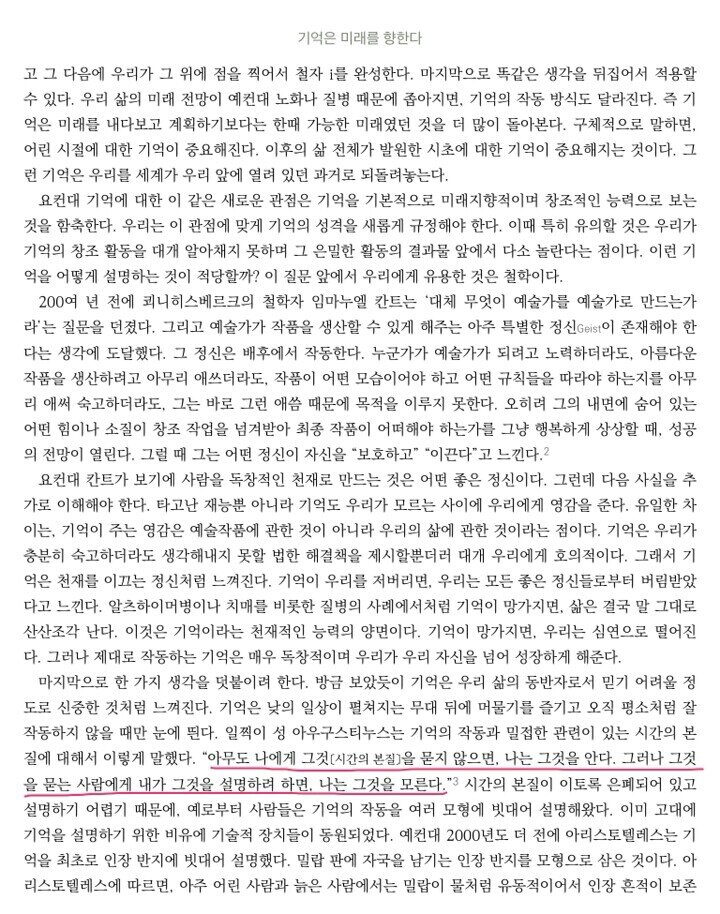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시간의 본질]을 묻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나는 그것을 모른다.˝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시간의 본질]을 묻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나는 그것을 모른다.˝
ㅡ한나 모니어, 마르틴 게스만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관련해 시 한 수...

벌레의 별
사람들이 방안에 모여 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으로 나와서 풀줄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를 구경했다
까만 벌레의 눈에 별들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나는 벌레를 방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어느새 별들은 사라지고
벌레의 눈에 방안의 전등불만 비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벌레를 풀섶으로 데려다 주었다
별들이 일제히 벌레의 몸 안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ㅡ 류시화
기억은 은폐자인가 신중한 유보자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비만큼 취약하다. 광유전학(세포들을 유전학적으로 변화시켜서 그것들이 빛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를 전이하는 실험에 이미 성공했다. 공포가 가장 만들기 쉬운 지 모른다.
내 그림의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켜지지 않는다 해도 공포와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기억은 다른 환영의 길을 어떻게든 만들겠지. 저자들은 기억이 과거 보관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작동 스위치라고 말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기억 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설득력 있다. 그러나 문을 열면 불이 켜지며 내용물이 보이는 ‘냉장고‘ 비유는 적절한가. 기억이 전기적 활동으로 움직인다는 데서 냉장고를 가져온 건 알겠는데 냉장고에 보관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잖나. 화려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비유도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허점이 발생한다. 자체 허점뿐 아니라 타인의 에토스와 파토스가 그에 상응하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간극을 메우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실과 객관을 그토록 강조하지. 문학과 예술이 자유를 부르짖는 건 이런 맥락도 작용한다.
 「흑인 오르페」를 들을 때마다 자극받는데 (영화, 음악, 개인적) 기억과 연관되는지 감정에 기인하는지 모호하다. 당연히 다층적이겠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서 작동하고 겪고 있다. 하여 나 자신에게 늘 이물감을 느낀다. 기쁨은 외부에서만 오는 선물 같고 고통은 너무도 꼭 맞는 슈트 같은 것도 우습다. 터무니없는 일 투성이.
「흑인 오르페」를 들을 때마다 자극받는데 (영화, 음악, 개인적) 기억과 연관되는지 감정에 기인하는지 모호하다. 당연히 다층적이겠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서 작동하고 겪고 있다. 하여 나 자신에게 늘 이물감을 느낀다. 기쁨은 외부에서만 오는 선물 같고 고통은 너무도 꼭 맞는 슈트 같은 것도 우습다. 터무니없는 일 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