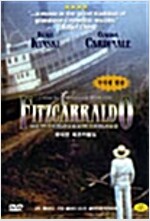˝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로는 버펄로보다 가이거계수기가 훨씬 정확하다˝
(리언 레더먼, 딕 테레시 《신의 입자》 중)
《컨택트》 영화에서 헵타포드 우주선에 갈 때 방사능을 두려워해 카나리아를 가지고 간 장면은 하나의 미장센이기도 하지만(고요 속 새 울음소리!) 아날로그성, 생물성을 더 우위에 두는 인간 습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의심과도 연결할 수 있다. 수학, 물리학 등에 사람들이 어려움 내지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도 유사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어려운 계산적 수치보다 기존의 양상 - 경험, 물질적 결과를 더 선호한다. 신뢰가 선호에 끌려다니는 건 늘 안타까운 일이지. 기계의 오류, 한계를 늘 지적해왔지만 알파고 능력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기 시작했다. 급속히 데이터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도 인간은 언제나 마지노선을 가지고 싶어 하지. 마지막 마지노선이 늘 자신이라는 걸 잊고서. 안 보이는 신을 믿듯이. 신의 유무에 대한 인식은 과학자들이 끝없이 원자를 깨고 들어가듯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깰 때 가능할 것이다. 니체는 19세기 식으로 깨려 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식은 다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적어도 인문학자는 아닌 거 같다. 21세기 방식은 누구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궁금하다.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 키가 198센티미터였다니... 왜 그림들은 그를 왜소하게 그렸단 생각이 들지. 워싱턴 링컨 기념관의 링컨 동상이 거대해 보여도 198센티미터면 업적이 아니어도 수긍할 만하다!
《신의 입자》 읽으면서 나는 이런저런 딴 생각 순환선... 갈 길이 멀군.
하지만 전자기학(전자)과 상대성이론(빛의 속도), 양자역학(플랑크상수)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미세구조상수‘ 137 하나는 잊지 않게 배웠다. 저자는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137이라고 쓴 푯말을 들고 있으면 물리학자나 물리학 학생들이 이 중요한 숫자를 알아보고 도와줄 거라고 말한다.
너무 오지에 가면 소용없을 텐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숫자 표기를 알아볼까 싶지만; 137이 666처럼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원시 부족을 만나면 어뜩해! 헤이조그 영화 《피츠카랄도》 생각나네. 피츠카랄도의 하얀 증기선을 부족의 구원자로 예언된 하얀 신의 모습이라 생각해 부족이 배가 밀림을 통과하도록 온갖 희생을 감수했던 이야기가. 믿음, 인간의 심리 작용은 우릴 너무 쉽게 움직인다. 그러니 자유의지도 늘 의심스럽지. 배움, 앎 또한 인간의 집단 최면 작용이라면? 인간 종은 세상에 불가해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 같다. 암튼 또 신 얘기. 무슨 얘기만 하면 신 얘기로 도돌이표...빌어먹을 입자(Goddamn Particle)에서 damn을 빼면 쉽게 신의 입자(God Particle)가 되지만, 신 얘기는 신나는 얘기는 아니지. 어쩌면 질소만 가득한 과자봉지 같을 수도 있다는.... 이 과자가 네 고..아니 과자냐. 산신령을 등장시키지만 산신령을 갖거나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과연 도끼를 얻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