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껍질을 깐다.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먹거나 부패할 때까지 놔두거나 끝내는 망가뜨리는 쪽으로.
무엇이 됐든 귤은 영구히 훼손된다. 돌이킬 수 없다.
내 살은 가끔 추악한 형태로 일그러진다. 면역력 저하.
그게 아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
귤은 내게 기증된 게 아니다. 내겐 아직 기증할 선택권이 있다. 물론 죽어서.
살아서 자신을 기증하는 귀의(歸依). 그 의미를 자주 오래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나는 너무 일찍 죽음을 맛보아서 삶에 큰 의지가 없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혼날 소리지) 내 삶은 죽은 나무 같은 것이다. 내가 있기에 가지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 있기에 가지는 의지들이다. 죽었는데 계속 죽는다. 신경적 반응은 살아 있는 거지. 한순간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삶의 전쟁을 치르고 또 치른다. 삶 어딘가에 풀어보지 않은 선물 꾸러미가 있다는 듯 돌아다닌다. 열어보면 다 판도라 상자 같은 게 되는데도. 여기서 희망, 저기서 희망 조금씩 모아 살아간다.

그것은 《토리노의 말》에서 나오는 ˝감자˝ 같은 것이지 나날의 방문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힘겹게 키우고 얻은 감자. 뜨거울 때 살살 껍질을 까서 먹던 일도 결국엔 먹고 싶지 않아진다. 그날 단 하나의 식량인데도. 오, 삶이여.

《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알렉스는 악(惡)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현혹되고 행한 자가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호기롭게 말하지만, 자신을 누르는 더 큰 악을 만나기 전의 순진한 소리다. 인간은 늘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고단수들은 자신에게 칼날이 돌아오지 않도록 주도면밀하며 더 잔혹하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좀 평범한 말이긴 하다. 인간이 구성하고 구사하는 소소한 악의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매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인다. 폭력의 흡인력.
근절할 수 없기에 더 철저히 대결하거나 포섭하거나 외면하거나 어느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갖은 언어로 제압해 보려 하지만 현실 속 힘의 움직임들은 항상 그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 언어는 언제나 늦다. 설명할 말이 있어야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설픈 그물을 던져 잡아 보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언어는 자체 가면을 쓸 뿐만 아니라, 쓰는 자의 주술 속에 상대에게 던져지기도 한다. 언어를 쓰는 상당수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게 뭘 뜻하는지, 상대에게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말을 한다. 말에 뜻을 품은들 그 말의 진의을 깨닫는 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
법과 무질서, 선과 악, 전쟁과 평화는 이분법적인 대립항이 아니다. 짝을 이뤄 순환할 뿐.
자유의지....욕망과 목적의식이 소용돌이치며 섞이는 장(場)
시계태엽이 외부의 작동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부에도 있으니까. 앤서니 버지스는 2차 대전에 참전까지 했지만 인간 내부 극한까지 내려가보고 글을 쓴 게 아닌 것 같은 인상이다. 최소한 사드보다는 덜했다.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은 3부의 도덕적인 결말을 과감히 잘라 버렸으리라. 소설이 나왔던 62년도엔 수긍할만 했을지 모르지만 71년도엔 유효 상실로 보였을 테니까. 소설이 나온 뒤 스탠리 큐브릭은 베트남 전쟁도 보지 않았던가.
어쨌거나 인간이 오렌지 같은 구석이 있다는 덴 동의. 바보 같고 향기로우면서 무엇이든 상상해 넣을 수 있다.
그러고보니 《
오렌지 기하학》 함기석 시인의 말이 여기 어울릴지도.
[시인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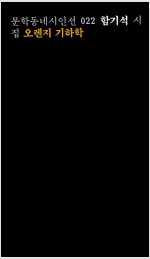
코흐곡선 해안을 걷고 있다
벼랑 끝 하늘로 물고기들은 헤엄쳐 오르고
죽은 자들의 숨이고 육체였던 저 투명한 대기 속에서
빛이 제 눈을 검게 태우고 있다
제로(0)인 너와
제로(0)인 내가 만나
무한(∞)이 되었다가 더 큰 제로(0)로 되돌아가는
아름답고 비정한 원(Circle)의 우주
그것이 그대로 삶이고 죽음이고 사랑인 시
세계는
제로(0)와 무한(∞) 사이에서 녹고 있는 눈사람(8)
자신의 부재를 자신의 몸 전체로 목격하고 기억하기 위해
눈동자부터 녹아내리는
진행형 물질
우린, 죽음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2012년 6월, 함기석
<오렌지 기하학>은 내겐 그리 신선한 오렌지들로 보이진 않았지만, 누구든 오렌지를 키울 순 있지.
암튼 가능하다면 모든 걸 멈추고 싶다. ˝칼 탄 우유˝ 마시듯 가볍진 않겠지.
이 카운트다운이 언제 끝날지 나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