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낯선 곳에선 풍경, 그 중에서도 하늘이 단연 돋보인다.
그리고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유혹적인 건 적막(寂寞)이다.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벽이면 벽대로, 바람이면 바람대로.
움직임은 붓질처럼 가볍게 머물렀다 다음 약속도 없이 사라진다.
끝없이 달라진다고 말할 때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그 점에서 결정적으로 자신 없다.
풍경 안, 순간 속에서만 확신한다. 곧 사라질 것이란 믿음.
가만히 주시하고 있을 때 나는 잠시 동물이 된다.
이를테면 어느 해 내가 기르던 토끼나 개, 날다람쥐의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죽음을 생각한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미셸 우엘벡 『소립자』의 엔딩과 『지도와 영토』에서의 제드 마르탱의 최후는, 내게 비트겐슈타인이 말년에 홀로 서성여야만 했던 북유럽의 외딴 풍경과 오버랩이 된다.
우리가 최후에 원하게 되는 적막은 진화적인 도태 결과인가, 자유 의지인가.
내 궁금증은 언제나 무용하다.
서울에 도착하며 처음 눈에 띈 것은 어떤 현수막이었다.
“실종된 송ㅇㅇ를 찾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상징이다.
우리가 원하던 상태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정확히 무엇을 깨길 원하는 걸까.
가능(可能)은 삶 보다 소멸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의미가 더 잘 보인다.
두 권의 책 앞에서 나는 또 망연하다.
ㅡAgal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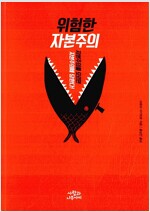
※
앞으론 제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해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