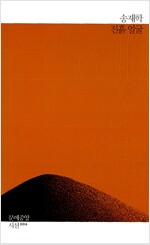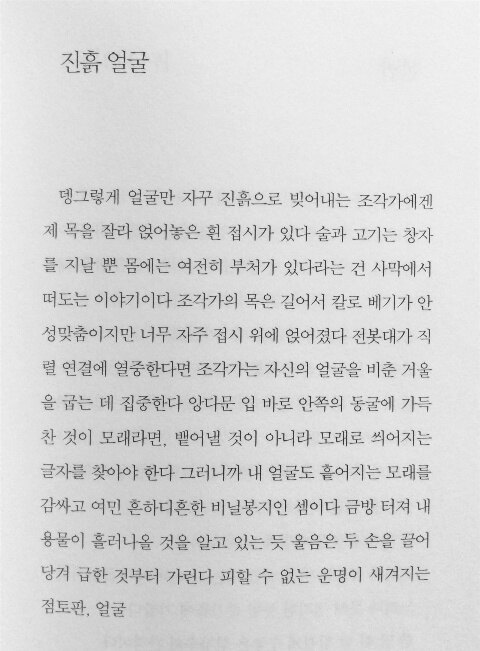§
한때 시에서 자연과의 비유가 지긋지긋했다.
다시 읽으며 ‘전봇대와 모래’가 유독 눈에 뜨인다. 그것은 마치 뼈와 피처럼. ‘덩쿨’은 살점 정도 되려나. 인간이라는 상징 ‘진흙’과 나라는 표상 ‘얼굴’의 조합인 이 시집의 제목이 이미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다.
철학의 생성논리나 과학의 사실근거보다 이런 언어의 은유가 더 와 닿을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우리 자체가 이미 담지체이자 탐지자인데. 언어는 급기야 버려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자유라고, 지금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 지금 불가피하게 거듭 서성인다.
내가 자연 속으로 돌아갈 시계 초침 같은 것들, ‘달라붙는’ 진눈깨비, 벚꽃, 벌레들, 나를 두려워하며.
ㅡAgal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