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로서는 드문 숏컷 머리, 커다란 눈,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의 여자아이가 교탁 앞에 초임 교사였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서 있던 그 날은 생생히 기억에 아로새겨져 있다. 아이들은 술렁거렸다. 그 아이는 특별했고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같다. 우리 모두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때로는 선망하고 질투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 책의 도입부를 읽었을 때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특별함을 가진 아이의 등장. 그리고 내 삶으로의 진입. 그 이전과 이후는 결코 같아질 수 없다. 내가 형언하기 힘들었던 그 막연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말로 풀어지는 느낌은 신비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것이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곳을 들킨 기분.
소년 들의 우정이 속된 말로 박살 났을 때 나도 그 아이와 숱한 우정의 위기를 넘기며 그 눈부신 시절을 함께 하다 결국 맥없이 그 아이와 특별할 것도 없는 어긋남을 경험해야 했을 때의 그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이 이야기의 견인은 시종일관 2차 세계대전을 둘러 싼 역사적 상황이지만 그런 구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지 않아 인상적이다. 결국 누구나 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 모두가 통과한 그 아픈 성장통의 지점이 영롱하게 형상화되어 있어 도저히 슬퍼하지 않고는 들을 도리가 없는 이야기들이 흩어져 기다리고 있다.


관계라는 건 참 묘해서 어떤 언어의 구획 안으로 다 우겨 넣을 수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의 그녀와 빌의 관계가 그렇다. 빌은 남자다. 그녀는 여자다. 그녀는 결혼했고 빌은 아직이다. 실험실을 만들고 유지하고 때로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녀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기도 하는 빌과의 관계는 그녀 자신의 고백처럼 세상의 관습이나 통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족과 함께 행복해도 어느 한켠에서 외로운 빌을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은 아프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자가 되는 과정에서 빌을 얘기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설명해 낼 도리가 없다. 모두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학자로서의 그녀보다 그런 평범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질곡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녀가 더 와닿았다. 과학은 때로 명쾌하지만 인간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묘미가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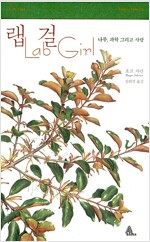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때로는 덧없는 인간 관계들이 과연 내가 죽고 남길 사물들보다 강할까? 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