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0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완서 선생님의 부고를 핸드폰으로 확인했던 그 날 아침이 또렷이 기억난다. 그 날은 2011년 1월 21일, 아이를 가지고 낳고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도 울며 엄마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키워냈던 집을 마음의 준비없이 떠나야 했던 날이었다. 당연히 내 소유의 집이 아니니 여러가지로 사정이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떠나야 하는 집이었지만 추운 겨울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마음은 참 시렸다. 아침부터 눈이 흩날렸고 이삿짐을 열심히 옮기는 인부들 옆에서 왠지 내가 걸리적거리는 것만 같아서 괜히 어슬렁거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써낸 전부를 읽고 싶었던 마치 나의 지인 같았던 작가의 부고를 들었다. 바깥에 흩날리는 눈발과 아이가 기어다녔던 방이 휑뎅그렁하게 비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분과의 작별. 작가와 독자의 이별은 만남만큼 큰 파란이다. 읽어내는 이야기들은 일종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텍스트 안에서 읽는 이들의 삶 속으로 물처럼 흘러간다. 그러니 작가의 죽음만큼 슬픈 작별은 없다.
전쟁이 남긴 상흔, 소소한 일상, 지인들과의 추억담이 역시나 소담한 그 분의 손 안에 담긴 따뜻한 밥처럼 다가온다. 예전에 들은 것도 같고 내가 짐작하기도 했던 이야기들도 언제나 새롭고 다감하게 들리는 것도 그 분만의 저력이리라.
아무리 어두운 기억도 세월이 연마한 고통에는 광채가 따르는 법이다. 또한 행복의 절정처럼 빛나는 순간도 그걸 예비한 건 불길한 운명이었다는 게 빤히 보여 소스라치게 되는 것도 묵은 사진첩을 이르집기 두려운 까닭이다.
-<내 기억의 창고> 중
나이가 듦은 기억과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어떤 어두운 기억도 세월은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원만하게 깎아 버린다. 찬란한 환희의 그 빛나던 모습도 세월의 무게 속에서는 적절하게 빛이 바랜다. 그러고 보면 오늘 밑에 가라앉는 어제들은 다 하향 평준화되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기다리게 되나 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찬란하기를 고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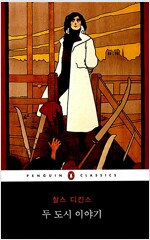
솔직히 무엇에 관한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는 유명한 초입부에 역시 감탄하며 줄을 긋고 과연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며 출발했다.
프랑스 혁명기,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진자처럼 왕복하며 진행되는 이야기는 기막히게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는 기묘한 흡인력을 자랑했다.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찰스 디킨스의 다른 작품이라고는 그 지독한 스쿠르지 영감 얘기 정도를 접해 본 나로서는 이래서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에 절로 고개를 주억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프랑스 혁명이라면 고등학교 때 지엽적인 연대기 정도로 달달 외우고 마감했던 기억이 전부였다. 혁명이라니 용기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손에 권력이 이양되었으니 바람직한 역사의 격변이었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하늘과 땅만큼 먼 간극 속에 대치한 두 인간 군상은 찰스 디킨스 앞에서 가차없이 발가벗겨진다.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을 낳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게 해서 우리처럼 비참한 생명이 아예 멸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절규했던 아버지를 둔 사람들, 단지 귀족의 태생이라는 것만으로 기요틴에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결국 다 같은 고뇌에 찬 인간들이다. 복수심에 불타 이미 혁명 자체의 명분도 취지도 망각한 채 집단 살육에 이성을 잃은 '애국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거친 사내의 희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찰스 디킨스의 펜은 오히려 가혹하게 느껴진다. 결국 그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희망 그 자체를 조롱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언가 미진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제대로 <두 도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증일런지도 모른다. 이야기만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시대의 여명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의 가차없는 뒷골목을 헤매다 결국 집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진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