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래는 주간 문학동네(http://www.weeklymunhak.com/)에서 읽은 문유석 작가의 글에서 『사람, 장소, 환대』가 떠올라 사형 제도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 같은 걸 정리해보고자 했으나(정확히 말하면 체사레 베카리아의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문유석 작가의 반박), 읽고 있는 책들에 치여 이미 읽은 책을 뒤적일 시간이 충분치 않아 잠시 미뤄두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한 것은 사형 제도보다는 훨씬 가벼운... 내 밑줄긋기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소고(小考)이다.


학생 시절의 나는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어서,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언제부터 책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군 제대 이후로 추정된다), 확실한 건 그 시작은 밑줄이 아니라 책 한 귀퉁이를 접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뒷표지에 실린 김연수 작가의 추천사에 쓰인 한 단어, "도그지어"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점이다(지금 생각하면 왜 '독스이어'가 아니라 '도그지어'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작은 가벼웠으나 어느새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접기에 밑줄긋기를 추가했는데, 이때 내가 애용한 것은 스테들러의 주황색 형광 색연필이었다. 그렇게 접기+밑줄긋기+중요한 부분은 포스트잇 종이 플래그에 메모 후 붙이기로 정착하는 듯 했으나, 너무 많이 접다보니 책 아래 두께가 늘어나 책이 잘 꽂히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했고, 이후 접기는 더이상 하지 않은 채 포스트잇 스티커 플래그+색연필로 밑줄긋기로 단순화되었다. 현재는 가끔 중고로 되팔고 싶은 책을 넘길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밑줄긋기는 웬만해선 하지 않으며 긋더라도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한다.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만 밑줄을 긋는 양이 간소화되고 있는지는...
오프라인으로 밑줄을 긋는 건 이러한데, 온라인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다른 문제다. 살고 있는 공간이 넓지 않아 책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입장(비율로 따지면 내 집에 30%, 부모님 집에 70% 정도가 있다)에선 생각나는 책의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알라딘에 끄적이기 시작하면서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싶다는 욕구도 한몫을 했으리라. 처음에는 책을 다 읽고 그었던 밑줄을 모두 한글 문서로 타이핑하는 방법을 썼으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눈을 돌린 것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밑줄긋기 앱들이었다.
(주의: 여기서부터는 앱들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특정 앱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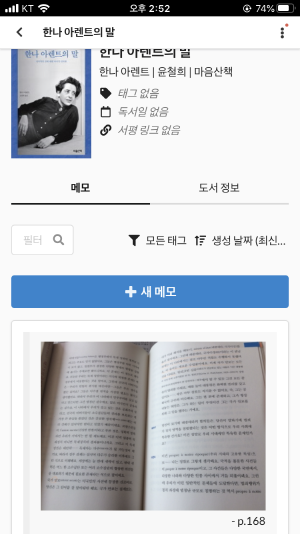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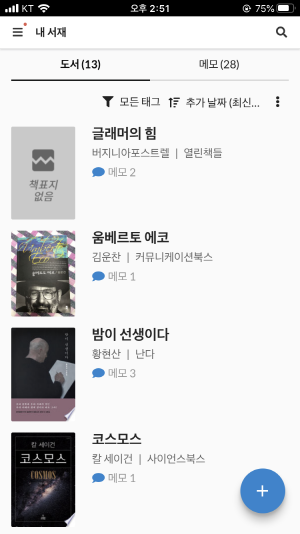
처음으로 내가 사용한 것은 '리드그라피(Readgraphy)'라는 앱이었다. 지금은 거의 들어가보지 않지만 남겨놓은 메모가 아까워 지우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내가 처음 메모를 남긴 것은 3년 전(『한나 아렌트의 말』이 최초의 기록인데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온다)이었다. 당시에 사용할 때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현재 얼리버드로 유료 회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앱이 여러모로 나와 맞지 않았다. 앱으로 밑줄을 긋는 것도 다 읽은 뒤 한 번에 하려니 일일이 책을 쫙 펴서 찍는 것도 일이었거니와(따라서 메모 하나에 모든 밑줄이 다 들어갔다), 당시에는 따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도 없었고 내용 검색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페이지순으로 정렬할 수가 없었고(이 역시 내가 못 찾은 건지는 알 수 없다. 3년 전의 내가 더 기계치였으므로), 책들의 서지사항이 잘 검색되지 않았다. 사진에 나온 『움베르토 에코』는 당시에 검색이 되지 않아 내가 직접 입력하고 표지를 찍은 것이며, 『글래머의 힘』은 표지가 검색되지 않아 그냥 둔 것이다. 아무튼 당시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곧 책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줄 수 있는 앱을 찾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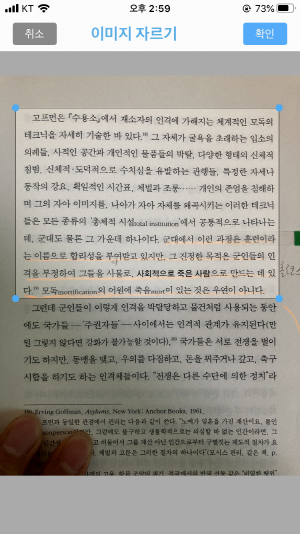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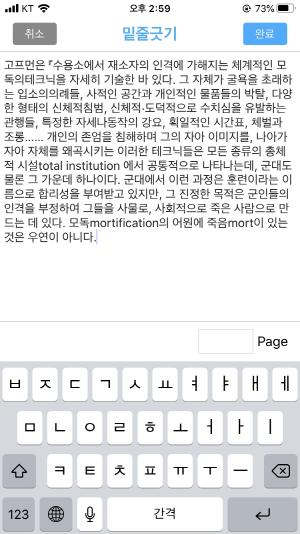
중간에 MS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한 적이 있으나(PDF 문서를 워드로 변환하는 것이었는데, Office Lens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텍스트 변환을 했을 때 외계어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금방 지웠고, 그 후 가장 오랫동안 애용하던 것은 북플 앱의 사진으로 밑줄긋기 기능이었다.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사진 속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주고(알파벳 포함), 컴퓨터로 알라딘서재에 쓸 때와 달리 밑줄의 분량에 제한이 없으며(나는 한 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까지 하나의 밑줄로 기록한 적도 있다), 내가 글을 쓰는 알라딘서재에 기록이 남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내가 매번 교정을 해야 했는데, 특히 띄어쓰기에 가장 많은 오류가 났고 'ㅙ'나 'ㅖ'와 같은 이중 모음이나 잘 쓰지 않는 단어는 자주 오타가 났다(사진의 예시는 굉장히 잘 된 경우이다). 이걸 일일이 교정하면서 올리면 타이핑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가 났다. 대략 200~300페이지의 책을 읽은 뒤 밑줄을 모두 옮기는 데 1~2시간 가량이 걸렸으니까. 또한 알라딘서재에 게시글의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밑줄긋기를 하면 한 권의 책에 대한 기록이 중구난방으로 남으므로, 다 읽은 뒤에 한 번에 긋다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렸다(내가 독보적 서비스로 밑줄을 긋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때나 밑줄을 그어도 책별로 모아주면서, 페이지 순으로 정리해주고 핵심어별로 정리할 수 있는 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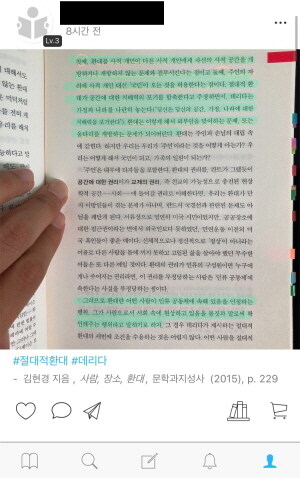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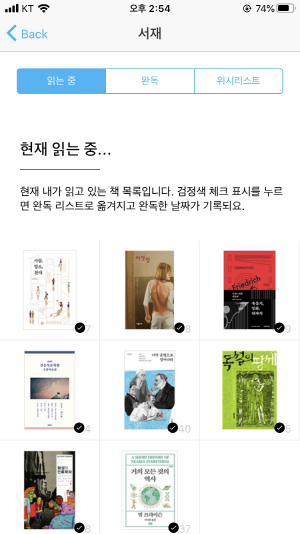
'하이라이트'라는 앱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독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후기를 보고, 새로운 밑줄긋기 앱인가 싶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용한 바를 토대로 이야기해보면, 밑줄긋기의 인스타그램 같다는 느낌을 준다. 책의 서지사항은 바코드만 잘 인식시키면 제대로 찾아내며, 내가 읽을 때마다 매번 찍은 내용을 책별로 분류해주고(세번째 사진의 체크박스 옆에는 내가 기록한 메모의 숫자가 쓰여 있다), 입력할 때 해시태그를 넣으면 해시태그별로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읽으면서 수시로 사진을 찍어 올려도 분류가 잘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만족하며 사용하는 중이다. 다만 여기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새로 태그를 넣으려고 수정을 하면 책이 최근에 글을 올린 책으로 바뀌어 수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올린 게시물의 사진을 저장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시태그 외에 책 속 내용으로 검색이 되는 건 아니어서 해시태그를 잘 입력해놓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구절로 검색을 할 수 있으려면 현재로서는 에버노트 프리미엄 말고는 방법이 없는 듯하다. 난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아직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블로그나 기사 등을 스크랩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다..

정리하고 보니 밑줄을 긋지 않던 내가 이렇게 수없이 밑줄을 긋고 그것을 텍스트화하려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기억력의 감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어릴 때 읽었던 책은 여전히 그때의 느낌이나 줄거리도 생생한데, 날이 갈수록 최근에 읽은 책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놀라면서 말이다. 나의 감정, 사고, 지식의 폭을 넓혀준 책들을 계속 기억하고 싶다는 욕망이 저장에 대한 욕망을 촉진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다는 욕망만큼이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망각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망각하고 싶은 것만 버리고 책에 대한 기억은 끌어안은 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