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요즘 읽고 있는 황정은의 『일기』 중 「민요상 책꽂이」에는 책갈피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한다. "도톰한 집게 모양의 책갈피나 복잡한 형태로 종이를 깨무는 클립 책갈피는 도대체 뭐하자는 사물인지 모르겠다. 그걸 종이에 끼우고, 끼우는 단계에서 이미 종이가 구겨지거나 하는데, 책을 덮으면 책 무게에 눌려 책갈피에 물린 종이가 꼬집힌 것처럼 구겨지고 앞뒤 종이에도 집게나 클립 모양으로 자국이 남는다. 오래두지 말고 얼른 독서를 끝내면 될 일이지만 독서는 중단될 때가 많다."(82쪽)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내가 쓰고 있던 책갈피를 보았다. 이번 신간을 구매하면서 굿즈로 함께 판매하던(증정이 아니다. 마일리지를 내야 하니까) 소위 팝업 책갈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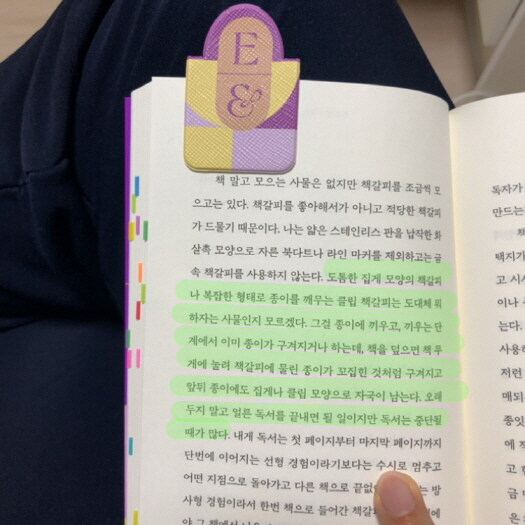
나도 금속 책갈피나 클립형 책갈피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구입(그렇다. 마일리지를 냈으니까)한 것이었다. 『일기』의 색깔과 맞기도 하고. 몇 차례 사용한 뒤 내가 얻은 결론은 '역시 못 쓰겠다.'는 것이었다. 자석으로 책장을 집는 구조인데 이미 고무자석부터 두껍고, 집게형이니까 두께도 두 겹이 되니 책을 덮었을 때 매우 거슬린다. 가방에 책을 항상 넣고 다니는 입장에서 책 바깥을 비집고 나오는 책갈피는 구겨짐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그러니 더욱 정이 안 갈 수밖에. 작가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유형의 책갈피를 굿즈로 함께 내놓은 건 왜일까?
작가와 달리 나는 책갈피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다. 편리함과 필요도 이유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뻐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주는 책갈피를 덥석덥석 모으는 시기는 넘겼지만 종종 동네서점을 들렀을 때 예뻐서 눈길이 가는 책갈피엔 손을 내밀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은 책갈피는 얼마나 될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책장 한 켠에 쌓아둔 책갈피를 하나하나 진열하기 시작했다.

몇 개는 어떤 책 속에 얌전히 잠들어 있겠지만, 읽다 말고 오랫동안 방치한 책의 책갈피는 종종 빼고 있으므로 이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과거의 나는 책갈피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지금의 나는 플라스틱이나 코팅된 책갈피보다는 종이 책갈피가 좋고, 종이 책갈피도 지나치게 빳빳하면 싫다.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빳빳하지 않고 책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표시만 내주는 것... 그리고 예뻐야 한다.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양장본에 흔히 달려있는 가름끈인가 싶지만, 전집류가 아니라면 나는 양장본과 문고본 중 문고본을 고르는 사람이다. 어쩌라는 것인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개수를 세진 않았다) 책갈피를 나는 잘 쓰고 있는 것일까? 책을 읽으면서 갈피를 잡는 데 쓰진 않고 수집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고민은 '독서가가 아닌 장서가가 되고 있는가'라는 고민과 겹치는 듯하다.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본래 '여가'라는 뜻을 가졌듯이, 여가가 없는 이들은 텍스트를 읽을 틈이 없다."(강유원, 『책과 세계』, 6쪽)고는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핑계처럼 들린다. 총기와 끈기와 열기는 점차 사그러들고 있고, 끝나지 않을 숙제처럼 쌓여있는 책들을 보며 몸서리칠 때가 있다. 가장 애정하는 작가 중 한 명의 신간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 책이 떠올리게 해준 책갈피들이 다시 내가 갈피를 잡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생각한다. 항상 바쁜 와중에 짬을 낼 수 있는 시간 활용법에 대해 고민하지만, 그것보다 필요한 건 알고 싶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책읽기의 괴로움'에서도 재미(흥미가 아니다)를 찾을 줄 아는 마음일 것이다. 어쩌다보니 책읽기를 장려해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된 터라 "무턱대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지 말고 책읽기가 재밌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저 말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일기』로 돌아와서, 절반이 조금 넘게 읽고 느낀 바는 '황정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이다. 에세이에 흐르는 정조(情調)와 소설의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 같다는 인상은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윤리적) 태도가 곧 소설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소설세계가 좁아진다는 비판을 낳을 수도 있겠으나(나에게도 약간의 염려가 있다), 나는 소설부터 에세이까지 일관된 그 태도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이성복, 「그날」)는 일은 없겠구나, 당신은 더 민감하게 아프고 세계의 병듦을 말하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여담) 책갈피에 대한 이야기에는 포스트잇 플래그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사인을 받을 때, 내 책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플래그를 보자 그는 본인도 책을 읽을 때 자주 쓰는데 썩지 않더라...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썩지 않는 플래그를 열심히 사고 붙이고 있다. 때때로 기억하기 위해 붙이는 것인가, 아니면 언제고 돌아보겠지라는 마음에 붙이고 보는 것인가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