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주말이다. 이젠 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곱 마디 시간의 순환이 너무도 당연하게 보일 뿐이다. 이젠 시간도 기계의 얼굴을 가지고 어떤 놀라움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듯 도래한다. 왜 오늘 서두는 이다지도 무거운가?







아까 책을 봤다. 어떤 책인가 하면,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라는 책이다. 나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유효한 내용들이 넘실거림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물결 속에서 하이데거도 눈에 띄었다.
참 이 양반도 꽤 진득해서 잊을만 하면, 어디선가는 마주치고 마는 존재가 되버렸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직접 컴퓨터라는 물건을 구경하진 못했지만,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이런 기술과의 관계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기계(인공지능, 컴퓨터)의 존재론적 대비 혹은 대결구도 보다는 그러한 기술이 인간 내면에 미칠 영향이다. 그러한 기술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아마도 여기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것이라고 보는듯 하다.
<창조적 존재와 초연한 인간>은 작은 제목(부제)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구조-인데, 위에서 말한 현대 기술사회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저자의 오랜 시간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가 녹아 있다고 하는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노자의 도'라는 제목을 가진 장이 눈에 띈다. 하이데거와 동양의 선(禪)이나 도가 사상과 비교하는 작업이 이상하리만치 빈번하다. 아까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를 지은 마이클 하임 역시 책 전반에 걸쳐 도가 사상의 구름을 가끔 출몰시키는 재주를 부리곤 한다.



<창조적 존재와 초연한 인간>을 쓴 사람(전동진 씨)은 롬바흐(Heinrich Rombach)의 책들은 여러 권 번역했다. 롬바흐는 생소한 인물인데, <아폴론적 세계와 헤르메스적 세계>는 입맛이 가는 책이다.




오늘 책을 찾다가 발견한 책들이다. 그렇게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책은 아니지만, 요새 '철학과 종교'를 같이 다루는 책을 읽고픈 욕구가 생기는 중이다. 그런데, 딱히 마땅한 책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종교와 철학> <새로운 사회과학철학>
<새로운 사회과학철학>은 '분설철학'과 '과학철학'책을 찾던 중에 발견한 것인데, '사회과학철학'이란 것은 생소해서 일단 페이퍼에 흔적을 남겨둔다. <인종전시장>도 좀 독특한 책이다.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태 금기시했던 지식들을 볼 수 있겠다.








<예술철학>이란 제목을 가진 책이 3권이나 보이는데, 다들 나름대로 장점이 보인다. 특히 박이문 교수는 며칠 전 신문에 까뮈의 스승 장 그르니에와의 일화가 실렸다.
<철학으로 읽어보는 사진예술>은 책 제목이 나같은 사람은 쉽게 유혹할 것 같다. 책의 정보를 보니, 유명한 사진작가들(가령,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트 프랭크, 듀안 마이클스, 랄프 깁슨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단 손쉬운 방식인 거 같고, 단지 얼마나 저자의 깊은 내공이 실린 시선으로 이러한 사진들을 훑을 수 있느냐? 그것이다.






<철학으로 읽어보는 사진예술>의 저자가 쓰거나 번역한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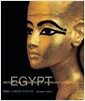



<이집트 문명과 예술>은 전부터 구하려던 책인데, 아직까지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 요새 '길가메쉬'와 '수메르 문명'에 관심이 있는 터라, 수메르와 이집트, 그리고 중국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어쨌든, 누가 보기엔 쓸데없는 관심의 확장이 아닐 수 없다.







'월드뮤직'에 관한 책들도 몇 권 눈에 보인다. 영미 위주의 음악을 벗어나, 이렇게 지구 곳곳의 음악을 듣는 다는 건.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최근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다.
새벽 3시 넘어서던가.. MBC FM 라디오에서 월드뮤직이 나오는걸 들었는데, 음악도 좋고 진행자의 음성도 편안하니 괜찮았던거 같다. 하여튼 오늘의 책 오디세이는 월드뮤직의 리듬을 건드리며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