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의 영화가 감독 자신의 내밀한 시적 감성안으로 아낌없이 들어간다면, 키에슬로프스키(Krzysztov Kieslowski) 영화에는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만, 그 내향(內向)의 위치가 꼭 작가의 주관적인 공간은 아니란 느낌이 든다. 미묘하고 순간적인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도 역시 감독에게는 낯설 수 있다. 지극히 내 개인적인 느낌으론 이렇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자기 안에 너무 깊숙히 들어가 헤멘다면(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는 자기와 자기 외부가 겹쳐진 미묘한 길에서 그 추적의 끈을 살짝 놓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장면도 있는 반면에, 해독하기 어려운 장면도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된다. 이거 두 감독 사이에서 나도 헤메는 글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이들의 영화에서는 짧은 영상의 맥박 같은 움직임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나 시나리오가 할 수 없는 '드러냄'의 시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드러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객한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들도 역시 곤란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거기엔 실험정신에 투철한 애송이들과는 다른 미학이 여유와 긴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들의 영화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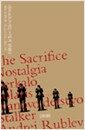



최근에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감독 톰 티크베어도 키에슬로프스키 미완의 작품에 참여해 정적인 유럽의 감성으로 <헤븐>이란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많이 가벼워진 그리고 좀 더 젊어진 케에슬로프스키 변종 영화라 봐도 될 거 같다.
키에슬로프스키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로 이렌느 야곱이라는 여배우를 우리에게 멋지게 선사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 여러 단편들도 만들었는데, 제목은 잊었지만, 어떤 정치인에 대한 다큐적인 영화가 기억이 난다. 삼색(色) 영화 화이트, 블루, 레드도 감독의 명성을 분명하게 한 작품들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창기에 십계명을 가지고 10 부작이라는 대단한 기획을 영화로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데칼로그(Dekalog)>이다. 5개의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데, 가격은 지나치게? 저렴해서 예전에 얼른 구했다.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다. "신부를 꿈꾸던 폴란드의 천재감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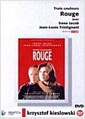



키에슬로프스키에 관한 책은 데칼로크를 다룬 김용규의 <데칼로그>가 있고, 영화를 기발하게 주무르는 지젝이 히치콕이 아닌 키에슬로프스키 영화를 주의 깊게 다룬 <진짜 눈물의 공포>가 있다. 이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곁가지 사유로 옮아가는 경향이 적고, 영화를 긴 호흡으로 끌고 간다.
이 글을 쓰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이렌느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주름진 얼굴을 숨기지 않고 최근의 영화에도 나왔던 줄리 델비, 이제는 아줌마 역도 자연스러워진 줄리엣 비노쉬를 보면서 시간이 먹어버린 소녀들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방금 이렌트 야곱을 검색해서 최근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참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