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 감정 오작동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실천 인문학
오찬호 지음 / 블랙피쉬 / 2018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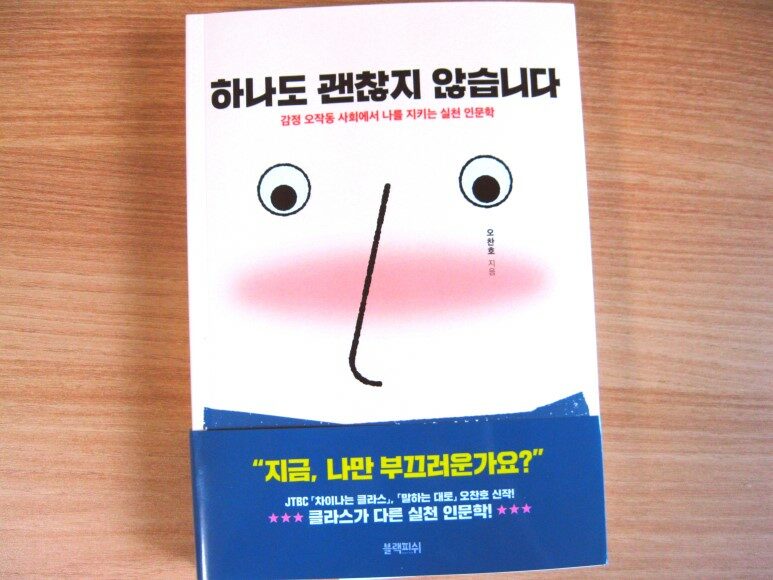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밖으로 나다니며 폭넓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사느냐보다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대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들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을 립서비스로 한다." ([허프인터뷰] 작곡가 진은숙이 서울시향을 떠난 이유를 직접 해명하다 -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24/story_n_19068560.html)
작곡가 진은숙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인터뷰를 읽고 얼마 전에 읽은 사회학자 오찬호의 책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를 떠올렸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는 뜨거워야 할 때 차갑고, 차가워야 할 때 뜨겁다'고 진단한다. '뜨거워야 할 때'란 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야 할 때를 말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 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방대 차별, 노인 차별, 아동 차별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누구나 한때는 어리고 결국엔 늙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은 차별을 철폐하여 얻을 이익보다 차별을 강화하여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좀먹는다.
'차가워야 할 때'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를 말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꼼수 권하는 사회'라고 표현한다. 한국 사회에선 꼼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람,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전과 18범이 대통령이 되고, 비선 실세가 4년이나 국정 운영을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마땅한 결과다. 죄를 지어도 돈만 잘 벌면 괜찮고, 정당한 권력이 아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문화는, 정말이지 하나도 괜찮지 않다.
한국인은 '슬픔'이란 감정을 진정성 있게 이해할 학습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공감 결여의 인간으로 성장한다.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구조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나도 과거에는 다 그랬다"는 조언을 하는 어른이 많은 이유다. 그런 어른들이 객관적인 폭력을 보고도 둔감한 건 당연하다. 이들은 어제까지 같은 반 아이가 자살을 해도 '학생이라면' 공부에 충실해야 된다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추모하겠다는 학생들에게는 "너 할 일이나 잘해!"라면서 혼낸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할 일'이다. (247-8쪽)
저자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공감'을 든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요,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요,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감정을 나누며 보다 풍성한 삶의 체험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없애라고 교육한다. 웃고 싶어도 웃지 말고, 울고 싶어도 울지 말라고 가르친다. 학생은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사회인은 힘들어도 투정하면 안 된다. 이러니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우울증을 의심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자는 '자신이 타인의 상황에 쉽사리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공감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 마음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자신도 자식을 잃은 처지가 아닌 이상 오만이고 불손이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 암 환자에게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다. 무심함이 진심으로 가장되는 동안 진심은 무시되는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