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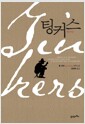
-
팅커스 - 2010년 퓰리처상 수상작
폴 하딩 지음, 정영목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책을 덮고 나면 커다란 퀼트 이불을 한 채 지은 기분이 든다. 빠르게 만들어진 이불이 아니다. 한 땀 한 땀이 매우 신중하게 천을 지나가야 삐뚤어지지 않는다. 어울리는 색과 무늬를 골라 천을 잇는 것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조각 천을 이어 이불을 만들 듯 조지라는 한 사람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까지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삼부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름답게 조각을 이어 놓은 퀼트 이불 한 채가 완성이 되듯 한 가족사의 얘기에 가슴에도 조각이 모아져 아름답게 펼쳐진다.
책 띠지에 <팅커스>를 번역한 정영목 번역가가 이런 말을 써 놓았다.
<이왕 책을 펼쳐 “조지 워싱턴 크로스비는 죽기 여드레 전부터 환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구절과 마주쳤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딴 세상이라 생각하고 신발 끈을 조여맬 것, 아니 신발을 벗어버릴 것>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이구나 싶어 펼치면 당혹스러워 진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인 것이다. 첫 문장이 조지가 환상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이라니. 당황스럽게 책을 읽어나간다.
제목이 <팅커스> 즉 땜장이들에 대한 이야기. 조지 워싱턴 크로스비가 삼십년 동안 시계수리를 했고 그의 아버지도 땜장이였듯 그 역시 시계를 수리하며 살았다. 파킨슨병과 당뇨병, 그리고 암에 걸려 이제 앞으로 살 시간을 손가락으로 세어도 될 만큼의 아주 작은 시간이 있을 뿐인 조지는 신장 기능 부전으로 요산 중독으로 죽기 진전 아버지를 떠올린다.
조지는 강인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지켜야 할 자식이 아닌 아버지가 있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간질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버지 옆을 지키는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같다. 자식을, 남편을, 가정을 지켜내는 강인한 여성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조지의 기억을 통해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의 간질 발작을 보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조지는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지만 정작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 자신이었을 것이다. 아들의 손에 상처를 입혔기 보다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를 보였다는 것이 가슴 아팠을 것이고 살이 돋아나는 것이 가슴에 구멍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조지의 어머니는 하워드를 정신병원에 넣을 생각을 하고 그는 상처 입은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을 위해 떠나고 만다. 가족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워드 때문에 눈물이 났다.
하워드에 대한 조지의 기억을 함께 찾아가는 일이 참 더디다.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읽었다. 한 문장을 읽어나가고 다음 문장을 읽고 난 후 다음 문장을 위해 앞 문장을 또 한 번 읽어가는 것은 촘촘한 바느질과 같다. 그 바느질을 하는 조지와 함께 조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슬퍼야 하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작가의 묘사력에 있는 것 같다. 하워드의 간질 발작 부분의 세밀 묘사는 영화의 스틸컷을 옮겨 놓은 듯하다.
조지가 죽기 전 누워 있는 침대며 그가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도 치밀한 묘사력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빨리 읽을 수 가 없었다. 그려내야 했다. 작가 폴 하딩이 표현하는 문장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조지가 말하는 장면들을 떠 올려야 하고 하워드의 행동을 다음 컷으로 이어지게 그려내야 하는 장인의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지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다 보면 문득 나의 삶의 끝에는 어떤 기억들로 가득할까 궁금해졌다. 역시 자신을 둘러 싼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들이 무수하게 자라고 있는 저 멀리의 숲을 거닐고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때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역시 어떤 작가의 말처럼 삶의 끝에는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조지를 사랑하는 손자들도 조지와 함께 죽음의 건너편을 같이 갈 수 없을 테니까.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들중 단 한권으로 유명해지는 작가가 몇 있었다. 정말 재미있게 읽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도 작가의 유일무이한 책이다. 폴 하딩 또한 단 한권의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으니 이것이 신데렐라 아니겠는가 싶었는데 작가는 자신의 책을 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더라. 우리나라는 사인회를 주를 이루고 강연회라고 해도 몇 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의 책을 알리기 위해 소규모 서점이라던지 심지어 가정집에서 부탁을 하면 가서 독서토론을 하는 열의를 보였다는 얘기에 뭐든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수상소식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조지의 삼부자의 얘기보다 사실 작가 폴 하딩의 얘기가 더 극적이다. 두 장의 앨범을 낸 드러머였던 그가 미국과 유럽 각지를 방문하던 중에 책을 읽고 음악의 뜻을 접는 것조차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그리고 집필을 하고 소설을 쓰고 책을 내려고 했지만 모든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하고, 출판된 책을 홍보하기 위해 가정방문까지 하는 그의 인생은 어쩜 조지보다 더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다.
마지막 조지가 떠 올렸던 것. 어머니와 자신을 떠났던 아버지가 찾아왔던 크리스마스의 저녁식사 시간. 그리고 그와 나눴던 얘기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지가 먼저 해주고 간 것처럼 다시 떠 올리는 그 말들이 잔잔하게 남는다.
“조지, 그래, 그래, 그러마, 잘 있어라”
참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을 놓고도 여전히 조지의 아버지의 말이 조지의 말처럼 들리며 애잔하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