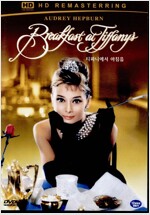
얼마 전, <티파니에서 아침>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 본 것이 세번째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한 영화를 거듭해서 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그런데 이 영화 세번째로 봤더니 두 번째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찔끔했다. 그전까지는 오드리 헵번이 여우 꼬리 살랑거리며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오로지 주인공에만 취해있었던 것 같다. 나도 같은 여자지만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영화속에서 얼마나 빛나보이던지. 그것은 오프닝씬에서부터 강력하게 사로잡는다.
검정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한 손엔 커피를, 한 손엔 도넛을 들고 귀금속 상점인 티파니를 배회하는 장면이란...! 난 바로 이 첫 장면에서부터 사로잡혀 영화속 홀리로 분한 오드리 헵번이 맡은 역할이 뭔지, 그녀의 상대역인 폴은 어떤 캐릭터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폴 역을 맡은 젊은 날의 조지 페퍼드는 또 오죽 잘 생겼던가. 브레드 피트가 있기 한 세대 전에 이 배우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 남녀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특별히 부각을 안 시켜서일뿐이지, 홀리는 고급 창녀고, 폴은 촉망 받는 소설가라고는 하나 후원자가 있다. 말이 좋아 후원자지 어느 돈 많은 귀부인과 내연의 관계다. 글쎄, 서양에서는 에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동양의 정서에선 쉽게 이해될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영화의 제작년도는 1961년도 고, 내가 처음 본 건 80년 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이다. 그 시대의 정서로도 쉽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런데도 난 그걸 아버지와 함께 TV '주말의 명화'를 통해 봤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관심이 책에서 영화로 옮겨가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영화로 확장되는 그 경계 어디쯤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본 경우 그 원작을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꼭 있었다. 그래서 난 비슷한 시기에 역시 '주말의 명화'를 통해 비비안 리가 나왔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충동적으로 거짓말 좀 보태 사전만한 두께 두 권짜리를 냉큼 사다가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읽느라 고생 깨나했다. 덕분에 그때까지 잘 알지 못했던 미국 흑인 노예의 역사에 대해 흥미가 생겼으니 나름 뿌듯했다. 그리고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던 것이 아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땐가? 알렉스 헤일리 원작의 TV 시리즈 <뿌리>를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난 그때도 마침 번역되어 나온 원작을 사다 읽긴했지만 읽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책이 영화만큼 감동스럽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읽기엔 내가 아직 어렸던 건지, 아니면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지금은 상하 권으로 나왔지만 처음 나왔을 당시는 세 권으로 케이스에 담겨져 나왔었다. 그때 번역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안정효 번역자였다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최초의 번역자였을까엔 의문이 남는다. 모르긴 해도 그때 안정효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막 졸업할즈음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안정효의 번역본은 2009년이다. 그렇다면 선번역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긴 안정효든 아니든 내가 그때 번역 가지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이야 번역의 질을 깐깐하게 따지지 그땐 그런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겨우 알파벳을 떼었을 땐데 번역을 따질만큼 나의 정신이 고급한 경지는 아니라는 것.
아무튼 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흑인 문학에 눈을 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면 과연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흑인 문학의 범주에 넣어도 될까 의문스럽기도 하다. 물론 백인이면서 흑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엄밀히 말해 그 작품을 흑인 문학으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다. 모르긴 해도 마가렛 미첼 이전에 자기 작품에 흑인을 등장시킨 작가는 없지 않았을까? 그게 맞다면 마가렛 미첼의 문학적 업적은 결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흑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은 훗날 알렉스 헤일리나 토니 모리슨 같은 흑인 작가의 몫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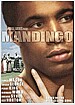 아무튼 그때 <뿌리>의 성공을 힘입고 카일 언스토트란 작가의 <만딩고>라는 소설이 나와 신문이며 라디오에 한창 선전중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작가인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라디오만 틀면, 신문은 이틀이 멀다고 광고에 나왔었다. 그러니 내가 이 책에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다.
아무튼 그때 <뿌리>의 성공을 힘입고 카일 언스토트란 작가의 <만딩고>라는 소설이 나와 신문이며 라디오에 한창 선전중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작가인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라디오만 틀면, 신문은 이틀이 멀다고 광고에 나왔었다. 그러니 내가 이 책에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다.
그런데 광고 카피가 좀 관능적이다. 그 내용이 어땠는지 지금은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지만 관능적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 책을 선택하지 않을 방법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책에 대한 관심도 잦아들겠지 해서 잦아들면 그건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으면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 책이 그랬다.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에서 잦아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읽어야 한다. 그런데 나도 참 순진하다. 연일 그렇게 광고를 해 대는데 무슨 수로 내 마음에서 관심이 잦아들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그래서 꼭 사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는 또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 그때 타야했다. 그런데 좀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 평소 때 같으면 내가 책을 사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말없이 돈을 주시곤 하셨는데, 그때 따라 무슨 생각이셨는지 무슨 책을 살 거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도 참 요령이 없었다. 그냥 다른 책을 사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솔직하게 <만딩고>를 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일언지하에 돈을 못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도 그 야시시한 광고를 거의 매일 들으셨으니 빛의 속도로 그런 19금 소설을 딸에게 읽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일게다.
 그때 난 확실히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내깐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난 그 무렵에 이미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완독한 전력이 있었다. 이거야 말로 19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시 국어 선생님도 읽기를 허락한 소설이다. 그렇다면 <만딩고>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좀 억울했지만 조용히 물러나는 수 밖에. 뭐라고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난 확실히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내깐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난 그 무렵에 이미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완독한 전력이 있었다. 이거야 말로 19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시 국어 선생님도 읽기를 허락한 소설이다. 그렇다면 <만딩고>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좀 억울했지만 조용히 물러나는 수 밖에. 뭐라고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서 새삼 이 영화가 나에겐 효자였다는 걸 알았다. 난 분명 이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봤다. 그런 캐릭터가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수면위로 툭하고 삐져 나왔더라면 아버지는 내가 그 영화를 보기를 불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런 것을 완벽히 감추고 15세 관람가로 둔갑시켜 부녀가 함께 볼 수 있게 해줬으니 이 영화가 아버지에게 대신 복수해 준 셈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서 새삼 이 영화가 나에겐 효자였다는 걸 알았다. 난 분명 이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봤다. 그런 캐릭터가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수면위로 툭하고 삐져 나왔더라면 아버지는 내가 그 영화를 보기를 불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런 것을 완벽히 감추고 15세 관람가로 둔갑시켜 부녀가 함께 볼 수 있게 해줬으니 이 영화가 아버지에게 대신 복수해 준 셈이라는 걸 알았다.
알디시피 이 영화는 트루먼 커포티의 원작을 영화화 했다. 이 책은 2013년이 되서야 나왔다. 영화에 비하면 한참 늦은 출판인데 만일 그 시절에 나왔다면 아버지는 또 읽기를 반대하셨을까? 어쨌든 복수는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감독이 대신 해 준 거나 다름없으니 고맙다고 해야하는 걸까? '그렇게 못 보고 ,못 읽게해도 다 본다구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어른이 반대해도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19금에 접근한다. 지금은 그 경로가 워낙에 다양한데다, 스스로 19금을 15세 관람가로 낮추고 있어서 내 시절의 19금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렇더라도 공히 말하겠는데 그 시절 나는 소설 <만딩고>를 정말 흑인 문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읽어보려 했다. 아, 이 마음을 누가 알리?ㅠ
그런데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읽고 싶었던 책이라면 성인이 되서 읽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 읽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책이었을까? 하긴 지금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다. 절판 됐으니. 어느 출판사에서 다시 나와준다면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내 마음에 불을 확 질러 놓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