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마릴린> 이지민, 그책
<나와 마릴린> 이지민, 그책
‘그냥 그렇게 묻히기는 아까운 작품’이라는 아는 사람의 멘션과 ‘195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마릴린 몬로의 통역을 맡았던 한국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발상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최근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급 매혹되어 있는 터라 <나와 마릴린>은 게으른 자의 필독 리스트에 올랐고...
아는 사람의 멘션과 달리 이 작품이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만 확인했다. 여성 캐릭터를 그려내는 특유의 섬세함은 돋보이지만, 그뿐이다.(미안하게도 이건 내가 우리나라 여성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 제일 불편해하는 대목이다. 묘한 날카로움과 신경질이 묻어나는 여성 캐릭터!)
주인공 앨리스 킴의 상처와 고뇌는 너무나 보편적이다. 그의 갈등과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1950년대’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마릴린 몬로의 방한 역시 마찬가지다. 아,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전쟁 직후 폐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과 할리우드 스타 마릴린 몬로가 이뤄내는 우스꽝스럽고 슬픈 역사적 부조화의 풍경이 아니었는가? 안타깝다.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베스트셀러가 맞긴 맞는가 보다. 요즘 지하철이나 동네 문화체육센터에서 이 작품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독자의 대부분은 여성.
김애란은 분명 재능 있는 작가다. 우울한 이야기를 웃으며 이야기할 줄 안다. 등장인물만 웃는 게 아니라, 독자들도 웃게 만들 줄 안다. 아니 울릴 줄도 안다. 작가의 재능이 가장 반짝이는 대목은 대화다. 전반적으로 대화가 좀 많은 편인데, ‘뭐 불필요한 대화 없나?’하는 못된 마음으로 읽었다. 없다. 모든 대화가 가볍고 리듬감 넘친다. 그야말로 촌철살인. 혼자 심각한 척하거나 징징거리지 않아서 좋다.
한 대목 아주 짠했다. 펄럭펄럭 책장을 넘기다 말고 밑줄을 그었다. 이 작가 참 감정을 쌓아올릴 줄 아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조금 뒤로 가니 그것이 뒤통수였다. 물론 작가는 주인공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설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반전’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주인공만이 아니다. 진심으로 상황에 몰입하며 눈물을 흘렸던 독자에게 모든 것이 ‘뻥’이었다고 고백하는 소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심정으로 작품 후반부를 읽었는데, 참으로 헛헛했다.
더불어 작품 말미에 실려있는 주인공 한아름이 남기고 간 글 ‘두근두근 그 여름’은 사족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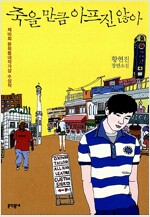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황현진, 문학동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황현진, 문학동네
계간지를 구독하는 덕분에 올해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을 공짜로 받았다. 읽었다. 재미있는 성장소설이다. 어쩌다보니 요사이 성장소설 몇 권을 내리 읽게 되었는데,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의 순서가 제일 끝머리다. 먼저 읽은 작품을 열거하면, <한밤의 아이들>, <두근두근 내 인생>. 신인작가로서는 불리한 대진운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작품에 대해 딱히 할 말 없다. 굳이 말하자면, 지난해 수상작 <사라다 햄버튼의 겨울>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는 것 정도.
한 가지 실수라면, 수상작에 내놓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읽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덕담을 위한 자리라지만 공감할 수 없는 칭찬을 쏟아내는 심사위원들의 태도가 거슬린다. 독자들이 애정 없는, 혹은 형식적인 칭찬을 못 알아챌 것이라 생각했는가? 솔직히 소설가 윤성희의 심사평을 제외하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정한 관심이 느껴지질 않는다. 수상작으로 뽑기가 마뜩치 않았을까? 내키지 않으면 뽑지 말고, 뽑았으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라. 그것이 신예작가와 독자에 대한 예의다.
생각해보니, 지난해 수상작의 심사평을 읽었을 때도 속이 틀어졌던 것 같다. 어쩌면, 앞으로 심사평 따위는 읽지 않는 것이 방법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