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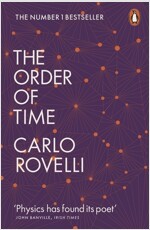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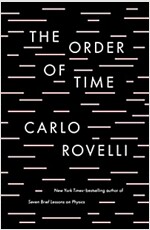
양자중력 이론을 연구하는 로벨리 교수의 최신작이다. 어찌하다 보니 그의 대중 과학책을 3권째 읽고 있는데, 그가 일급 물리학자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만의 시각으로 제시하며, 그의 연구분야인 양자중력 이론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작 <Reality is Not What It Seems>에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세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그 중 '시간'이라는 주제를 떼어내 다채로운 지식을 전달한다. 고백하지만, 내용이 쉽지는 않다. 특히 인간 의식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책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시간(뉴턴에게 기인한다)의 미망을 깬다. 우주에 하나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질량 근처에서 느려지며, 빨리 운동해도 느려진다. 미시세계에서 시간의 방향성은 사라진다.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 주변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의 '현재'는 의미가 없다.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결합한 시공간이 된다. 2부에서는 시간이 '없는' 세상, 미시세계에 대한 양자중력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3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시간'이 생겨나는지에 대해 얘기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심 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간은 자연(실재)의 핵심적 변수(요소)가 아니다.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근원적 물리 방정식에 시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즉,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시간은 없다.' 이 부분을 따서 번역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로 제목을 삼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이 있는데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간은 없다.
- 그럼 우리가 겪는 시간은 무엇인가? 왜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는 느끼는가?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름은, 우리의 무지, 우리 인식의 흐릿함(blurring)에서 나온다. 열역학에 따르면 자연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엔트로피의 증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미시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음--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뇌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시간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열적 시간thermal time). '시간'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뇌가 만든 것이다. '시간'은 우주적 절대값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시간은 우주적이 아니라 인간적이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물리학자가 아니다. 그만의 감성과 언어로 세상에 대한 그의 이해를 전달한다. 그가 왜 '시인詩人'이라는 말과 연관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여러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is the disconcerting conclusion that emerges from Boltzmann's wo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refers only to our own blurred vision of the world. It's a conclusion that leaves us flabbergasted: is it really possible that a perception so vivid, basic, existential--my perception of the passage of time--depends on the fact that I cannot apprehend the world in all of its minute detail? On a kind of distortion that's produced by myopia? Is it true that, if I could see exactly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dance of millions of molecules, then the future would be 'just like' the past? Is it possible that I have as much knowledge of the past--or ignorance of it--as I do of the future? Even allowing for the fact that our perceptions of the world are frequently wrong, can the world really be so profoundly different from our perception of it as this?
All this undermines the very basis of our usual way of understanding time. It provokes incredulity, just as much as the discovery of the movement of the Earth did. But, just as with the movement of the Earth,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all the phenomena that characterize the flowing of time are reduced to a 'particular' state in the world's past, the 'particularity' of which may be attributed to the blurring of our perspective. (영국판 pp. 31-32)
Both the sources of blurring--quantum indeterminancy, and the fact that physical systems are composed of zillions of molecules--are at the heart of time. Temporality is profoundly linked to blurring. The blurring is due to the fact we are ignorant of the microscopic details of the world. The time of physics is, ultimately, the expression of our ignorance of the world. Time is ignorance. (p. 123)
Job died when he was 'full of days'. It's a wonderful expression. I, too, would like to arrive at the point of feeling 'full of days', and to close with a smile the brief circle that is life. I can still take pleasure in it, yes; still enjoy the moon reflected on the sea, the kisses of the woman I love, her presence that gives meaning to everything; still savor those Sunday afternoons at home in winter, lying on the sofa filling pages with symbols and formulae, dreaming of capturing another small secret from among the thousands that still surround us... I like to look forward to still tasting from this golden chalice, to life that is teeming, both tender and hostile, clear and inscrutable, unexpected.... But I have already drunk deep of the bittersweet contents of this chalice, and if an angel were to come for me right now, saying, 'Carlo, it's time,' I would not ask to be left even long enough to finish this sentence. I would just smile up at him and follow.
Our fear of death seems to me to be an error of evolution. Many animals react instinctively with terror and flight at the approach of a predator. It is a healthy reaction, one that allows them to escape from danger. But it's a terror that lasts an instant, not something that remains with them constantly. Natural selection has produced these big apes with hypertrophic frontal lobes, with an exaggerated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It's prerogative that's certainly useful but one that has placed before us a vision of our inevitable death, and this triggers the instinct of terror and flight. [...] Everything has a limited duration, even the human race itself. ('The Earth has lost its youthfulness; it is past, like a happy dream. Now every day bring us clear to destruction, to desert...', as Vyasa has it in the Mahabharata.) Fearing the transition, being afraid of death, is like being afraid of reality itself; like being afraid of the sun. Whatever for? (pp. 177-178)
And it seems to me that life, this brief life, is nothing other than this: the incessant cry of these emotions that drive us, that we sometimes attempt to channel in the name of a god, a political faith, in a ritual that reassures us that, fundamentally, everything is in order, in a great and boundless love--and the cry is beautiful. Sometimes it is a cry of pain. Sometimes it is a song.
And song, as Augustine observed, is the awareness of time. It is time. It is the hymn of the Vedas that is itself the flowing of time. In the Benedictus of Beethoven's Missa Solemnis, the song of the violin is pure beauty, pure desperation, pure joy. We are suspended, holding our breath, feeling mysteriously that this must be the source of meaning. That this is the source of time.
Then the song fades and ceases. 'The silver thread is broken, the golden lantern is shattered, the amphora at the fountain breaks, the bucket falls into the well, the earth returns to dust.' And it is fine like this. We can close our eyes, rest. This all seems fair and beautiful to me. This is time. (pp. 18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