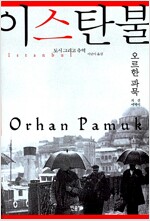순수박물관을 다 읽었다. <하얀성>, <내이름은 빨강>, <이스탄불>, <검은책>, <소설과 소설가>에 이은 6번째 파묵의 작품이다. 소생이 뭐 오르한 파묵을 사사하거나 존경하거나 특별히 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근자에 들어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사유로 터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엄밀히 말하자면 터키보다는 이스탄불이라고 해야겠다.) 이러한 관심의 표현이 독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은(여행이 첨부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 글하는 선비로서는 당근지사. 그래저래서 이스탄불이니 비잔티움이니 이슬람이니 하는 책들을 나름 집중적으로 읽고 있다.
아! 장려했느니, 그 낙일이여! 눈물과 탄식없이는 차마 읽을 수 없는 스티븐 런치만의 <1453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 학술적인 역사서이지만 그럼에도 무척 흥미진진하다. 진짜 재미있다.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제국에게 함락되기까지의 수십일간의 피 말리는 상황이 날짜별 시간별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베네치아인 군의, 비자틴제국 황제 최측근 관료, 제노바인 등등이 모두 각자의 시각에서 본 기록을 남겼다. 관심있는 분의 일독을 권한다. 이보다 쉽게 읽히는 것은 역시 시오노 나나미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되겠다. 시오노 할머니의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제노바인 용병대장 주스티니아니 롱고의 영웅적인 항전과 그 급격한 몰락의 모습.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 – 도시 그리고 추억>는 파묵의 자서전이자 파묵이 태어나고 성장한 도시 이스탄불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소설 대부분의 무대는 이스탄불이다. <검은책>과 <순수박물관>의 무대 역시 이스탄불이다. 존 프릴리의 <이스탄불-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제국의 도시>는 영화 <노팅힐>에서 서점 주인인 휴그랜트가 줄리아 로버츠에게 추천한 책으로 등장하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 이게 펭귄출판사의 travel/history 시리즈 중 한 권이라고 한다. 현재는 절판이다. 소생은 중고로 25,000원에 구입했다.
<비잔티움의 첩자>는 대체 역사소설이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가정하에 쓰여진 소설이다. 이슬람교가 없으니 당연히 오스만 제국도 없고 오스만이 없으니 비잔틴 제국은 14세기에도 번영을 누리고 있다. 비잔틴제국의 정보국 요원의 모험담이다. 여러 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현재 절판이다. 중고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가 다 못읽고 반납했다.
줄리어스 노리치 <비잔티움 연대기>는 3권이다. 무려 2196쪽이다.(맞나?) 작년에 다 읽었다. 장하다. 짝짝짝 자찬의 박수. 그러나 뭘 읽었는지는 기억이 거의 안난다. 아니다. 테오도라 황후 관련해서 몇몇 흥미로운 장면은 조금 기억이 난다. 역사서이지만 그리 딱딱하지 않아 그런대로 쉽게 읽힌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전6권)>는 읽기 시작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언제부터 읽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하루에 10~30쪽 정도씩 꾸준히 읽고 있다. 현재 스코어는 4권 312쪽. 이 유장하고 장중한 저술을 언제 다 읽을지 역시 아득하다. 기번은 수다스러워서 주석을 또 엄청나게 달았다. 주석은 읽다가 포기했다. 본문과 별 연관 없는 것도 많아서. 완역이라고 주장하는 민음사판도 기번의 주석을 다 옮긴 것은 아니다.
이슬람 관련해서도 <캠브리지 이슬람사>,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등의 책도 일단 사놓고는 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박민규의 말마따나 진짜 멋진 것들은 삼천포에 있는 지도 모른다.
‘이스탄불을 무대로 한 불멸의 사랑이야기’라는 <순수박물관>은 파묵이 노벨상 수상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선전 문구대로 “한 여자와 만나 44일 동안 사랑했고, 339일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으며, 2864일 동안 그녀를 바라본 한 남자의 30년에 걸친 지독한 사랑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다. 한 남자 ‘케말’은 그가 사랑했던 한 여자 ‘퓌순’과 관계된 모든 물건을 모아서 전시할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박물관의 도록 또는 설명서로 이 책 <순수 박물관>의 집필을 오르한 파묵에게 의뢰한다. 책은 2008년에 출판되었고 순수박물관은 실재로 2012년에 이스탄불에서 개괸했다.
모든 사랑에는 당연히 집착이 내재되어 있지만 케말의 집착은 과하고 정상적은 아니다. 변태스럽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도 풍년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 하다.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케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고나 할까 그런 기분이 들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케말이 퓌순과의 사랑을 거의 이룰려고 하는 찰나에 배치된 퓌순의 어이없는 죽음앞에서는 나도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고, 소설의 마지막의 케말의 말 “모든 사람이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을 읽었을 때는 안타까움과 쓸쓸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진짜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이스탄불에 가면 순수박물관에 한 번 가보고 싶다. 상상이 현실이 된 곳. 퓌순이 피운 담배의 꽁초 4213개가 연도별 일자별로 정리되어 전시되어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