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끊을 수 없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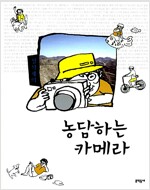
내가 근래에 들어서 잘한 일 중 하나가 ‘사진찍기’를 배운 일이다.
물론 남편은 좀 불만이지만.
남편은 내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책도 같이 읽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혼자하는 것을 좋아한다. 같이 무엇을 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나처럼 영화감상이 취미라고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취미는 커녕 외국영화는 옷만 갈아 입고 나와도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옆에서 끊임없이 물어댄다. ‘저 사람은 누구냐? 왜 저러느냐?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도 되냐? 왜 비를 맞고 돌아다니느냐? 저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놀면 내일 아침 출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끝이 없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보러 간다면 꼭 따라나선다.
잠시 옆길로 샜다.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새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 탓인 것 같다.
우리 아파트에 내가 주차하는 곳에 나무를 사랑하는 담쟁이가 있다.
오후면 햇빛을 받아서 단풍이 든 담쟁이 잎이 무척 아름답다.
그 옆에 서 있는 나무 - 사실 나무가 아니고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란 해바라기 이다 - 에 다가가기 위해 날마다 조금씩조금씩 키를 더한다.
지난 이틀 동안 세상의 모든 바람이 이곳에 놓인 듯 바람이 몹시 불었다. 나는 담쟁이 걱정에 잠을 설쳤다.
아침 일찍 내려가 보니 이런 모습이었다(아래 사진). 그나마 있던 해바라기 잎도 다 떨어지고 담쟁이도 앙상한 모습이다.
그래도 사랑은,
담쟁이의 사랑은 여전하다.


사진은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릴 것도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만든다.
작은 것을 사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래서 나는 사진이 좋다.